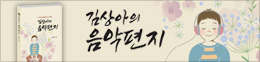[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그 동안 제가 작년 국제도서전시회 때 사두었던 책을 읽고 나 후의 느낌에 대해 몇 차례 썼었지요? 처음 《조선 선비의 산수기행》에 대해 썼고, 최근에는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을 읽은 느낌을 썼습니다. 오늘은 그 때 사두었던 책 가운데 마지막 책인 《한국 한시선》에 대해 써보려 합니다.
이 책은 정진권(1935 ~ )이란 분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수많은 한시 가운데 156편을 엄선하여 한시 원문과 한글 번역시 그리고 자신의 독후감을 실은 책입니다. 번역시는 한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아닌 시의 맛이 나도록 많이 의역한 시입니다. ‘번역은 제2의 창작이다’라는 말은 시 번역에서 더욱 실감나는 말인데, 정진권씨는 자신의 상상력을 더하여 자유롭게 번역했습니다.
한국체대 교수를 역임한 정진권씨는 수필가로서 많은 수필집을 냈는데, 한시의 맛에 꽂혀,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한시를 섭렵하고 난 후, 이렇게 한시집도 냈습니다. 정진권씨는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시를 가려 번역하고 또 주석을 달고 그 독후감을 쓰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때는 한문도 시도 특별히 공부한 게 없는 내가 왜 굳이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도 일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이 하고 싶었다.”
예!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요. 제가 국제도서전에서 이 책을 산 것은 한시를 좋아해서 산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한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 이 기회에 한시의 맛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 산 것이지요. 그 때 이 책과 정진권씨의 또 하나의 책 《한시를 읽는 즐거움》 가운데 어느 것을 살까 하다가 이 책을 집어 들었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고 보니까 《한시를 읽는 즐거움》도 마저 사볼 걸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이 말은 이 책이 저에게 기대 이상의 한시를 읽는 즐거움을 주었다는 얘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한시선》을 읽으면서 어떤 시를 감상할 때는 제 무릎을 치기도 하고, 어떤 시를 읽을 때에는 시인이 그 때 어떤 심정으로 시를 썼을까 하며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에 이르러서는 ‘나 같으면 이렇게 번역했을 텐데...’하며, 정진권씨의 번역에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뭘 이런 유명한 시를 갖고 호들갑을 떠나?’ 하시겠지만, 어차피 독후감이란 읽은 이의 행복한 느낌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秋雲漠漠四山空(추운막막사산공) 가을 구름은 아스라하고 사방의 산은 텅 비었는데
落葉無聲滿地紅(낙엽무성만지홍) 낙엽은 소리 없이 떨어져 대지를 붉은 색으로 가득 덮네
立馬溪橋問歸路(입마계교문귀로) 시냇가 다리에 말을 세우고 돌아갈 길을 묻는데
不知身在書圖中(부지신재서도중)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운 정도전의 시입니다. 제목은 ‘방김거사야거(訪金居士野居)’인데, 아마 산 속에 있는 김거사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그림 같은 자연의 풍경에 취해 시를 쓴 모양입니다. 정도전이라면 차가운 지성과 냉철한 판단으로 고려를 무너뜨린 문신으로만 생각했는데, 정도전에게 이런 낭만적인 모습이 있었군요. 아마 정도전이 변혁의 시기에 태어나지 않고, 문학의 바람이 부는 태평성대에 태어났다면 멋진 시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의 시를 보겠습니다.
月白夜蜀魄啾(월백야촉백추) 달 밝은 밤에 두견새 우니
含愁情依樓頭(함수정의루두) 근심을 머금고 누각에 기대선다
爾啼悲我聞苦(이제비아문고) 네가 그렇게 슬피 우니 내가 차마 듣기 괴롭구나
無爾聲無我愁(무이성무아수) 너의 울음소리가 없다면, 나 또한 괴롭지 않을 것을
寄語世上苦勞人(기어세상고로인) 세상의 고달픈 사람에게 말하노니
愼莫登春三月子規樓(신막등춘삼월자규루) 부디 춘삼월에는 자규루에 오르지마소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어 자규루에 기대섰을 때 두견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신세에 비감어린 눈물을 흘리며 쓴 시입니다. 영월에 가면 자규루가 있는데, 자규나 촉백이나 다 두견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종은 자신의 신세가 두견새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자규루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로 자규루에서 두견새가 운 것이 아니라, 단종의 마음 속에서 두견새가 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촉백(蜀魄)이라면 촉나라의 혼백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두견새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촉나라의 황제인 망제(望帝) 두우가 신하의 배신으로 촉나라에서 쫓겨났을 때 촉나라를 그리워하다가 죽어 두견새가 되었는데, 촉나라를 그리워하는 혼백이라고 촉백(蜀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촉나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여 귀촉도(歸蜀道)라고도 하고요.
我兄顔髮曾誰似(아형안발증수사) 우리 형님 얼굴은 누굴 닮았나?
每憶先君看我兄(매억선군간아형) 매번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날 때면 형을 보곤 했지
今日思兄何處見 (금일사형하처견) 오늘은 형님이 보고싶은데 어디 가야 볼 수 있을까?
自將巾袂映溪行(자장건몌영계행) 내 자신 의관을 갖추고 냇가에 가서 비춰보네
연암 박지원의 시입니다.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이 없던 그 시절, 초상화도 없고 그러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늘은 그리 보고 싶은데... 이럴 때 연암은 형의 얼굴을 보는군요. 아버지를 빼어 닮은 형을... 그런데 그 형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따라 그 형이 보고 싶은데... 이럴 때 연암은 형님이 자주 입던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냇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냇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형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한 자, 한 자 음미하며 시를 감상하다보니, 저 자신 연암에게 감정이입이 됩니다. 연암이 시를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마음을 뭉클하게 하네요.
그밖에도 《한국 한시선》에는 같이 나누고 싶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 될 때마다 하나씩 꺼내어 다시 음미하며, 같이 느낌을 나눠보도록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