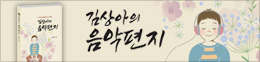[우리문화신문=김상아 음악칼럼니스트]
무엇이 영혼인가?
과학의 범주인가, 그 밖의 영역인가?
육체의 존재로 존재하는가, 육체 없이도 존재하는가?
“서울 물을 먹더니 신수가 훤해 졌소이다. 그려”
방송원고 준비에 골몰하고 있을 때였다. 찬바람이 불어와 <한일 월드컵>의 뒷예기 마저 식혀버려, 사람들의 입에서 월드컵 예기가 거의 사라진 시월의 어느 날이었다. 그 때 나는 엘피(LP) 카페를 운영하랴, 방송 진행하랴, 원고 작성하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단하! 어떻게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
“형이 뛰어 봤자 부처님 손바닥이지. 낄낄”
그는 늘 자기가 신통력이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런 그가 정말로 신통술을 부렸는지, 십 년도 훨씬 넘은 지금 기별 한 번 없이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깡마른 몰골에 땟국이 흐르는 건 그의 본 모습이니 놀랄 일이 아니었으나, 흰 두루마기 차림에다 삿갓까지 보태고 나타났으니 내 눈은 얼음판에 자빠진 소 눈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의 손엔 여전히 오죽대금이 들려져 있었고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주유천하(周遊天下)하면서 산다고 했다. 강산이 변하도록 못 봤으니 궁금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았지만, 그날따라 손님들이 일찍 들이닥쳐 회포를 풀 시간도 갖지 못한 채 밤이 깊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자 그는 힐끔거리는 손님들을 향해 “여러분! 소생이 대금연주를 한 곡 선사해 드리겠소이다.” 하며 대금을 입술로 가져가자 가게 안은 박수소리가 마른천둥 치는 듯했다. 그가 칠갑산을 불어재끼자 실내는 물 끼얹은 듯 고요했고 내 눈에는 그와 처음 만날 때의 모습들이 영상으로 흘렀다.
“계십니까?”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내가 외로워서 환청이 들리나?” 겨울철에는 나그네라곤 눈을 씻고 보아도 없는 첩첩 산중에, 더군다나 눈이 한 길이나 빠진 날에 누가 올 리가 만무했다.
“안에 아무도 안 계십니까?”
환청이 아니었다. 놀라서 방문을 여니 마른 장작 같은 한 사내가 올빼미 눈을 하고 서 있었다. 허기로 얼굴은 괭했으나 콧김을 가마솥처럼 내 뿜는 걸 보니 아직 기력은 남아 있는 듯했다. “여기에 도반道伴이 한 분 계신다하여 찾아왔습니다.” 나는 자초지종을 따질 겨를 없이 그를 안으로 맞아들여 김치 수제비부터 한 냄비 끓여 먹였다.
그 불청객과 나는 발왕산 자락의 농막에서 계절 몇을 함께 보내며 많은 예기를 나누었다. 어떤 때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며칠 씩 논쟁을 할 때도 있었고 그 논증을 위해 억지 변증법을 들이대기도 했다. 그와 나는 특히 예술관에서 많이 부딪쳤는데, 그는 “예술은 한(恨)의 표현이라서 한이 없는 예술은 죽은 것”이라 단정 지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그가 딱해 보이기도 했으나 예술을 향한 그의 집념은 불보다 맹렬하기에, 나는 그에게 “불타는 노을”이란 뜻의 단하(丹霞)라는 호를 붙여주었다.
이깔나무에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황금색 비가 섬돌에 놓인 우리의 신발을 수북이 덮던 날이었다.
“형. 묘심(猫心)을 아시오? 나는 고양이처럼 살겠소이다. 형은 먹이만 주면 아무 주인이나 따르는 개처럼 아무 음악이나 좋아 하지만, 나는 우리의 한 서린 음악을 찾아 떠나야겠소.”
지난 밤 과음으로 곯아떨어진 그의 머리맡에 물 한 사발을 떠 놓고 살며시 빠져 나왔는데, 언제 일어났는지 행장 까지 갖추고 나타나 나를 노려보며 내던진 말이었다. 그는 내게 양코배기에게 영혼을 빼앗긴 쓰레기라는 극언까지 퍼붓고는 구빗길을 휑하니 내려갔다. 음악은 물과 같아 어느 그릇에든 담겨야 한다는 말을 그의 등 뒤에다 외치고 싶었으나 그만 참고 말았다. 그렇게 떠났던 그가, 나를 떠나던 그 계절에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시간은 어느새 새벽을 향해가고 있었고 가게 안엔 우리 둘만 남게 되었다. 그의 대금연주에 환호성을 지르던 손님들도 모두 귀소본능에 의해 제 갈 길로 빠져나가고 없었다. 우리는 말문을 찾지 못해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머쓱함에서 빠져나오려 음반 한 장을 턴테이블에 올렸는데, 나도 모르게 미키 뉴베리의 인 더 뉴 에이지 음반을 올려놓았던 것이다. 예전 같으면 양키 음악이라며 귀를 닫았을 그가 웬일인지 조용히 듣고 있는 것이었다. 한 술 더 떠 시간이 지날수록 눈을 지그시 감고 음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날 밤 우리는 그 음반을 듣고 또 들었다.

1940년 미국 남부의 휴스턴에서 태어난 미키 뉴베리는 나에게 영혼의 개념을 정립시켜준 인물이다. 그의 노래에선 깊은 고뇌와 우수를 느낄 수 있는데, 방랑자의 그것이 아닌 관조를 얻은 자의 그것이 느껴진다.
미키의 구도 순례는 1964년에 이미 시작된다. 초기에는 노래를 만드는 일에만 열중하여 에디 아놀드라든가 로이 오비슨, 윌리 넬슨 같은 톱스타들에게 작품을 제공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66년부터 본격적인 싱어 송 라이터로 나서는데 이때 나온 아메리칸 트롤로지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다시 불러 큰 갈채를 받았다. 그는 특히, 단조 음을 장조로 만드는 재주가 뛰어나 슬픈 노래를 슬프지 않게 만드는 마력을 지닌다.
인 더 뉴 에이지 음반은 미키의 순례에 마침표를 찍는 결정판으로, 81년에 발표 되었으나 우리나라엔 한 참 지나서야 소개 되었다. 신시사이저와 현악기는 이질적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신비감이 느껴질 정도로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냈다. 첫 번째 트랙의 올 마이 트리얼스(All my trials)는 드라마 <작별>에 삽입되어 국내 팬들에게도 귀에 익은 곡이다.
해리 벨라폰테, 존 바에즈, 나나 무스꾸리를 비롯한 많은 가수들이 재해석 해냈다. 샌프란시스코 메이블 조이(San Francisco mabel joy)는 이 앨범의 백미로 역시 많은 가수들이 앞 다투어 취입했으며, 미키 자신도 4번씩이나 편곡을 달리해 녹음 할 만큼 애착을 보인 작품이다. 그는 60여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삶을 살다 갔지만, <포크 뮤직>에 영혼을 불어 넣어준 성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