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472년, 888권.
《조선왕조실록》과 관련된 숫자다. ‘실록’은 말 그대로 실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다. 조선의 첫 임금인 태조가 즉위한 1392년부터 스물다섯 번째 임금인 철종이 승하한 1863년까지 472년 동안의 일이 기록된 888권의 역사책, 그것이 《조선왕조실록》이다.
조선왕조처럼 이렇게 방대한 기록을 남긴 왕조도 드물 것이다. 후대 사람들이 역사책을 거울삼아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뜻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일거수일투족이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자연스레 스스로 삼가는 태도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다.
역사학자인 강명관이 쓴 이 책, 《왕의 기록, 나라의 일기 조선왕조실록》은 실록의 이모저모를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잘 알려진 사실과 많은 이들이 몰랐을 사실들이 적절히 섞여 있어 실록의 다양한 면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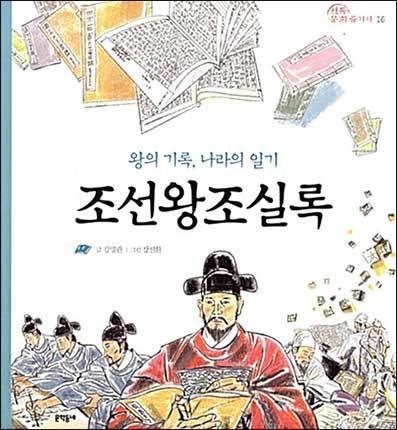
실록을 ‘일기’라 하는 까닭은 날짜별로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적혀 있기 때문이다. 첫머리에는 임금과 신하들의 인물 정보를 기록하고, 날짜 표시는 연도, 계절, 달, 날의 차례로 썼으며, 날짜가 넘어가거나 기사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 ‘ㅇ’을 넣어 구분했다.
실록을 읽다 보면 그간 가상의 인물로 여겼던 인물이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해 놀랄 때가 있다. 홍길동이 그 대표적 예다. 실록에는 율곡 이이나 충무공 이순신과 같은 유명한 문무관료 뿐만 아니라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도둑 이야기도 나온다.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에 나오는 홍길동은 실제로 연산군 시절 실록에 등장한 도둑이었다.
(p.22)
영의정 한치형과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극균이 연산군에게 아뢰기를,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백성의 해독을 제거한 일로서 이보다 더 큰일이 없습니다. 홍길동의 나머지 패거리도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좇았다.
_ 《연산군일기》 6년(1500) 10월 22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낱낱이 기록한 실록의 기초 자료를 쓰는 이들은 ‘사관’이었다. 임금은 사관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어떤 신하도 만날 수 없었다. 이런 사관의 역할이 워낙 중요했기에 과거 시험 합격자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을 골라 사관으로 삼곤 했다.
사관은 춘추관이라는 관청에 소속되어 있었다. 춘추관의 가장 높은 직책은 영의정이 맡고, 감사는 좌의정과 우의정이 겸임했다. 사관은 보통 두 명이었는데, 임금과 신하가 하는 말을 빠른 속도로 한문으로 번역하여 적어야 했기에 빠른 이해력과 필기 실력이 필요했다.
쉽게 말해 어떤 회의에서 한국어로 하는 대화를 들으며 영어로 속기록을 쓰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한국어로 들으며 한문을 빠르게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기에 늘 두 명의 사관이 함께 일했고, 서로 쓴 기록을 맞춰보기도 하면서 틀린 부분이 없는지 점검했다.
이렇게 사관이 임금의 곁에서 날마다 기록한 일기를 ‘시정기’라고 한다. 시정기는 매달 책으로 묶어서 춘추관에 보관하고, 시정기에 쓸 수 없는 긴밀한 이야기는 사관이 따로 적어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도 했다. 사관이 집에 간직한 글과 시정기가 훗날 실록을 만드는 기초 자료인 ‘사초’가 되었다. 사초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임금도 함부로 볼 수 없었다.
어쨌든 사관은 실록이라는 이야기의 화자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물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했기에 자기 견해를 마음대로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특정한 사건의 경우 사관이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때는 실록의 기사 맨 끝에 “사신이 말하기를”이라고 시작하며 그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였다.
실록이 본격적으로 편찬되는 것은 임금이 승하한 뒤, 춘추관에서 ‘실록청’이라는 임시 관청을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실록청에서는 각종 자료를 모아 초고인 ‘초초’를 만들고, 다 함께 이를 검토하여 두 번째 원고인 ‘중초’를 만든 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하여 최종 원고인 ‘정초’를 만들었다.
정초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전의 사초나 초초, 중초는 물에 씻어 없애버렸다. 이를 ‘세초’라 하는데, 세초를 하지 않으면 사관이 원래 쓴 내용과 초초와 중초 과정에서 달라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시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세초는 주로 서울 세검정 앞의 개울에서 이루어졌다.
세초하는 날은 실록이 사실상 완성되는 날이었기에 보통 세검정 아래에 있는 넓은 바위에서 잔치가 열렸다. 실록의 편찬을 맡았던 사람들은 이런 ‘세초연’에서 그간의 수고를 치하받으며 회포를 풀었다.
실록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역시 시정기와 사관이 집에 보관한 자료였지만, 그 밖에도 비서실 역할을 한 승정원에서 매일 쓴 ‘승정원일기’와 임금에게 올라온 상소문, 주요 관청의 문서, 조정의 중요한 소식을 날마다 발행한 ‘조보’도 자료로 쓰였다. 실록청의 관리들은 이 모든 자료를 모아 날짜별로 분류하고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골라 실록에 담았다.
재위 기간이 길었던 임금은 실록의 분량도 방대할 수밖에 없어서, 재위 기간이 46년에 달한 숙종의 실록을 만들 때는 256명의 관리가 실록청에서 일하기도 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 실록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동안의 임진왜란을 거치며 단 한 벌만 살아남았다. 이조차 목숨을 걸고 전주사고에 있던 실록을 지킨 안의와 손홍록, 두 선비 덕분이었다.
전쟁 뒤 복구해야 할 수많은 서적 가운데 으뜸 서적으로 꼽혔던 《조선왕조실록》은 전쟁 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이 마련한 활자들로 복구를 시작했고, 2년 9개월 동안 노력한 끝에 선조 39년(1606), 다시 여러 벌을 완성할 수 있었다. 만약 한 벌의 실록마저 전란에 불에 탔다면 우리는 임진왜란 이전의 역사를 거의 알 수 없었을 것이다.
(p.40)
888권의 『조선왕조실록』은 매일의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조선이란 나라의 472년 일기인 셈이지요. 역사가 남긴 기록물들이 모두 시대의 일부분만 보여주듯, 『조선왕조실록』 역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조선왕조실록』보다 좋은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세하고 포괄적인 역사책으로 손꼽히는 『조선왕조실록』이야말로 조선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넓고 곧은 길입니다.
이렇듯 힘겹게 우리 곁에 남은 《조선왕조실록》은 끝없는 이야기의 보물창고가 되어 풍성한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수많은 사극과 소설, 이야기들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낸 한 줄, 한 장면에 상상력을 덧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이 없었다면 오늘날 할 수 있는 역사 이야기는 퍽 빈곤했을 것이다.
때마침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에서 개관 특별전 《오대산사고 가는 길》이 열리고 있다. 우리 역사 속 보물, 조선왕조실록의 매력을 느낄 좋은 기회다. 《조선왕조실록》 속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봄을 즐겨보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