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자 작가] 해도 웃고 달도 웃는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나는 오늘도 파아란 하늘을 쳐다보며 흥얼흥얼 노래하고 있는데 소학교에 다니는 손녀가 곱디 고운 필통하나를 들고 불쑥 나타났다.
아롱다롱한 필통은 나를 보고 방긋이 웃었다. “곱구나!” 내 눈길이 자꾸 필통으로만 갔다. 이 나이에도 볼수록 갖고 싶은 충돌을 느낌은 왜서일까? “엄마가 사 주었어요.” 손녀의 말이다. “엄마!” 엄마라는 손녀의 말에 왜서인지 나도 마치 어린애인양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고 서서히 내 눈앞에 내가 여나문살도 안될 때의 단발머리 소녀가 나타났다.
“엄마, 나 필통사주!” 엄마는 조용히 날 달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는 일찍 내가 돐도 채 되기 전에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우리 네 남매를 키우느라 아글타글(무엇을 이루려고 몹시 애쓰거나 기를 쓰고 달라붙는 모양) 눈물겨운 나날을 보내시었단다. 하기에 나는 5학년 될 때까지 그렇게 갖고 싶던 필통 하나도 없이 늘 연필을 책장 사이에 끼워 책보에 싸서 허리에 띠고 뛰어다녔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면 옆의 애가 필통을 꺼내 척 열고 연필을 꺼내는 모습 그렇게도 황홀하게 보였고 심지어 밖에서 달음질할 때 책보안의 필통 속에 연필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여도 그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렸다. 나도 어릴 적부터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새끼줄도 꼬고 가마니도 짜면서 엄마를 돕기도 하였지만 그러다가도 가끔은 그 양철필통이 그렇게도 부러워 철없이 떼질(마구 떼를 쓰는 짓)도 쓰곤 했었다.
퍽 뒤였단다. 어느 날 엄마는 나보고 “영자야! 아무래도 오늘은 너절로(스스로) 가마니 한개만 더 짜서 필통을 사거나……”
“정말? 그래도 돼요? ”
철없는 나는 엄마의 고통도 리해할 줄 모르고 제꺾(곧) 엄마손에 깎지를 걸어 “엄만 약속했슴다.”
나는 퐁퐁 뛰었다. 당장 필통이라도 생긴 것처럼…… 엄마는 서글피 웃었다. 철없는 나를 보는 엄마의 가슴이야 얼마나 쓰렸을까?
엄마는 또 밭일에 나가시고 나는 볏짚을 적셔 새끼줄부터 꼬았다. 그리곤 가마니 짜는 숙탁기(반자동기계)에 앉아 열심히 짜 내려갔다. 숙탁숙탁 술 나드는 소리, 짱짱 내려치는 마바디질소리가 뛰놀며 떠드는 아이들 소리를 압도하고 내 가슴 속에선 또 한날 즐거움의 노래소리로 들려 열심히 짰다. 어느덧 노란가마니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가마니는 또 고운 필통으로 되여 나를 보는 것만 같았다.
나는 혼자 웃었다. 이제 모서리를 깁기만 하면 되였다. 이것은 내가 못해본 일이어서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는데 엄마가 돌아와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내일 하라구 하셨다. 나는 흐뭇한 심정으로 꿈나라에 갔다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어느 사이에 다 기워 놓으셨다. 나는 너무도 좋아 해맑은 일요일날 가마니를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선장군마냥 5~6리 떨어진 농촌공소합작사에 갔었다.
“1등 안 되면 어쩌지? 그럼 또 필통두 못사구……” (그때 가마니 한 개에 1등이면 32전이고 2등은 28전이였는데 필통하나는 30전이였다.) 나는 조마조마하여 판매원 아저씨만 바라보았다. 그 아저씨는 또 달랑 가마니 한개만 메고 온 나에게 “이건 네가 짠 거니?” 하시면서 이리보고 저리 보시더니. “자, 1등을 주자”고 하시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아저씨를 안고 빙빙 돌면서 “우라!(러시아어로 ‘만세’)”를 외치였다.
나는 끝내 그렇게도 갖고 싶던 필통을 샀다. 첫 필통이었다. 필통의 그림 아이가 나를 보고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나는 필통을 꼭 쥐고 포르릉 포르릉 날았다. 멀리 동구 밖에 엄마가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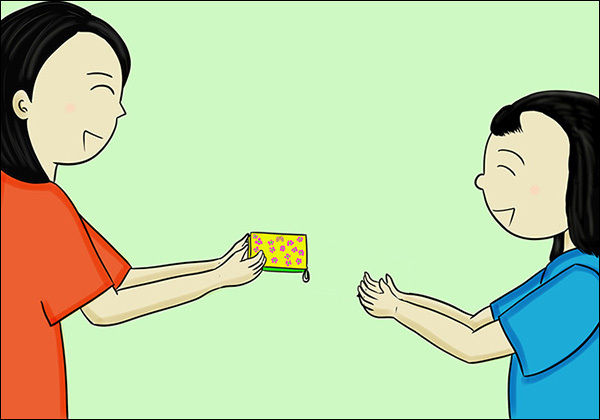
“엄마! 필통……” 내가 달려가서 필통을 보이고 거스름돈(승천이라고 했다) 2전을 엄마 손에 쥐어 주면서 “엄마”이거라두 오빠 숙사비에 보태줘. 이담엔 돈 안쓸 게…… 이날에 엄마는 나를 꼭 끌어안고
“미안하구나! 어린 너까지 고생시키는구나!”
“아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아버지도 없는데 내가 너무 철없어서… 엄마! 나 공부도 잘 하구 가마니도 잘 짜면서 엄마를 도울게.”
나의 볼에 엄마의 뜨거운 것이 뚝 떨어졌다. 나도 왜서인지 눈물이 핑 돌았다. 동네분들도 눈굽(눈의 가장자리)을 적시었다.
햇님은 나에게 따스한 빛을 뿌려 주면서 활짝 웃어주고 강아지도 뱅뱅 나를 안고 있는 엄마 주위를 맴돌아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눈물을 쓱 문지르고 엄마보고 웃었다. 엄마도 날보고 웃었다.
그날 저녁 나는 등잔불 밑에서 필통을 보고 또 보았다. 그리고 잘 때에도 꼭 끌어안고 잤었다.
“멀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요?” 공부하던 손녀가 나를 흔들었다. 이 말에 그만 나의 영화필름이 뚝 끊어졌다.
나는 웃으면서 “그렇게 가난하던 그 시절 고향 뒷산에 묻고 온 가슴 아픈 사연들을 너희들이야 어찌 알겠니?”하였다. 그리고 나는 그 필름을 거꾸로 되돌려 소녀에게 보이었다.
“그리구 이 필통은 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 시종 나의 글동무가 되여 주었다. 나의 오빠네들두 모두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셔 엄마도 기뻐하시구.”
“할머니, 미안해요.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는데두 우린 불만 부리죠?”
나는 빙그레 웃었다. 그렇다 “사과를 먹어봐야 사과 맛을 안다.”고 지난날을 알아야 오늘의 행복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시원한 가을바람이 내 얼굴에 부딪혀 마음이 한결 상쾌하고 흰저고리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허리를 질끈 동인 사십대의 엄마를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마치 ‘엄마, 나 필통사주!’ 하던 소녀애, 가마니를 짜서 필통 사던 소녀애, 자기의 첫 필통을 안고 퐁퐁 뛰던 소녀애를 보는 것 같구나!
이 시각 나도 티 없이 맑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