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일본살이 반백 년에 이르지만, 여전히 한국어로만 소설을 쓰는 작가’가 있다. 그가 바로 재일 소설가 김길호 작가다. 꼭 일본어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외국에 건너가 처음 몇 해는 언어의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10년, 20년, 50년... 세월이 흐르면 모국어보다는 현지어가 먼저 튀어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쯤 되면 현지어가 모국어 보다 우선될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김길호 작가의 일본어는 한국어를 뛰어넘는 언어일 텐데 왜, 무슨 까닭으로 그는 한국어 글쓰기를 고집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들을 절호의 기회가 지난 9월 26일 부산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이경규 소장)주최의 <제24회 국제학술대회 '재일한인 연구 10년, 연구 성과에 대한 회고와 성찰', 아래, ‘동의대 재일한인 연구 학술대회’>였다. 평소 소식을 주고받던 김 작가로부터 ‘동의대 재일한인 연구 학술대회’ 소식을 들은 것은 행사 1주 전쯤이었다.
보내온 행사 일정을 보니 <주제1> 발표자로 재일동포 2세인 오문자 수필가의 <가교 역할을 희망한 재일코리안 여성의 염원>이고, 김길호 작가는 <주제2> 발표자로 <일본살이 반백 년, 한국어로만 소설을 썼던 이유>라는 내용이며, 마지막 발표자인 이홍장 고베학원대학교 현대사회학과 준교수의 <주제5> <재일 조선인의 '민족'을 재고한다. -속성에서 공동성으로-> 발표 등 상세한 일정이 적혀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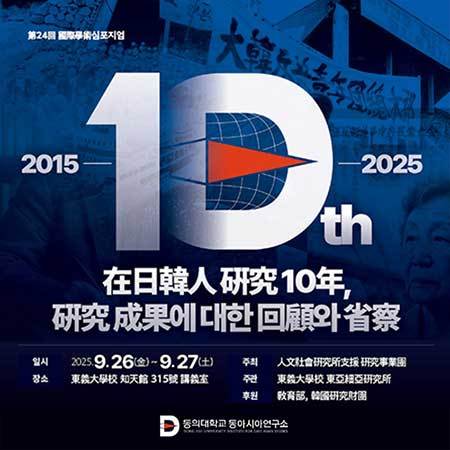
그러나 학술대회 기간인 9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은 개인적인 일로 학술대회장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대신 김 작가는 학술대회를 마치고 나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의 상세한 내용을 글로 보내왔다. 그 가운데 자신이 한국어로 작품을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필자(김길호 작가)의 일본살이는 1973년 군대를 제대해서 왔으니까 52년째다. 그동안 계속 한국어로 소설과 여러 칼럼도 쓰고 <제주경제일보> 인터넷신문에 '김길호의 일본아리랑'을 연재(현재 186회)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한국어로 소설을 쓰는 작가는 필자 이외에 한, 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다. 시인으로는 도쿄에 사는 왕수영 선생이 계시다. 현재 일본에 살고있는 한국 국적 동포는 약 40만 9,000명이고 조선 국적이 약 2만 3,000명이다. 재일동포는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일본에 뿌린 내린 세대가 거의 전부여서, 필자처럼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한글 세대들은 (물론 뉴커머라는 신 1세가 불어나고 있지만) 소수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라도 있을까 해서 이번 발표를 위해 필자의 저서 세 권과 기사 등등 5kg 가까운 자료들을 가지고 갔다.”
김길호 작가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어로 소설을 쓰는 작가 한 사람 아니, 문인 한 사람도 없다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한글세대가 없는 재일동포 사회라지만 한국 국적, 조선 국적 합하면 모두 43만 명이 넘는데 문학으로 우리말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이건 부조리 속의 부조리다. 그래서 필자는 문학 이전에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어로 소설을 계속 쓰고 있다.”
김길호 작가가 우리말로 소설을 쓰고 있는 가장 적확한 이유를 들려주었을 때 나는 문득 매천 황현(黃玹.1855~1910) 선생이 떠올랐다. 대한제국 말기 우국지사였던 선생은 1910년 한일병탄으로 500년 사직을 일제에 송두리째 빼앗기던 날, “나라에서 500년이나 선비를 길렀는데, 나라가 망할 때 누구 하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안 한다면 그것 역시 치욕이다”라고 말하면서 절명시(絶命詩) 4수를 남기고 음독 자결로 생을 마감했던 분이다.

물론 김길호 작가의 ‘한국어로 소설을 쓰는 작가 한 사람 아니, 문인 한 사람도 없다면 말이 안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말 글쓰기’를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완전히 동의하지만 혹시 이 바탕에는 문단 선배들의 고 말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다.
사실, 기자는 지난해 4월 12일, ‘평생 한국어연구에 몰두한 재일동포 김예곤(金禮坤, 91)’ 선생을 취재하기 위해 오사카를 방문했는데 그때 김길호 작가와 대동한 적이 있다. 연로하신 김예곤 선생의 효고현 다카라츠카시(兵庫縣 宝塚市) 자택까지 안내했던 김길호 작가를 귀국 전에 오사카에 있는 동포가 운영하는 감자탕집 경애관(京愛館)에서 만났을 때 김 작가가 한 이야기를 기자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인 1973년, 일본으로 건너온 저는 1979년 <현대문학> 11월호에 단편소설 ‘오염지대’로 이범선 선생님 초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뒤, 이범선 선생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1987년 <문학정신> 8월호에 단편소설 ‘영가(靈歌)’로 김동리 선생님 추천을 받고 한국 문단에 등단했지요. 본국 지향의 문인이 되기 위해서 한국 문단에 응모한 것이 아니라 일본 국내에는 한국어 문예지가 하나도 없는 불모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한글로 소설을 쓰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동리 선생님은 추천사에서 ‘특히 김길호 씨만 알고 있을 그곳 교포 사회의 많은 소재를 어떻게 표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우리의 기대는 자못 크다.’라고 하던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저만이 알고 있는 재일동포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지, 식민지 종주국에서 3, 4세대를 이어온 재일동포들의 한 많은 삶이 문학으로 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말 이상의 표현 매개체는 없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의 한글세대로 자란 제가 스스로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마저 느끼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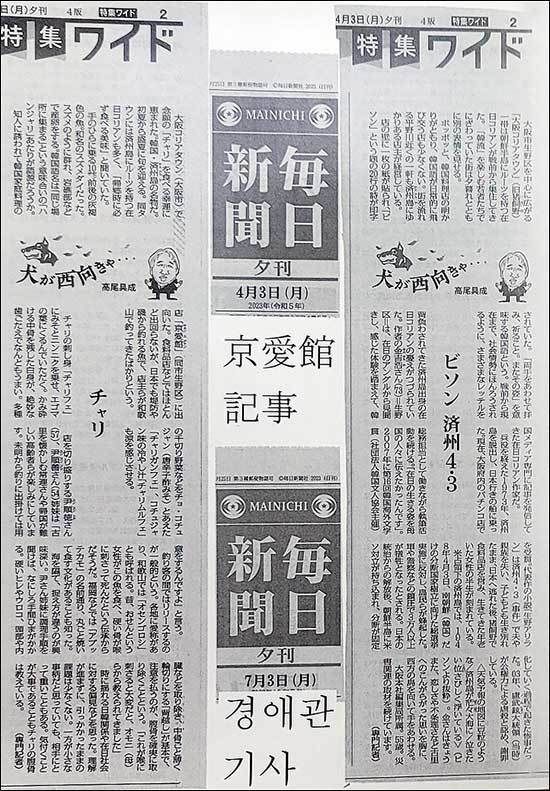
이번 ‘동의대 재일한인 연구 학술대회’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김길호 작가는 ‘한국어로만 소설을 쓰는 이유’를 발표했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김 작가가 모든 글쓰기를 한국어로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본업인 소설 외에도 김 작가는 1990년 5월 15일부터 3회에 걸쳐 통일일보 문화란에 <일본고교검정교과서 윤동주 시 소개의 의미>라는 글을 일본어로 기고하였는데 한국에서 윤동주 시가 일본교과서에 실렸다고 알게 된 첫 글이 바로 김 작가의 글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글은 일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켜 윤동주 시인이 유학한 교토 도시샤대학에서 ‘도시샤교우회코리아클럽’이 결성되었고 1992년 2월 16일 ‘윤동주 추도회’를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윤동주시비건립회>가 구성되었다. 그리하여 1995년 2월 16일 윤동주 시인이 옥사한 50주년에 동 대학 교정에 시비건립을 하고 제막식을 가질 수 있었다. 당시 제막식에는 한국에서 윤동주 친족들과 김우종 문학평론가 등도 참석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도시샤대학 캠퍼스에 있는 윤동주 시비를 찾을 수 있게 된 데는 김길호 작가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길호 작가는 1994년 2월부터 1995년 1월까지 매달 1회씩 ‘원코리어 문학의 밤’의 대표 간사를 맡아서 일제강점기에 발표된 한국 소설 가운데 한국의 TV문학관에서 방영한 김동인의 <감자>, 나도향의 < 벙어리 삼룡이>,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등 10명의 작품 12편의 상영과 함께 작품 해설 등을 곁들여 많은 호평을 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작업 뒤에는 단편 10편과 윤동주의 <서시>, 이육사의 <청포도> 등 5명의 시 20편을 한일 대역(對譯)으로 엮어 도쿄에 있는 동포 출판사 신간사(新幹社)에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 10월에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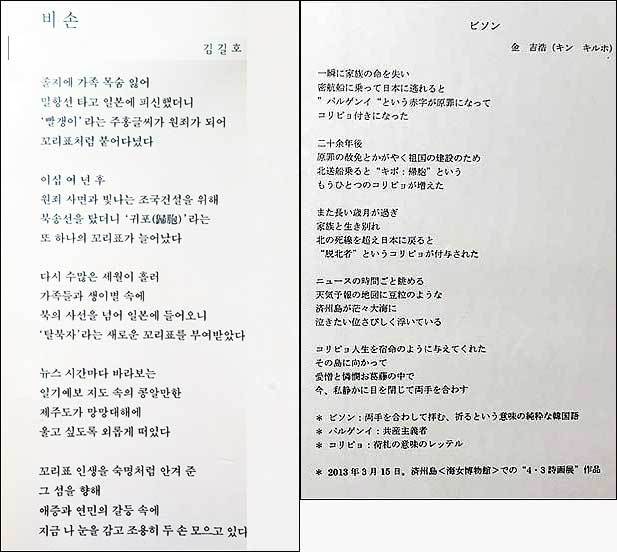
김길호 작가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는 문학 심포지엄이 있다. 그것은 2007년 6월 13일 오사카에서 한국문인협회 주최로 연 <제17차 해외한국문학 심포지엄>과 <제16회 해외한국문학상’ 시상식>이다. 한국에서 김년균 이사장을 비롯해서 임원들과 회원 36명이 참가하는 큰행사였다. 김 작가는 이날 행사에 대해 “그동안 여러 학회를 비롯한 제단체들의 주최로 한일문학이나 혹은 재일 동포문학에 대한 심포지엄과 교류가 한일 양국에서 개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처럼 한국에서 문인들이 대거로 참가해 우리말 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은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해외한국문학상은 도쿄에 거주하면서 한일 두 나라 언어로 작품 활동을 하는 왕수영 시인과 김길호 작가가 동시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고 했다. 이때 김 작가는 수상의 기쁨보다는 한국문인협회가 일본에서 ‘우리말로 심포지엄’을 열었다는 사실이 한없이 기뻤다고 했다.
한글세대가 없는 재일동포 사회는 이제 1세가 10% 이내로 줄었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 독자가 없는 일본에서 한국어로 글을 쓰는 문인은 왕수영 시인과 소설을 쓰고 있는 자신밖에 없을 것이라고 작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말 글쓰기는 문학적인 의미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말 지킴이’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확고히 갖게된다고 말하는 김길호 작가의 긍지 어린 ‘우리말 사랑 정신’이 이번 ‘동의대 재일한인 연구 학술대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한국인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한가지 바람을 더 말한다면, 오늘 579돌 한글날을 맞아 나라밖에서 '우리말글'을 놓지 않고 그 언어로 동포들의 생생한 삶을 기록하고 그 언어로 '한국인의 혼과 정신'을 묵묵히 이어가는 작가들을 챙길 줄 아는 모국의 사려깊은 의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