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왕실 이야기.
예나 지금이나 최고 권력자 주위의 이야기는 세간의 관심을 끈다. 밝은 빛처럼 시선을 모으는 권력의 속성처럼, 임금과 그 주변의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서나 역사에 기록되고 회자하였다. 다만 정보의 통제가 엄격했던 옛날에는 덜 알려지고, 지금은 더 많이 알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박영규가 쓴 이 책, 《조선시대 왕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는 왕실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임금과 세자는 어떻게 지내고 왕후와 후궁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다. 막연히 사극으로만 보던 왕실 사람들의 생활을 마치 옆에서 보듯이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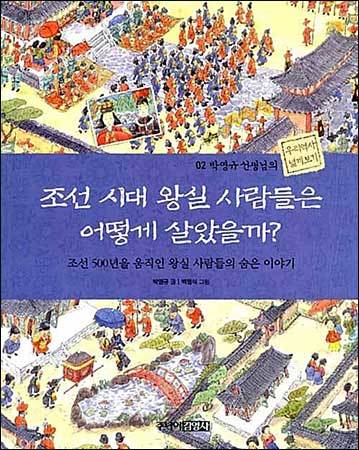
이 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왕비 간택과 외척에 관한 이야기다. 간택은 왕실에서 혼인을 앞두고 혼인 후보자들을 대궐 안에 불러 배우자를 뽑던 제도다. 고려 때만 해도 이런 제도 없이 상궁을 앞세워 중매하는 형식으로 혼인했지만, 조선시대 들어서는 간택을 통해 일종의 ‘선발’을 했다.
태종은 신하 이속이 왕실과의 중매 혼인을 거부하자 괘씸하게 여기고 ‘간택령’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왕실의 혼인을 위해 간택을 할 때는 먼저 전국에 금혼령을 내리고, 비슷한 나이의 자식을 둔 양반들에게 단자(4대 조상과 본인의 생년월일을 적은 문서)를 써내도록 법으로 정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첫 간택 사례는 세종 11년 기사에 나온다. 세종은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를 내쫓은 뒤 간택 방법을 바꿔서 세자빈을 뽑자고 제안한다. 휘빈 김씨도 간택으로 뽑았지만, 그 간택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뽑지 못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p.68)
“동궁의 배필을 간택할 때는 마땅히 처녀를 잘 뽑아야 한다. 집안과 덕성이 중요하긴 하나 인물이 아름답지 못하면 또한 안 될 것이다. 나는 부모의 마음에서 친히 간택하고 싶지만, 옛 법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처녀들을 창덕궁에 모이게 해서 내관과 시녀, 효령대군이 함께 참여해 뽑도록 해야겠다.”
효령대군은 종실의 대표 자격으로 간택에 참여했다. 세종이 두 번째 간택에서 ‘인물’을 강조한 것을 보면 첫 번째 간택에서는 그저 가문만 보고 뽑아 세자가 휘빈 김씨를 가까이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세종의 이 제안에 신하들은 대부분 찬성했지만, 허조는 반대했다. 만일 한곳에 모아 가려 뽑으면 오로지 얼굴만 보고 취하게 되어, 덕성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세종은 어차피 잠깐 보고 덕성을 알 수 없을진대, 그렇다면 용모로 뽑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인물 면접’을 통과한 이가 순빈 봉씨였으나, 순빈 봉씨도 문종과 사이가 나빴고 결국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나고 말았다. 세종은 이제 종실 대표에게 맡기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며느리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마침내 아들 의창군을 장가보낼 때 실천에 옮긴다. 그 뒤로 시부모가 될 사람이 며느리를 직접 뽑는 관례가 정착되었다.
딸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운 좋게 왕후가 되면, 아버지는 ‘국구(임금의 장인)’가 되어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 국구는 의례적으로 정1품 돈령부 영사가 되어 임금의 친인척을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맡아 처리했다.
조선 초부터 명종 이전까지 국구는 주로 돈령부 영사를 당연직으로 하면서, 조정의 정승 반열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선조 이후부터는 돈령부 영사와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겸했는데, 둘 다 그다지 실권은 없는 자리였다.
현종 이후에는 국구가 궁궐 호위를 책임졌던 어영대장과 훈련대장을 당연직으로 겸했다. 임금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리를 맡아 왕실과 긴밀한 관계임을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형식적인 자리였고, 실제로는 왕후의 남동생이나 오빠, 곧 국구의 아들들이 실권을 가진 직책을 맡곤 했다.
임금의 장모는 외명부에서 가장 높은 작위인 정1품 부부인(府夫人)에 봉해졌다. 부부인은 종친 가운데 대군의 부인에게만 내리는 작위였으니, 임금의 장모는 대군부인이나 정1품 정승들의 부인들에게만 내리는 정경부인과 같은 위치라 할 수 있었다.
국구에게 실권은 없으나 정1품의 관직을 내리는 까닭은 경제적 혜택과 명예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였다. 일종의 ‘품위 유지용’ 관직이었던 셈이다. 정1품 관직자에게는 토지 110결과 더불어 계절마다 녹봉이 내려졌는데, 조선시대의 중산층이 대개 5결 이상 토지를 가진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임금의 치세는 외척 관리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다. 외척들과의 관계는 훗날 세자의 치세까지 고려해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언제나 권력의 주위에는 사람이 들끓기 마련이라 잡음도 많았지만, 외척의 발호를 경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워낙 투철했던 만큼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처신을 조심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외척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세도정치가 시작된 조선 후기부터는 국가 기강이 급격히 무너졌다. 예나 지금이나 공사의 구분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라, 외척이 발호한 그때부터 조선은 이미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최고 권력자의 주변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잘 해낸 지도자는 많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주변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렇듯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어려운 것을 ‘무사히’, ‘제대로’ 해내는 지도자를 오늘날에도 봤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