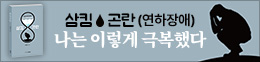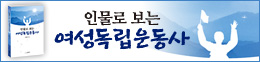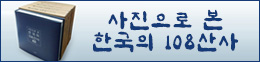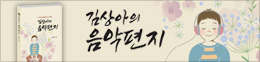[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1730년, 조선조 영조 때 그린 《이원기로회계도》라는 그림에 보이는 궁중의 춤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이 그림은 나이 많은 원로들의 모임 장면으로, 각각 독상을 받아놓고, 춤과 음악을 감상한다는 점, 춤의 형태는 포구락(抛毬樂)과 처용무(處容舞)이며 음악연주형태는 삼현육각(三絃六角)과 집박, 가야금과 거문고와 같은 현악기 연주자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
또 궁중의 춤은 정재(呈才)라고 부르는데, 재예를 바친다는 넓은 의미였으나, 점차 궁중의 춤으로 정착되었으며 당악(唐樂)정재와 향악(鄕樂)정재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 전자는 고려시대 중국에서 들어온 춤을 가리키는 말이고, 후자는 이전부터 전래되고 있는 우리의 고유한 춤을 지칭하는 이름이란 점, 양자의 차이나 특징의 기준은 모호해 졌으나 죽간자(竹竿子)의 유무와 춤을 추는 중간에 무희들이 직접 한문구호(口號)나 치어(致語, 임금의 덕을 칭송하는 말)를 부르면 당악정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말했다.
한반도에 당악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은 문헌이나 절의 탑, 석비, 종(鍾) 그림 속에서 발견되며 당악이 들어오면서 이전의 음악을 향악이라 부르는 향당(鄕唐)의 구별은 마치 오늘날 서양음악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음악을 <국악>이라 부르는 예와 같다는 점, 이처럼 대칭을 이루는 명칭으로는 양복과 한복, 양식과 한식, 양옥과 한옥, 양약과 한약 등 원류가 서양이냐 한국이냐의 양한(洋韓)구별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
||
|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2호 "진주포구악무", 문화재청 제공 | ||
이 춤이 당악정재인가 아니면 향악정재인가를 구별하는 첫째 방법이 죽간자의 유무이다. 죽간자는 당악정재에 쓰이는 의물의 하나로 큰 대나무에 등나무를 쪼개어 감아 매고 납으로 장식을 하고 붉은 칠을 한 도구이다. 다시 말하면 죽간자를 든 무희의 안내를 받아 그 뒤를 따라 들어오고 또한 나갈 때에도 죽간자를 따라 나간다면 당악정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향악정재는 대부분이 죽간자 없이 무희들이 나와 엎드려 인사를 하고, 바로 춤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당악정재는 한문으로 된 구호나 치어를 노래하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올수록 이러한 구분은 모호해 지고 있다. 당악정재의 스타일로 향악정재를 만들기도 하고 한문으로 된 구호나 치어도 비슷하게 지어 부르기 때문이다.
옛 기록에 의하면(송사 악지-樂志 권 142) 이 포구락은 무려 150여명이 추었다고 한다. 마치 고대의 운동경기와 관련이 있는 춤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당(唐)을 거쳐 송(宋)대에 와서 포구놀이가 민간에서 많이 유행했다고 전한다. 고려에 들어온 이 춤은 당시 고려 교방에 속해있던 초영(楚英) 등이 임금 앞에서 연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무희는 12명 짝수로 좌우 6명씩 두 대(隊)로 나누어 추었다. 고려시대의 포구락에 관한 기록에는 반주 음악이 <절화 영(折花令)>, <수룡음영(水龍吟令)>, <소포구락 영>, <청평악 영(淸平樂令)> 등을 연주한다고 되어 있고, 창사(唱詞, 정재(呈才) 때에 부르는 가사)가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음악들의 실체는 어떤 형태인가 알 수가 없다.
여하튼 포구락은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자주 무대에 오르는 거의 유일한 전통무용이다. 기녀대(妓女隊)가 좌우로 편을 갈라 공놀이를 하는 춤으로 구멍에 공을 넣으면 상을 받고 실패하면 얼굴에 먹칠을 당하는 재미있는 춤이다.
 |
||
| ▲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의 "평양검무", 문화재청 제공 | ||
우리나라에 당악이 들어온 흔적은 이미 통일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와 당나라 군사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지금의 공주 부근에 당나라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을 때, 구일이나 성천 등 신라인들 28명을 보내 당악을 배우게 했다는 기록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의 기록, 옛 절의 탑이나 석비, 그리고 종(鍾)의 그림속에서 당나라의 악기형태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고려 이전에 이미 당의 문물이 한반도에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 제4대 광종(949~975)때에는 당에 사신을 보내 당악기와 악공(樂工)을 청한 바 있고, 문종 때에는 각종 당악기와 노래와 춤을 가르치는 악사나 이들이 받는 봉록까지 정했던 기록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예종 9년 이후에는 송나라에 갔던 사신이 송의 휘종이 주는 여러 종류의 악기, 즉 방향이나 비파, 쟁, 공후, 생, 피리, 장고, 적, 지, 소 등과 연주법을 알 수 있는 그림 등을 받아오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 이후에 당악(구체적으로는 송나라의 음악)이나 당악정재가 들어 왔는데, 이러한 외래로부터의 유입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음악이나 춤과의 구별이 되었다. 다시 말해 외래의 음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존재해 오던 음악모두 아우르는 말은 향악 곧 춤은 향악정재, 악기들은 향악기라는 이름으로 구분되었다.
외래의 것이 유입되면서 구분을 위한 이름을 갖게 되는 경우는 비단 음악이나 춤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조선말기에는 서양음악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음악을 <국악>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양복과 한복, 양식과 한식, 양옥과 한옥, 양약과 한약 등 대칭되는 이름이 생겨났다.
이처럼 그 원류가 당이냐 향이냐의 향당(鄕唐)구별, 그리고 그 이후의 서양이냐 한국이냐의 양한(洋韓)구별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