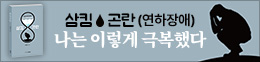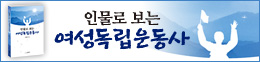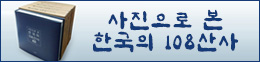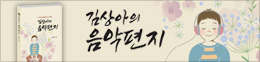[그린경제/얼레빗 = 양승국 변호사] 공양왕릉에 이어 월산대군 무덤을 찾았습니다. 월산대군 무덤은 저번에 찾은 송강이 사랑한 기생 강아 무덤 인근 지역에 있습니다. 사실 그때 강아 무덤를 보고 난 후, 연이어 인근에 있는 월산대군 무덤도 찾으려 했었는데, 이때도 이정표 부실로 월산대군 사당만 보았지 월산대군의 무덤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당은 찾았는데 무덤은 찾지 못하였다는 게 이상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사당과 무덤 사이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어 강아 묘 쪽으로 있는 토끼굴로 하여 무덤을 찾아갔는데, 먼저 월산대군 후손들의 무덤이 보이더군요. 무덤들 앞에는 비가 있는데, 이곳에는 월산대군 3세까지 무덤이 있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비석 뒷면을 보니 18세 종손 이재달씨는 육군 중장에 국가보훈처 장관을 하였더군요. 2세, 3세의 무덤이 있다면 당연히 그 위로 1세인 월산대군의 무덤도 있을 텐데, 이들 후손들 무덤 위로는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뚫고 가려는데 길도 없는 숲속을 뚫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양복 입고 구두 신고는 더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내려와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정표가 없어 헤매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왔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고양 갈 때에는 제대로 준비하여 월산대군을 찾은 것입니다.

▲ 풀이 우거지고 관리가 안 된 월산대군 무덤
월산대군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풀만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래도 임금이 될 수 있었던, 아니 임금이 되어야만 했던 대군의 무덤을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한 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월산대군이 어째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인 지부터 얘기해야겠군요.
예종이 재위 13개월 만에 죽자 다음 왕을 누구로 할 것인지가 당장 문제가 됩니다. 다음 왕이 누구라고 선포하는 것은 왕실의 제일 어른이신 정희왕후 윤씨(세조의 왕비)인데, 당시 실권자 한명회가 예종이 죽자마자 비밀리에 정희왕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정희왕후는 의경세자 - 예종의 형으로 일찍 죽어 왕이 되지 못함 - 의 둘째아들 자을산군을 다음 임금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장자 계승의 원칙에 의하면 맏아들인 월산대군이 임금이 되어야 하고, 또 당시 월산대군에게 임금이 되지 못할 특별한 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자을산군의 아내가 한명회의 딸이기에 한명회가 자을산군을 임금으로 강력하게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희왕후는 한명회의 압력에 눌려서인지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자을산군을 임금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아마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왕족들이나 대신들도 많았겠지만, 이미 정희왕후가 선포하여버렸고, 또 한명회의 위세에 눌려 제대로 항의도 못했나봅니다. 한명회는 예종에게도 자기 딸을 시집보냈었는데 성종에게도 자기 딸을 주었다면, 삼촌과 조카에게 모두 자기 딸을 시집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한명회의 권력욕을 이런 데서도 알 수 있군요.
이렇게 임금이 될 수 있었던 월산대군은 이후 풍류를 즐기면서 정치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합니다. 현명한 거죠. 사실 자을산군이 임금이 되자 일부 신하들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 월산대군을 멀리 귀양 보내라고 하였는데, 만약 정치 근처에 얼씬거리면서 뭔가 꼬투리가 될 만한 행동을 하였으면 아무리 형을 사랑한 성종이라도 월산대군을 죽이라는 신하들의 강청을 물리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월산대군보다 먼저 왕위를 계승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종의 아들 제안대군이지요. 아무리 예종이 죽을 때 제안대군의 나이가 4살이라지만 예종의 아들이 왕위를 잇는 것이 원칙이었을 테니까요.
월산대군 무덤 앞의 안내문을 읽어봅니다. 안내문에는 월산대군이 문장이 뛰어나 그의 작품이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고 적고 있네요. 예! 제가 학창시절 시조를 배울 때 월산대군의 시조도 배운 것이 생각납니다.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오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매라.
월산대군의 무덤 뒤편에는 아내 순천 박씨의 무덤도 있습니다. 역시 풀이 무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는 순천 박씨는 월산대군이 34살에 죽은 이후에도 계속 과부로 살다가 연산군에게 겁탈당하여 자살했다고 나옵니다. 순천 박씨의 동생 박원종이 중종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얘기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 연산군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당시 연산군으로 분한 신영균씨가 순천 박씨를 겁탈하는데, 얼핏 신영균씨 손목에서 손목시계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이 겁탈 기사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연산군이 색욕에 미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53~55세 정도 되었을 순천 박씨를 겁탈하겠냐는 것이지요. 역사는 승리자의 입장에서 기록되기 마련이니까 과장되었다는 것이지요.
 |
||
| ▲ 월산대군 무덤 앞의 신도비 | ||
무덤 앞에는 신도비가 있습니다. 비의 내용은 조선시대 최대의 간신으로 지탄받는 임사홍이 썼다고 하네요. 비문의 내용은 심히 마모되어 잘 알아볼 수 없지만, 맨 위에 이보다 큰 글자로 새긴 제목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월산대군 비록(月山大君 碑錄).
그런데 전서체로 쓰인 제목의 첫 두 글자는 글자가 아니라 초생달과 산을 새겨 넣었습니다. 월산대군의 ‘월산’이 달과 산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한 모양입니다. 아! 아니겠다! 어차피 한자가 상형문자이니까, ‘月山’의 초기 한자 모양이 저 비의 달과 산 모양처럼 되어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신도비의 제목을 멋진 전서체로, 특히 ‘월산’은 그림에 가깝게 썼다는 것은 평소 풍류를 즐기던 월산대군을 제대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산대군의 무덤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보통 무덤은 남향하고 있다는 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월산대군은 죽으면서 자신의 무덤을 북쪽을 바라보도록 했고, 후손들은 일절 관계에 나갈 것을 염두에 두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북쪽을 바라본다는 것은 죽어서도 한양을 쳐다보기 싫다는 것이고, 이는 자신이 임금이 되지 못한 섭섭함도 포함된 것이 아닐까요?
눈앞으로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그 너머로 월산대군의 사당인 석광사(錫光祠)가 있습니다. 이제 월산대군의 사당과 무덤은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처음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노선을 정할 때에 담당자가 이렇게 노선을 정하면 월산대군의 무덤과 사당이 갈라서게 된다는 것을 알기나 알았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석광사에 다시 들러봅니다. 석광사가 있는 마을은 능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능(陵)이 있는 마을이란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래도 임금이 되지 못한 월산대군의 무덤을 능으로 생각하여 마을 이름도 능골마을이라 했군요.

▲ 월산대군 사당 앞에 서 있는 회화나무
사당 앞에는 커다란 회화나무가 서 있고, 이 나무에서 남쪽으로 5m 정도 떨어진 곳에는 작은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무를 오히려 어미나무라 하네요. 작은 나무는 이씨 집안의 지손이라 불렀고, 큰 나무는 외손이라 했는데, 큰 나무가 어미 나무보다 더욱 크고 번성하였기에 외손 집안도 더욱 번성했다고 합니다.
다른 곳의 사당과 마찬가지로 이곳 사당도 문이 잠겨 있습니다. 저는 사당 밖에 서서 담장 너머로 사당을 바라보며 잠시 묵념을 올립니다. 임금이 되지 못한 대군.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 풍류로서 문장으로서 더 이름을 날린 대군. 월산대군이여! 500년 뒤의 이 후손이 잠시 대군의 품안에 들어왔다 갑니다. 비록 대군의 무덤 앞을 지나는 고속도로의 차들 때문에 편안히 쉬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미욱한 후손들을 그래도 측은하게 보아주소서.

▲ 월산대군 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