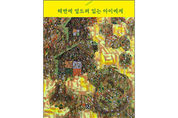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그의 눈에 띄일 때가 됐지 나도 죽음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 어머니 주위에는 늘 있어 어느 때는 등 굽고 조그마해진 어머니를 업고 있어 나를 본 그가 네가 먼저 가고 싶니 농담인 게지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 마치 마저 써야 할 시가 좀 더 있다는 듯 장석 시인의 세 번째 시집 《해변에 엎드려 있는 아이에게》에 나오는 시 ‘죽음에 관한 농담’입니다. 장 시인은 제 고교 동기로, 고등학교 때도 화동문학상을 탄 문재(文材)였습니다. 고교 졸업 뒤에도 서울대 국문과를 나와 198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였지요. 그렇지만 본격적인 문인의 길을 걷지 않고, 가업을 이어받아 경남 통영에서 오랫동안 바다의 시어(詩語)를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두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오랜 침묵을 깨고 시집 《사랑은 이제 막 태어난 것이니》와 《우리 별의 봄》을 연달아 냈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시집을 작년 11월에 냈고요. 40년 동안 장 시인의 가슴 속에 익을 대로 익은 시어가 쏟아져나오기 시작하니, 2년 사이에 3권의 시집을 냈네요. 이번 시집에서 저에게는 이 시가 먼저 제 눈에 들어옵니다. 저도 이제는 노년층에 들어섰으니, 저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고교 11년 선배인 양삼승 변호사가 《다섯 판사 이야기》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작년에 《멋진 세상 스키로 활강하다》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스키장을 돌아보시고 – 심지어는 헬리스키까지 하시고 – 재미있는 스키 이야기를 책으로 내시더니, 이번에는 판사 이야기를 책으로 내셨군요. 그런데 책 표지에 ‘양삼승 장편소설’이라고 쓰여있네요. 소설이라고 하니 허구의 이야기가 먼저 연상되나, 실제 판사의 실제 이야기를 쓰신 것입니다. 소설로 쓴 이유에 대해 선배님은 책머리의 ‘작가의 변(辯)’에서 논문에는 감동이 없지만,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지요. 메마르게 판사 이야기만 사실적으로 쓰기보다는 여기에 소설적 색깔을 더하면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고 감동이 있겠지요. 책에 나오는 다섯 판사는 양회경, 이영구, 양병호, 양삼승, X. Z. Yang 판사입니다. 제가 읽어보니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는 소설적 색깔만 입혔을 뿐 거의 다 사실로 보입니다. 마지막 X. Z. Yang 판사 이야기만 빼놓고요. 양 선배는 X. Z. Yang 판사 이야기는 절반 정도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앞의 판사들과는 달리 영어로 그것도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장충식 총장님께서 – 총장을 그만두신 지 오래되셨지만, 저는 지금도 총장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 《학연가연》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1967년에 36살의 나이에 전국 최연소 대학 총장이 되어 평생을 단국대 부흥을 위해 애쓰셨던 총장님께서 2018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학교 누리집을 통해 연재했던 글을 책으로 내신 것입니다. 《학연가연(學緣佳緣)》이라는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평생을 교육자로 사시며 맺은 인연 가운데 아름다운 인연을 글로 쓰신 것이지요.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총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세월의 무게를 더욱 실감하면서 나의 옛일을 반추하는 시간이 잦아졌다. 그 시간 속에서 나와 배움터이자 삶터인 대학에서 맺은 인연을 정리해 보자는 생각을 했다. 대학에서 맺은 인연들 가운데 선하고 좋은 매듭을 맺은 일들을 정리한 글이니 《학연가연(學緣佳緣)》으로 연재 제목을 정했다." 총장님께서 이 책을 제게 보내신 것도 제가 총장님과 한국예술종합대 최고지도자과정(CAP) 8기를 같이 다닌 인연이니, 저도 일종의 학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 총장님은 모두 20꼭지의 글로 사람들과의 인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 사진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요? 미 육군 소령 로버트 압보트(Robert Aborr)가 1950년 7월 무렵 대전 인근에서 찍은 사진이라는데, 《100년 동안의 폭풍우》에도 이 사진이 실렸습니다. 저자 김영란 선생은 보도연맹원 학살을 얘기하면서 이 사진을 책에 실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한때 좌익이었던 사람들도 전향하면 자유대한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다며 보도연맹을 만들었었지요.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이들이 위험인물이라며 즉결처형 하도록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는지 정확한 숫자도 알 수 없는데, 적게는 10만 명 많게는 30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몸이 움찔합니다. 두 발이 붙잡혀 엎드려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움찔한 것입니다. 학살되어 구덩이에 내팽개쳐진 사람들처럼 저 사람도 사진이 찍힌 지 얼마 안 되어 학살되었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애처롭게 쳐다보는 눈길에 저도 모르게 몸서리쳐집니다. 저 사람은 누굴까? 시신은 제대로 찾기나 했을까? 아무리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이라지만 잘잘못도 가리지 않고 사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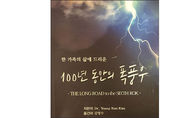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전 서울법대 문우회 회장인 김영수 시인이 《The long road to the sixth ROK)》라는 책을 뒤쳤습니다. ROK라면 ‘Republic of Korea’의 약자인데, 그러면 제목을 직역하면 ‘제6공화국으로의 기나긴 길’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김 시인은 이를 《한 가족의 삶에 드리운 100년 동안의 폭풍우》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한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저자가 자기 아버지가 태어난 1907년 무렵부터 100년 동안 한국 격동의 역사와 그 폭풍우 같은 역사 속을 헤치고 나온 가정사를 버무린 책입니다. 책 제목을 저자는 한국이 군사정권을 끝내고 민간정부로 들어선 6공화국까지의 공적 역사에 중점을 두고 정했다고 한다면, 역자는 그 공적 역사에 휘둘린 한 가정의 가정사를 중시하여 제목을 붙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영문책을 뒤친 것이니까, 저자는 일응 외국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저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니까 외국인이긴 하지만, 저자는 김 시인의 친누님이십니다. 누님인 저자 김영란은 1960년 미국 유학을 떠났다가, 그대로 미국에 눌러앉아 미국 시민이 되신 분입니다. 책을 읽으면 우리가 잘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윤재윤 변호사는 수필집 《잊을 수 없는 증인》에서 ‘10분이 주는 자유’에 대해 얘기합니다. 재윤 형이 예전에 인천지방법원에 근무할 때입니다. 서울에서 고속도로로 출퇴근을 하는데, 운전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윤 형은 운전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이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씁니다. 이렇게 1시간 이내로 줄이려다 보니 앞차가 좀 느리게 갈라치면 슬그머니 짜증도 났고요. 그리고 출근시간이 1시간을 넘긴 날은 하루 출발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출퇴근 전쟁을 벌이던 어느 날 출근길에는 남동 인터체인지에서 차들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앞쪽에서 충돌사고가 난 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나들목(인터체인지)에 들어섰으니 차를 돌릴 수도 없고, 차를 들고 사고 지점을 넘어갈 수도 없고... 이때 재윤 형은 창문을 내리고 길가를 바라다봅니다. 글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재윤 형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때 재윤 형의 눈에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이 들어옵니다. 코로는 싱그러운 풀냄새가 들어오고요. “여기에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있었던가?” 평상시에는 1시간 목표를 위한 운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우당 이회영과 범정 장형의 발자취를 따라서》 책을 보면서, 우당과 범정의 독립운동 뿐만 아니라, 범정 선생이 어떻게 단국대를 설립하게 되었는지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국대 설립에 관해서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임시정부는 1945년 11월 29일 광복된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듬해 3월 3일 국민대학 설립기성회를 발족시킵니다. 《백범일지》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문화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던 백범이었으니, 백범이 중심이 된 임시정부도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국민대학 설립기성회를 발족시킨 것이지요. 범정은 이 기성회에 독립운동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사진에 참여합니다. 국민대학은 1946년 9월 1일 개교합니다. 그렇지만 기금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국민대학관(야간)으로 출발합니다. ‘학관’이란 광복 직후 유행했던 학제로 전문학교 수준의 학교라고 하지요. 그나마 기금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이 새로 낸 책 《공정하다는 착각(The Tyranny of Merit)》을 읽어보았다. 책은 미국판 입시부정 이야기로 시작한다. 2019년 3월 연방 검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33명의 부유한 학부모들이 명문대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하여 교묘히 설계된 입시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른바 ‘조국 사태’라 불리우는 입시부정으로 한창 시끄러웠는데, 미국에서도 그와 비슷한 입시부정으로 시끄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평등을 주장해오던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동안 미국이라고 하면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있어 누구나 재능이 이끄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됐지 않은가? 그런 미국도 지금은 대학이라는 간판, 그것도 명문대학이라는 간판이 없으면 성공하기 힘든 나라가 되었나 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단 입시부정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시 스펙을 쌓고 다듬기 위해서, 또 학력을 높이기 위한 사교육비 등으로 고액의 돈이 들어간다. 또한 고급 입시정보나 기회는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우당 이회영과 범정 장형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보면 우당이 고종 망명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다 고종이 갑자기 붕어하는 바람에 실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규설의 신한혁명단에서 1915년 고종 망명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였는데, 우당은 1918년 11월 자신의 아들 이규학이 고종의 조카딸과 신부례를 올리는 것을 기회로 삼아 고종의 망명을 다시 시도합니다. 신부례란 신부가 시집에 와서 처음으로 올리는 예식이라고 하는데, 우당은 신부례를 올리는 것을 기회로 고종과 접촉하여 망명을 타진하려고 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아들 이규학이 이미 3년 전에 고종의 조카딸과 결혼하였지만, 고종 망명을 추진하면서 이때 신부례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고종의 시종 이교영을 통하여 고종에게 망명을 타진하였고, 고종으로부터 흔쾌한 승낙도 받습니다. 당시 고종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되자 이에 고무되어 망명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고종이 이렇게 망명을 결심하자 우당은 홍증식과 함께 고종의 측근인 전 내부대신 민영달을 만나 의사를 타진합니다. 민영달은 황제의 뜻이 그러하다면 자신도 분골쇄신하더라도 황제의 뒤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노회찬 의원의 삶과 정치 철학을 그린 영화 <노회찬6411>이 우리 앞에 옵니다.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상영에 들어가는데, 그에 앞서 5일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저에게도 시사회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시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화 제목의 노회찬 이름 다음에 붙인 숫자 ‘6411’은 무엇인가요? 노회찬 수감번호?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이는 구로구 가로수공원에서 출발하여 강남을 통과하여 개포동 주공2단지까지 가는 시내버스 노선번호입니다. 새벽에 이 버스에는 강남 빌딩 청소 아줌마 등의 노동자들이 주로 탑니다. 노의원이 2012년 진보정의당 당대표 수락연설문에서 6411번 버스의 노동자들을 얘기하였는데, 노의원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숫자라 생각하여 영화 제목을 ‘노회찬6411’이라고 한 것이겠지요. 영화는 노의원이 대학 졸업 후 용접공으로 노동현장에 투신하는 때부터 시작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이니까, 아무래도 노의원의 삶과 정치에 대해 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반가운 인물이 인터뷰하네요. 노의원과 같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