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안승열 명리학도]
행복한 삶은 옛 부터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건강한 신체는 이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모든 간지술이 여기에 착안했고 명리학도 사주 감정의 결과를 같은 목적에 활용하려 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십천간과 십이지지의 조화를 보며 인생의 길흉사를 판단하는 간지술은 주나라 시대부터 있어 왔고,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며 발전한 음양론이나 오행론을 사상적 기초로 하며 인간의 운명을 탐구하는 예언술(점술을 높인 말)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오성술, 구성법, 기학, 육임, 자미두수 등 여러 종류의 예언술이 있었으나, 이들은 감정의 적중률이 저조하여 차츰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된다. 10세기 이후의 동양사회는 군사, 과학, 정치 등 많은 분야의 근거 이론을 명리학에서 구하게 되었다. 명리학의 발전은 9할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선 중국의 명리학, 이어서 우리나라 명리학의 발전을 살펴보겠다.
중국의 명리학
명리학은 당나라의 이허중(9세기 인물로 추정)에 의해 학문적 체계가 세워지기 시작하였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그는 그간 전해져 내려온 옛법(古法)의 명리학을 출생 연월일시에 태월(잉태한 달)을 더한 다섯 기운으로 감정하는 삼명학으로 다듬었다. 또한 후세 사람들이 당사주라고 부르는 점술서를 남겼다. 당사주는 천상에 있다고 설정한 12개의 별과 태어난 년월일시를 관련시켜 인생의 길흉을 예견하는 점술이다. 당사주에서는 사람의 일생을 초년 중년 말년 평생의 4 가지로 나누어 각 시기를 살아가는 길잡이가 되게 하는 등 서민 생활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이어서 음양오행과 오행의 상생상극설에 능통한 북송(AD 960-1127)의 서거이(자는 자평子平이며 강소성 출신으로 활동기는 10세기말 11세기 초로 추정)가 그간의 이론들을 섭렵하고, 삼명학에 나름의 연구를 더하여 “자평 명리= 자평법”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는 천간 지지의 의미와 그들의 상호작용, 점술의 원리 등을 재해석하여, 인생 전반에 걸친 인격과 체질의 운명을 예견하는 등, 명리학을 수준 높은 운명 철학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삼명학의 다섯 기운 대신 년월일시로 주어지는 사주(四柱)와 일간 중심의 독창적인 간명(看命, 운명을 본다는 뜻으로 ‘사주 감정‘과 동일한 뜻으로 쓰임) 체계를 세웠다. 현대의 명리학에 이르기까지 기본이 되는 자평법은 간명의 범위나 내용 그리고 이론의 다양성으로 보아 명리학의 정종(正宗)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남송의 서대승(徐大升)이 자평법에 육신법(일간을 중심으로 사주의 여러 기운들을 다섯 무리로 나누고 이들과 일간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당사자의 재능, 부유함, 인간관계나 사회적 입지 등을 알아보는 이론)을 더한 연해(淵海)를 저술하여 명리학을 더욱 발전시켰는데, 이설(異說)에는 서거이와 서대승이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어서 12세기 후반 주희가 불후의 이론인 하도낙서를 남겼다.
명리학은 명조에 와서 크게 발전한다. 명태조로 하여금 중원을 얻게 하여 성의백의 벼슬까지 받은 백온(伯溫) 유기(劉基 14세기 활동)의 명리서로 적천수(適天髓 마침내 하늘의 뜻에 이르다는 뜻)가 있고, 이의 해설서인 임철조(18~19세기 활동)의 적천수징의가 원서에 버금가는 명저로 꼽힌다. 적천수에 이어 명의 숭정제 때( 1628~1644) 당금지(唐錦池))가 자평법과 연해의 육신법 그리고 여타 명리학의 제반 원리를 종합 편찬(編纂)한 연해자평(淵海子平)을 출판하여 후학들로 하여금 이를 익히게 하였다. 이 책은 후대 명리학 서적의 저술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에도 폭넓게 유포되어 오늘날까지도 명리학의 진수를 담은 최고의 고전으로 꼽힌다.
연해자평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과 2권은 음양오행의 기본 원리, 천간 지지, 신살론과 격국론, 3권은 육친론(六親論)과 소아, 여명(女命), 성정(性情), 질병(疾病) 등이 서술되어 있다. 4권은 신강 신약(身强身弱- 사주의 일주가 왕성하고 강력한 것을 신강 그 반대를 신약이라 하는데 일주의 강약은 일주 자체의 강약은 물론 태어난 달이나 나머지 간지들이 일주를 강화하는지 약화하는지 즉, 일주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신약 신강의 여부가 사주인의 인생사를 크게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과갑(科甲-과거 관리를 뽑을 때 실시했던 시험)과 12개월의 지지와 10천간 조합의 감정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5권은 앞의 내용들을 암송하기 쉽게 7자 4행의 시(詩)로 만들어 실었다. 명리학은 청조에 이르러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이후 대만에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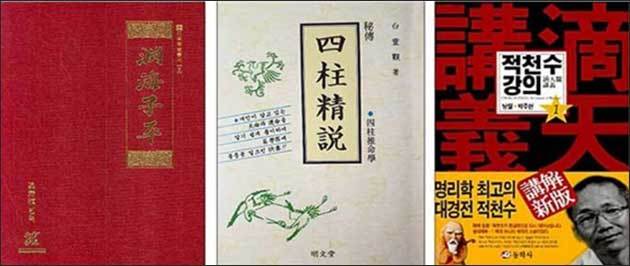
한국의 명리학
우리나라는 송과 교류가 빈번하였던 고려 초, 11세기 중엽에 자평법이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918-1393) 중기부터 태학에서 명리학을 가르쳤고 근세조선에서는 명리학이 성균관의 정규 교육 과목 중 하나가 되었다. 우리 국기에 태극과 음양이 있어 명리학의 학문적 기초인 음양론의 원천이 한국이 아닐까 하는 주장이 있으나 문헌의 근거는 빈약하다. 조선의 명리학은 정치 군사 과학 의학 등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인정되어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명리학자는 관상감에 속하는 중인계급으로 잡과를 통해 관리로 채용되는 등 왕조의 제도권에서 육성되었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과 일제 강점의 과도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가 커다란 문화적 변혁을 맞이하며 조선의 명리학은 실종되는 위기에 처한다. 일제는 한민족의 문화를 말살하고자 자신들에게 필요한 한의학과 민족성의 저급화를 부추기는 점술만 남기고 군사 과학 등에 유용되던 고급 명리학은 그 자취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일제 이후 민족의 주체성을 찾기 시작하면서 묻혔던 명리학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하였는데 1983년 백영관(白靈觀)의 “사주정설“을 근간으로 우리의 명리학이 재정립 되었다. 이후 스님과 역학자들이 주로 대만에서 서적을 유입하고 대학에 명리학과가 설립되는 등 현대 명리학이 부흥하였다.
2000년대 이전의 시기가 간명의 적중률 중시하는 실관((實觀)의 시대라고 한다면, 현재는 이론과 실관이 병존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명리학이 대학으로 들어오며 방법론, 문헌과 명리사, 명리로 예측하는 개인의 성격 유형과 체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밖에도 선천 적성에 따른 진로 추천과 심리 진단 그리고 질병 예측 등의 학문적 성과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명리학의 기본인 음양오행, 십간, 십이지 등을 새로운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명리학이 과정이나 이론이야 어찌되든 간명 결과만 맞추면 된다는 실관 위주의 관점을 벗어나 보다 합리적인 이론체계를 갖춘 동양의 미래 예측학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 다음 연재는 ‘2장 음양 1절 음기 양기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