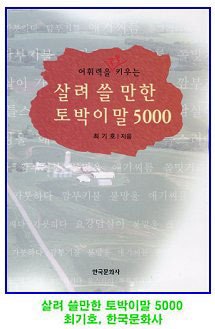 ‘뉘’란 우리 토박이말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누구’의 준말이 ‘뉘’이며, 살아가는 한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뉘누리’의 준말로 소용돌이를 이야기하기도 하며, 자손에게 받는 덕을 말하는데 ‘뉘를 보다’라고 씁니다. 그런가 하면 방아를 찧은 쌀 속에 섞인 겨가 벗겨지지 아니한 벼 알갱이를 뜻하는 말도 됩니다. ‘조선가요집’ 중 시집살이엔 “아가 아가 새아가야 / 밥에 ‘뉘’도 너무 많다 / 밥에 ‘뉘’를 ‘뉘’라 합나’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뉘’란 우리 토박이말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누구’의 준말이 ‘뉘’이며, 살아가는 한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뉘누리’의 준말로 소용돌이를 이야기하기도 하며, 자손에게 받는 덕을 말하는데 ‘뉘를 보다’라고 씁니다. 그런가 하면 방아를 찧은 쌀 속에 섞인 겨가 벗겨지지 아니한 벼 알갱이를 뜻하는 말도 됩니다. ‘조선가요집’ 중 시집살이엔 “아가 아가 새아가야 / 밥에 ‘뉘’도 너무 많다 / 밥에 ‘뉘’를 ‘뉘’라 합나’라는 노래도 있습니다.세상의 사물 중에도 ‘뉘’가 있지만 사람들 속에도 ‘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뉘’를 우리는 잘 가려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검정새치(같은 편인 체하면서 남의 염탐꾼인 사람, 검정머리가 흰 새치인 척한다는 뜻)로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뉘’는 쌀만이 아닌 세상 속에서도 가려내야할 것입니다. 또 혹시 내가 세상의 '뉘‘는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참고 : “살려 쓸 만한 토박이말 5000” / 최기호, 한국문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