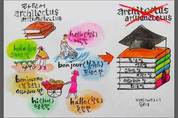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삶의 꽃이 말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은 지난 삼천 년 동안 끊임없이 탈바꿈하며 새로워진 서유럽 문명의 역사가 증명한다. 사람들은 서유럽 문명의 뿌리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 말한다. 이들 두 뿌리는 모두 유프라테스ㆍ티그리스의 쐐기글자 문명과 나일의 그림글자 문명을 아우르며 자랐으나, 저마다 아주 다른 빛깔의 삶으로 꽃을 피웠다. 헬레니즘은 이승을 꿰뚫어 보면서 꽃피운 헬라말(그리스말)의 문명이고, 헤브라이즘은 저승을 꿈꾸면서 꽃피운 히브리말의 문명이다. 저승에 매달린 헤브라이즘은 이승에 매달린 헬레니즘의 현세 문명과 겨루기 어려웠으므로, 겉으로 드러난 서유럽 문명의 뿌리는 헬레니즘으로 보인다. 그런 헬레니즘은 소리글자를 앞장서 가다듬어 기원전 8세기부터는 헬라말을 글말로 적으며 서유럽 문명의 뿌리로 자리 잡았고, 기원전 4세기까지 더욱 쉬운 소리글자에 헬라말을 담아 놀라운 삶의 꽃으로 지중해 문명을 이끌었다. 그런 서유럽 문명의 중심이 기원 어름에 헬라말에서 라틴말로 옮겨 갔다. 그러면서 소리글자도 ‘로마자’라는 이름을 얻을 만큼 더욱 쉽게 가다듬어지고 라틴말을 글말로 담아내면서 라틴 문명을 일으킨 것이다. 게다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우리 겨레가 한문을 끌어다 쓰면서 우리를 잃어버리고 중국을 우러르며 굴러떨어진 역사를 ‘중세 보편주의’에 어우러진 문명의 전환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중국의 한문 문화에 싸잡혀 들어간 것이 중세 동아시아 보편주의에 어우러진 발전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문은 그런 중세 보편주의를 이루어 내게 해 준 고마운 도구였다고 한다. 이런 소리는 이른바 중화주의자들이 셈판을 두들겨 꿍꿍이속을 감추고 만들어 낸 소리인데, 우리나라 지식인들까지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중세 보편주의’란 서유럽 역사에서 끌어온 말이다. 이 말은 르네상스 이전에 모든 유럽 사람이 라틴말을 쓰면서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던 시절[중세], 가톨릭[보편]교회의 가르침[주의]을 뜻하는 말이다. 라틴말이 유럽에 두루 쓰인 것과 한문이 동아시아에 두루 쓰인 것이 닮았다고 섣불리 ‘중세 보편주의’를 끌어다 붙였겠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소리다. 우선 동아시아에는 고대를 받아서 근대로 넘겨주는 ‘중세’란 것이 없었다. 왜냐하면 기원전에 만들어진 정치ㆍ사회 체제가 19세기 말까지 거의 그대로 되풀이되었을 뿐 아니라, 한문의 위세 또한 19세기 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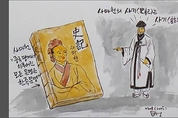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한문을 끌어들이지 않았던 시절, 우리 겨레는 땅덩이 위에서도 손꼽힐 만큼 앞선 문화를 일으키며 살았다. 비록 글자가 온전하지 못하여 경험을 쌓고 가르치는 일이 엉성했을지라도, 입말로 위아래 막힘없이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세상을 일구어 이웃한 중국과 일본을 도우며 살았다. 이런 사실이 모두 우리나라 고고학의 발전에 발맞추어 알려진 터라 기껏 지난 삼사십 년 사이에 밝혀졌다. 이제까지 밝혀진 사실로만 보아도, 우리 겨레는 구석기 시대에 이미 대동강 언저리(검은모루, 60만 년 전)와 한탄강 언저리(전곡리, 26~7만 년 전)와 금강 언저리(석장리, 4~5만 년 전)에서 앞선 문화를 일구며 살았다. 무엇보다도 구석기 말엽인 일만 삼천 년 전에 세상에서 맨 처음으로 벼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충북 청원군 소로리에서 드러났다. 그것은 이제까지 세상에서 맨 먼저 벼농사를 지었다고 알려진 중국 양자강 언저리의 그것보다 삼천 년이나 앞서는 것이다. 게다가 청원군 두루봉 동굴에서는 죽은 사람에게 꽃을 바치며 장례를 치른 신앙생활의 자취까지 드러나, 구석기 시대에 이미 높은 문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실도 밝혀졌다.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우리 겨레의 삶을 구렁으로 몰아넣은 옹이는 바로 중국 글말인 한문이었다. 기원 어름 고구려의 상류층에서 한문을 끌어들였고, 그것은 저절로 백제와 신라의 상류층으로 퍼져 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말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말에 맞추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였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중국 글자(한자)를 우리말에 맞추는 일에 힘을 쏟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한문을 그냥 받아들여 쓰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한자로 우리말을 적으려는 일은 적어도 5세기에 비롯하여 7세기 후반에는 웬만큼 이루어졌으니, 삼백 년 세월에 걸쳐 씨름한 셈이었다. 한문을 바로 끌어다 쓰는 일은 이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져, 고구려에서는 초창기에 이미 일백 권에 이르는 역사책 《유기》를 펴냈고, 백제에서는 4세기 후반에 고흥이 《서기》를 펴냈으며, 신라에서는 6세기 중엽에 거칠부가 《국사》를 펴냈다. 상류층이 이처럼 한문에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 겨레 동아리에는 갈수록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배워서 익힐 시간을 가진 상류층 사람들은 한문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새로운 길로 내달았으며, 배워서 익힐 시간을 갖지 못한 백성들은 언

[우리문화신문=김수업 전 우리말대학원장] 고 김수업 선생은 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을 지냈으며, 우리말대학원장과 국어심의위원장을 지낸 분이다. 특히 선생은 토박이말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쉬운 말글생활을 위해 온 정성을 쏟았다. 그런 선생은 토박이말사전을 만들다가 지난 2018년 우리 곁을 떠났다. 선생이 생전에 펴낸 책 《우리말은 서럽다》는 우리가 왜 쉬운 토박이말을 써야 하는지 명쾌하게 말해주고 있다. 우리 신문은 지난 2014년 《우리말은 서럽다》 본문을 연재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건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토박이말을 더욱 홀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시 선생의 《우리말은 서럽다》를 끄집어내 토박이말을 써야하는 까닭을 또렷이 해두고자 한다. <편집자 말> 사람에게 가장 몹쓸 병은 제가 스스로 업신여기는 병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했다지만, 제가 스스로 업신여기는 병보다 더 무서운 절망은 없으며, 이는 스스로 손쓸 수 없는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겨레는 지난 이즈믄(천) 년 세월에 걸쳐, 글 읽는 사람들이 앞장서 스스로 업신여기는 병에 갈수록 깊이 빠져 살았다. 그런 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