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조용한 날들 2 - 한강 비가 들이치기 전에 베란다 창을 닫으러 갔다 (건드리지 말아요) 움직이려고 몸을 껍데기에서 꺼내며 달팽이가 말했다 반투명하고 끈끈한 얼룩을 남기며 조금 나아갔다 조금 나아가려고 물컹한 몸을 껍데기에서 조금 나아가려고 꺼내 예리한 알루미늄 세시 사이를 찌르지 말아요 짓이기지 말아요 1초 안에 으스러뜨리지 말아요 (하지만 상관없어, 내가 찌르든 부숴뜨리든) 그렇게 조금 더 나아갔다 24절기 가운데 동지, 이날 우리 겨레의 가장 흔한 풍속으로는 팥죽을 쑤어 먹는 일이다. 팥죽에는 찹쌀로 새알 모양의 단자(團子) 곧 ‘새알심’을 만들어 죽에 넣어서 끓여 만드는데, 식구의 나이 수대로 넣어 끓이는 풍습도 있다. 원래 팥죽은 붉은색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뜻이 들어있다. 동짓날 팥죽을 쑨 유래는 중국 형초(荊楚, 지금의 후베이ㆍ후난 지방)의 세시풍속을 기록한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나온다. ‘공공씨’의 망나니 아들이 동짓날 죽어서 전염병귀신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평상시에 팥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염병귀신을 쫓으려 동짓날 팥죽을 쑤어 악귀를 쫓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겨레는 단순히 귀신만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옛 마을을 지나며 - 김남주 찬서리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여 우리 겨레는 ‘더불어 살기’가 삶의 철학이었다. 아이들이 풍물을 치고 다니면 어른들이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부대에 담아주고, 그렇게 걷은 곡식은 노인들만 있거나 환자가 있는 것은 물론 가난하여 명절이 돼도 떡을 해 먹을 수 없는 집을 골라 담 너머로 몰래 던져주었다. 이 ‘담치기’는 이웃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해 액운이 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풍습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무도 몰래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해야 그해 액이 끼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입춘의 ‘적선공덕행’, 밭뙈기 하나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십시일반으로 곡식을 내어 마을 어른들을 위한 잔치를 했던 입동의 ‘치계미’, 겨울철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할 짐승들에게 나눠 주려고 ‘고수레’를 외치며 팥죽을 뿌렸던 것들은 함께 우리 겨레에게 이어져 오던 아름다운 풍속이었다. 그에 더하여 시골에 가면 감나무에 감을 다 따지 않고 몇 개 남겨둔다. 그것은 까치 같은 날짐승의 겨울나기를 위해 보시하는 것이다. 여기 김남주 시인은 그의 시 <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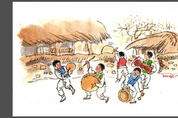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나무 1 – 지리산에서 - 신경림 (앞 줄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웃자란 나무는 이웃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동무 나무가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을 훼방한다는 것을 그래서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이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만 ‘홍익인간(弘益人間)’은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국가 이념이자 교육이념으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뜻이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따르면 홍익인간은 환인이 환웅을 인간세상에 내려보내면서 제시한 지침이었다고 한다. 또 《제왕운기》 전조선기에 따르면 환인이 환웅에게 삼위태백으로 내려가서 홍익인간 할 수 있는지 그 의지를 물었고, 그런 지시에 응하여 환웅이 지상으로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 겨레가 오랫동안 이어온 풍습을 보면 그 홍익인간을 충실히 따르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 예를 들면 24절기를 시작하는 ‘입춘’에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꼭 해야 일 년 내내 액(厄)을 면한다는 ‘적선공덕행’이란 풍속이 있다. 또 섣달그믐에는 아이들이 풍물을 치고 다니면 어른들이 쌀이나 보리 같은 곡식을 부대에 담아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 복효근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배 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멘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 주었다 아무도 없는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다섯 마리 내 열여섯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 다섯 마리의 붕어빵, 가장 따뜻했던 저녁을 만들어줬다. (출처, 크라우드픽) 우리 겨레는 더불어 사는 일에 익숙했다. 전해오는 얘기로는 예부터 가난한 사람이 양식이 떨어지면 새벽에 부잣집 문 앞을 말끔히 쓸었다. 그러면 그 집 안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인에게 “뉘 집 빗질 자국인가?”하고 물었다. 그런 다음 말없이 양식으로 쓸 쌀이나 보리를 보내줬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보릿고개에 양식이 떨어진 집의 아낙들은 산나물을 뜯어다가 잘 사는 집의 마당에 무작정 부려놓았다. 그러면 그 부잣집 안주인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곡식이나 소금ㆍ된장 따위를 이들에게 주었다. 물론 부잣집에서 마당을 쓸라고 한 적도 없고, 산나물을 캐오라고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당신은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까?” 일취 스님이 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진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일취 스님은 ‘청정심원’ 선원장으로 태고종 스님이다. 스님은 《해동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한국불교사진협회 특별 자문위원이고 또한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다. 그렇게 바쁘게(?) 활동하는 스님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아서》라는 책을 썼다니 혹시 책 한 권을 내는데 만족해서 쓴 건 아닐까 하는 우둔한 생각이 잠시 들었다. 그동안 일부 스님들의 책을 접하면서 내용이 어렵거나 너무 현학적인 경우가 있어서 몇 장을 넘기다 그냥 덮어버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런 기우는 금세 말끔히 사라져 버렸다. 스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방법론에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하겠다. 그래서 대다수의 판단을 토대로 하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주장을 배제한 다수의 합리적 관점을 모아 판단하는 방식으로 보편타당한 삶을 전제로 한, ‘보편타당성’과 ‘대아(大我), 소아(小我)에 대한 의미를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