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 = 이윤옥 기자] 나는 경술국치에 불평과 불만을 품고 의열단에 가입한 후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소. 나는 우리 민족에게 각성을 주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살았으므로 사형도 좋소이다. ―선생의 법정 최후 진술 중에서(1923. 8) ―
남정각 (1897~1967) 선생은 1897년 12월 22일 경기도 용인(龍仁)에서 출생하였다. 선생의 호는 오산(午山)이고, 이명(異名)으로는 남영득(南永得), 남영득(南寧得) 등이 있다.
선생은 1913년 16세까지 향리에서 한학을 수학하였고, 이후 상경하여 조선기독교청년회 부설 학관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익히며 민족의식을 배양하여 갔다.
그러던 중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선생은 수원(水原)에서 만세 시위운동에 참가하였고, 이어 독립신문을 등사하여 용인, 수원, 안성(安城) 등지에 배포하여 자주 독립사상을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지역에서의 격렬한 만세 시위운동을 촉발하였는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전국적이며 거족적인 3.1운동에도 선생이 그렇게 바라던 조국 광복은 성취되지 못하였다. 이에 선생은 1919년 8월 중국으로 망명하여 신학문을 수학하면서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모색하여 갔다. 선생은 중국 장춘(長春), 상해(上海), 천진(天津)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독립운동자들을 만나 향후 독립운동 방향을 경청하고 논의하였다. 이 시기 선생은 한 살 아래의 김원봉(金元鳳)을 장춘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그와 독립운동 방략을 숙의하면서 서로 동지가 되었다.
그 후 선생은 1921년 겨울 북경에서 다시 김원봉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때 그는 이미 의열단(義烈團)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김원봉은 3.1운동의 대중화 단계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 만세시위를 전개한 민중들을 보고 크게 감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의열투쟁 단체를 조직하여 암살, 파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내 동포들의 독립정신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민중의 힘을 바탕으로 민족해방과 조국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같은 구상 아래 김원봉은 1919년 11월 윤세주, 이성우(李成宇), 곽경(郭敬, 郭在驥), 이종암(李鍾岩), 강세우(姜世宇), 한봉근(韓鳳根), 한봉인(韓鳳仁), 김상윤(金相潤), 신철휴(申喆休), 배동선(裵東宣), 서상락(徐相洛) 등의 동지들과 길림성(吉林省)에서 의열단을 발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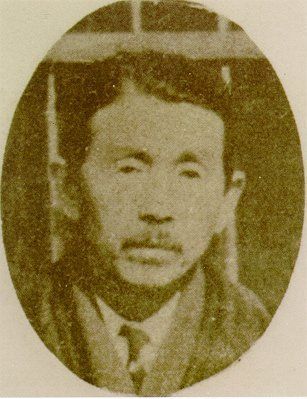 |
||
1920년 3월부터 의열단은 곽재기, 이성우, 신철휴, 윤세주 등의 핵심 단원들을 행동대원으로 국내에 잠입시켰고, 이어 상해에서 폭탄과 권총을 구입한 뒤 이를 소포와 화물편으로 국내에 운반하였다. 그리하여 경남 밀양(密陽)에 있던 김병환의 집에 숨겨 놓고 적시에 일제 식민통치의 최고 기관인 조선총독부, 악랄한 식민수탈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 식민통치 선전 및 홍보기관인 경성일보사 등 세 곳을 습격하여 폭파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지막 실행단계에서 비밀이 누설되어 같은 해 6월 16일 곽재기, 이성우, 신철휴, 윤세주 등이 서울 인사동에서 피체되고, 이어 모두 26명의 관련자가 피검됨으로써 의열단이 계획한 최초의 대규모 암살, 파괴 활동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의열단은 그 해 9월 14일 박재혁(朴載赫)을 파견하여 부산경찰서를 폭파하였고, 또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최수봉(崔壽鳳)으로 하여금 밀양경찰서를 폭파하게 하는 등 연쇄적으로 일제 식민통치기관을 공격하였다.
다음해에는 더욱 대담하게 김익상(金益相)을 국내에 파견하여 일제 식민통치의 심장부인 조선총독부를 폭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김익상은 1921년 9월 12일 전기수리공을 가장하고 총독부에 들어가 폭탄을 던져 청사 일부를 파괴하는 쾌거를 이루고 북경으로 무사히 귀환하였다. 이와 같이 의열단원들이 목숨을 던져 일제기관을 폭파해 나가자 일제는 의열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 전율하게끔 되었다.
여 1922년 6월 선생은 천진 프랑스 조계(租界)에 소재한 화잔여관(和棧旅館)에서 김원봉과 최용덕(崔用德)을 만나 그들로부터 김한의 거사 의지를 타진해 보도록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선생은 그 달 그믐 국내에 잠입하여 서울 수창동(需昌洞)에서 김한을 만나 의열단의 대규모 암살, 파괴 계획을 설명하고, 동참을 부탁하였다.
김한은 거사 계획에 적극 찬성하면서 폭탄을 중국 안동(安東)까지만 운반해 주면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 국내로 반입한 뒤, 조선총독부, 조선은행, 경성전기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투척하겠다고 하였다. 이같은 김한의 거사 의지를 확인한 선생은 즉시 귀환하여 상해 영국 조계에 소재한 신려사(新旅社)에서 김원봉과 최용덕을 다시 만나 김한의 의중을 전달하였다. 이에 김원봉은 선생에게 거사 자금으로 2천원을 주면서 김한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다.
1922년 8월 선생은 재차 국내로 잠입하여 김한을 만나 거사 자금을 전달하는 한편, 구체적인 폭탄 반입 및 투탄 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때 선생은 상해로부터 폭탄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중계 거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중국 안동으로 건너가 약종상을 가장하고 중계 거점을 마련하겠다고 자청하였다. 하지만 선생은 중국 안동에서 적당한 중계 거점을 확보할 수 없었다. 때문에 선생은 즉시 귀국하여 김한에게 그 동안의 경과를 통보한 뒤, 천진을 거쳐 다시 상해로 가서 김원봉과 폭탄 전달 문제를 협의하면서 때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그 해 10월 20일 김원봉은 선생을 찾아와 폭탄을 전달할 준비가 끝났다고 하면서 국내로 들어가 직접 폭탄을 투척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선생은 흔쾌히 승낙하면서 결행 의지를 밝히고, 김원봉으로부터 폭탄 투척방법을 배워 여러 차례 연습까지 마쳤다. 그런 다음 선생은 같은 해 12월 28일 동지 이현준(李賢俊)과 같이 서울에 도착하여 운니동(雲泥洞) 박완명(朴完明)의 집에 머물면서 폭탄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바로 그 때 의열단 동지인 김상옥(金相玉) 의거가 발생하였다. 김상옥은 1923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를 폭파한 뒤 10여 일 동안 신출귀몰하게 총격전을 전개하면서 일경 수명을 사살하는 성과를 거두고, 자신 또한 마지막 남은 한 발의 총탄으로 장렬하게 자결하였다. 이 의거로 일경의 감시와 경계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폭탄 운송이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암살, 파괴 책임자로 활동하던 김한마저 이 의거에 연루되어 피체되고 말았다. 따라서 선생은 김원봉을 만나 폭탄 운송 문제와 향후 대처방안을 상의하기로 결심하고, 그 해 2월 1일 일경의 포위망을 뚫고 서울을 빠져 나와 북경을 거쳐 천진에 도착하였다.
여기에서 김원봉을 만난 선생은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는 김한이 피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대규모 암살, 파괴 작전이 계속 추진 중이며, 그것은 김시현(金始顯)과 유석현(劉錫鉉)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운동자금이 부족하여 동지들이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듣고 2월 14일 서울로 돌아온 선생은 폭탄 도착을 기다리면서 거사 준비에 한층 박차를 가하였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동지들과 함께 거사 자금의 자체 조달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선생은 을지로 부근 정목여관(正木旅館)에서 동지 권동산(權東山), 권정필(權正弼), 유병하(柳秉夏), 유시태(柳時泰) 등과 협의하여 내자동(內資洞)에 살던 부호 이인희(李麟熙)로부터 거사 자금을 거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생은 유시태와 함께 2월 21일과 24일 이인희를 방문하여 거사 자금을 요구하였으나 이인희가 지금은 음력 정월이라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 몇 일간 미루어 줄 것을 간청하므로 허락하였다. 그 뒤 선생은 약속한 날 이인희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의 밀고로 잠복하고 있던 일경에게 3월 3일 잡히고 말았다.
그리고 의열단이 비밀리에 추진했던 국내에서의 대규모 암살, 파괴 작전도 밀정의 밀고로 발각되어 그 해 3월 15일 김시현, 유석현 등 주동자들이 일제히 피체됨에 따라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 일경에 압수된 거사 물품만도 건물 파괴용 폭탄 6개, 방화용 폭탄 17개, 암살용 폭탄 13개 등 폭탄 36개, 권총 5정과 실탄 155발, 신채호(申采浩) 선생이 집필한 의열단 선언문인 조선혁명선언 361부, 조선총독부 소속 관공리에게라는 협박문 548매 등이었다. 이를 보아도 의열단의 거사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 규모였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그 후 선생은 김시현, 유석현 등 의열단 동지들과 같이 1923년 8월 7일부터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때에도선생은 조금도 굽힘없이, 나는 의열단원이오. 나는 경술국치에 불평과 불만을 품고 의열단에 가입한 후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쳤소. 나는 우리 민족에게 각성을 주기 위하여 오늘날까지 살았으므로 사형도 좋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여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선생의 죽음을 뛰어넘는 이같은 조국광복에 대한 충정이야말로 의열단 정신의 실현이요, 민족구원을 위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였다.
선생은 1923년 8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 뒤 1929년 출옥하자 선생은 다시 중국 천진으로 망명하여 비밀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천진교민회(天津僑民會)를 조직하여 이주 한인동포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 힘쓰다가 8.15 광복을 맞이하였다. 이 때에도 선생은 중국 천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동포들의 귀국 배편을 마련하고, 또 일본인 침략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동포들의 여비와 이사 비용에 충당하는 등 한인 동포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진력하였다.
귀국 후 선생은 1946년 500여 명의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고려지회(高麗同志會)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을 기리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자료: 국가보훈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