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선흥 작가] 동경 주재 영국 엘리트 외교관 사토우(Satow)가 고베 주재 동료 외교관 스톤(Aston)에게 보낸 1881년 8월 23일 자 편지다.
“이동인이 나가사키에 도착했다는 정보가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는 정말로 미로운 인물이니까요. 만일 목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자기 나라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길 겁니다. (I hope the information that Tong-in has arrived at Nagasaki may prove to be correct, for he is really a very interesting man and if he can keep his head on his shoulders, pretty sure to make his mark in the history of his country.)”
사토우는 다음 해인 1882년 6월 12일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김옥균, 서광범 그리고 탁정식과 저녁식사를 하다. 그들은 매우 서글서글하고 입담이 좋다. 내가 아는 어떤 일본인보다도 훨씬 더 개방적이다. 이태리 피에몬트(Piedmont)인과 피렌체 사람이 대조적이듯이 그런 인상을 준다. 식사 뒤에 (….)파티가 열렸다.”
1880년대 초 조선의 김옥균, 서광범, 탁정식 등이 어떤 일본인보다 쾌활하고 개방적이라는 사토우( Satow)의 관찰이 인상적이다. 김옥균, 서광범 등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목숨을 지킬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제 나라 역사에 족적을 남길’ 것이라는 이동인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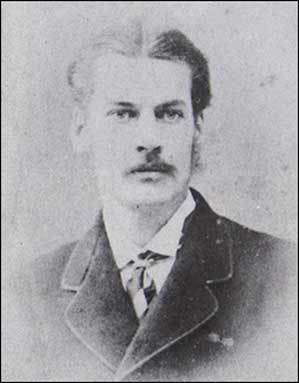
내가 이동인을 맨 처음 만난 것은 절판된 지 오래된 헌책을 통해서였다. 미국에서 친지를 통해 입수한 《KOREA’S 1884 INIDENT》I(1972, Harold F. CooK). 이 책의 주인공은 김옥균인데 이동인이 잠깐 언급된다.
“어느 시점에서 김옥균의 사고가 중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는지는 확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마도 양 어머니상을 치르느라 공직에서 벗어나 있던 1877년~1878년 사이였을 것이다. 그림자 같으나 매력적인 승려 이동인을 맨 처음 만난 것도 이때였다. 그들이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유대치의 소개를 통해서였을 수 있다. 어떻든 김옥균의 개화사상이 중국이 아니라 일본을 향하기 시작한 것은 이동인을 만나면서부터였다.
김옥균은 이동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둘이 열흘 동안 같이 지내면서 매우 친해졌다고 한다. 조선에서 불교 승려는 하층 계급에 속했고 양반들은 일반적으로 승려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옥균은 이동인을 존대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이동인은 김옥균을 몹시 좋아했고….
한편, 서재필에 따르면, 어느 해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봄날 김옥균을 따라 몇몇 젊은 양반들과 함께 어떤 절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동인을 만났다 한다. 이동인은 방문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관찰기계(viewing machine, 환등기나 영사기?)를 통해 세계의 도시, 군인 등속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였다. 이동인은 또한 세계 역사책 한 권을 소개했는데 김옥균 등은 그 책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이름과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김옥균은 이동인에게 그 책을 한 권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동인은 좋다고 하면서 단지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다. 옥균은 이동인에게 돈을 주면서 구해 달라고 했다.
이동인은 약속을 지켰다. 김옥균과 그의 친구들이 뒤에 다시 이동인의 절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동인으로부터 여러 서책과 그림, 성냥 등등을 받았다. 이때 성냥이라는 물건을 처음 본 것이었고 모두 귀신의 장난이라고 여겼다.
이동인이 전해준 책은 역사, 지리, 물리학, 화학 등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일본어로 쓰여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자 실력이 있어서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당시 그런 책들은 금서였기 때문에 몹시 조심해야 했다. 그래서 장소를 바꾸어 가며 책을 읽었고 1년 남짓 걸쳐 완독했다. 김옥균 등은 이러한 경로를 통해 책 속의 나라들을 본보기 삼아 한국을 개화시키는 문제를 숙고하기 시작했다.
이동인은 흥미로운 인물이다. 별도의 논고로 다루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에선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1881년 초의 일본의 신문을 인용하는 것으로 그친다.
이동인, 작년 9월에 여기 왔던 그가 귀국했다. 그는 상투를 잘랐고 양복을 입었다. 일본어가 유창한 그는 자국 민중을 깨우치고 싶어한다…..작년 9월 이후 일본에서 지내온 그는 조선 개화의 선봉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12월 17일 치토세마루(Chitose Maru)호로 부산에 도착하여 육로로 서울로 떠났다. 몸에는 양복을 걸치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시계를 찼고 머리는 유럽풍으로 빗어 올렸는데…... 이동인은 동경의 일본말을 일본인처럼 구사한다. 아무도 그를 한국인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그는 높은 지성과 고매한 정신을 지닌 사람이다(man of high intelligence and elevated mind) 이동인은 1881년 4월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죽음은 오늘날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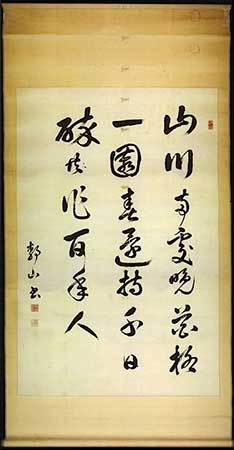
미국인 학자가 전해주는 이동인 이야기는 호기심을 자극한다. 조선 말기 문호 개방 초기에 김옥균 등 개화파들에게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가 알려지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일까?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졌고 따라서 관련자료가 매우 희소했기 때문이겠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다. 이동인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영국의 국가 기록원(British National Archives)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토우(Sir Ernest Mason Satow, 1843 – 1929)라는 학자 외교관의 일기와 편지가 그것이다. 사토우의 유언에 따라 기록원으로 이관된 자료는 ‘사토문서(Satow Papers)’라는 이름으로 23통의 박스 속에 봉인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흐른 뒤 연구자들이 사토우 자료에 주목하였고 영국 정부의 허가로 마이크로필름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편찬하여 책으로 펴냈다. 그 속에 이동인이 살아 있었다. 그는 그렇게 부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