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창수 기자]
국민이 나라의 임자(주인)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임자(주인)를 위해 일하는 나라일터(국가기관)의 이름과 그들이 쓰는 갈말(용어)은 임자(주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되어 있습니까? 슬프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행정부(대통령, 정부 각 부처)의 이름부터 '법률(法律)', '예산(豫算)', '정책(政策)'과 같은 고갱이 갈말(핵심 용어)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꾸리는 바탕(국가 운영의 근간)이 온통 어려운 한자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뭇사람(일반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담과 같으며, 국정을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일(그들만의 리그)'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영어까지 마구 들여와 쓰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청와대의 'AI수석' 같은 이름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듯 보이지만, 참일(사실)은 국민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또 다른 말담(언어 장벽)입니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 로드맵을 공표할 예정"과 같은 말을 버젓이 쓰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빼앗는 것입니다.
![[정부 조직도]](http://www.koya-culture.com/data/photos/20250834/art_17554864979517_dff1c7.jpg?iqs=0.7873390091701006)
더욱 심각한 것은 공무원을 뽑는 방식입니다. 영어 시험 성적은 떨어질지 붙을지에 중요한 잣대가 되지만, 정작 국민을 위해 정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할 '쉽고 바른 우리말 능력'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보다 외국과의 소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의 심각성: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세 가지 걸림돌
이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권력의 언어'는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세 가지 걸림돌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걸림돌: 어려운 행정·법률 용어는 국민의 정치 참여와 정책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내 삶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글문화연대의 2023년 '법률 용어 국민 인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72.9%)이 법률 용어가 어렵다고 답한 것은, 언어가 어떻게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되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정보 격차 깊어짐: 영어와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고령층, 저학력층, 이주민 등)은 정책과 아랑곳한 정보에서 멀어져 정보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불평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14조가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쓰도록 한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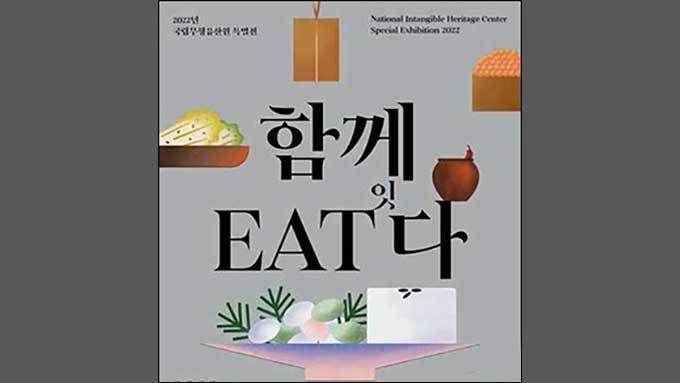
행정의 효율성 떨어짐: 알면서도 쓰고 모르고도 쓰는 '공문서체'는 부처 사이의 소통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는 왠지 짓눌리는 느낌과 내 삶과 아주 먼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소통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끝내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풀수(해법): 권력의 언어를 국민의 언어로
나라가 앞장서 공공언어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보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아이슬란드어 위원회'를 통해 컴퓨터를 '퇼바(Tölva)'라는 아름다운 말로 만들어냈고, 프랑스는 '투봉법'으로 공공장소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저 가르치고 깨우치는 '계몽'을 넘어, 바로 고치고 바꾸는 '변화'를 이끄는 움직임에 나서야 합니다.
1. '공공언어 개선 위원회'를 만들고 권한을 세게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언어학자, 법률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고, 정부 부처에서 쓰는 말을 심의하여 바로잡는 것을 '권고'가 아닌 '명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법령이나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어겼을 때는 기관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등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쉬운 공공언어 사용법'을 만들고 고쳐야 합니다. 현행 국어기본법의 선언적 조항을 넘어, 공공기관의 외국어ㆍ한자어 쓰기의 길잡이를 만들고 강제성을 주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률 제정 운동'을 벌여 민법의 '선량한 풍속', '해태(懈怠)'와 같은 일본식 표현부터 우리말로 바꾸는 일을 시작하고, 모든 법률안에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간추린 '국민용 요약본' 을 반드시 덧붙이도록 고쳐야 합니다.
3. 공무원 선발 및 교육 짜임을 바꿔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과목은 자격시험(P/F)으로 바꾸고, 그 대신 토박이말을 바탕으로 한 '쉬운 공공문서 만들기 및 의사소통 능력 평가'를 새로운 과목으로 넣어야 합니다. 또한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토박이말 바탕의 '국민 눈높이 글쓰기/말하기' 교육을 승진과 연계하여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공직 사회 언어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4. 이름에 일을 담아 '알기 쉬운 부처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나라 일을 맡아 하는 정부 부처의 이름부터가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은 이름은 한자를 알아도 무슨 일을 하는지 한 번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새로운 풀수(해법)로, 부처의 공식 이름 앞에 그 부처가 하는 일을 쉬운 토박이말로 간추려 꾸밈말로 붙여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나라살림 기획재정부
갈배움 교육부
나라지킴 국방부
날씨챙김 기상청
이렇게 부처에서 하는 일이 이름에 드러나면, 국민 누구나 부처 이름만 듣고도 그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과 국민의 정책 접근성을 아주 빠르게 높일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꾸밈말 쓰기가 널리퍼지면, 먼 미래에는 자연스럽게 '나라살림부', '갈배움부', '날씨청' 과 같이 오롯한 우리말 이름으로 나아가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 일을 맡은 정부에서 쓰는 말은 나라의 임자인 국민을 섬기는 말이어야 합니다. 권위적이고 어려운 말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참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나라 찾은 날 여든 돌'을 지내며, 권력의 언어를 국민의 언어로 되돌리는 '공공 언어의 빛찾음(광복)'을 이루자고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