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이 책은 조선시대 위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직장인’이었다는 색다른 시각에서 출발한다. '조선'이라는 회사의 CEO인 왕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해야 했던 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직장인으로서 배울 점과 자세, 직장 생활의 팁을 제시한다. 중간관리자로서 소통 전문가였던 황희 정승, 겸손함으로 청백리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스스로 평판을 끌어올린 맹사성, 멈추지 않는 자기 계발을 통해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한 이황 등의 이야기는 다른 역사책에서는 볼 수 없던 직장인으로서의 위인들을 만나는 기쁨을 준다. 누구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예상치 못한 위기에 빠지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급기야 퇴사를 꿈꾸기도 한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조선시대 직장인 선배들이 들려주는 조언에 귀 기울여 보라고 권하고 싶다. <조선직장인 열전>, 신동욱, 국민출판, 2919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일제강점기 조선땅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학대한 글을 읽다가 한마디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건이 있어 이번 주 일본이야기 소재로 삼아본다. 때는 1927년 6월 26일, 강원도 철원읍 중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6월이면 검붉은 오디(뽕)가 한참 맛있는 계절인데 8살짜리 오순덕과 동무는 오디 밭 옆을 지나다 탐스런 오디를 보고는 그만 먹고싶은 마음에 오디 몇 개를 따먹었다. 문제는 이 오디 밭주인이 일본인이었던 것이다. 운 나쁘게도 마침 그 시각 오디밭주인 후지사와(藤澤暢太郞)는 오디밭 쪽으로 걸어가다가 순덕과 그 친구를 발견했다. 놀란 아이들이 도망치자 후지사와는 쫓아가 순덕을 잡아서 넓적다리 살을 도려내는 악행을 저질렀다. 철없는 아이가 오디 몇 개 따먹었다고 살을 도려낸 이 극악한 사건이 바로 ‘철원사형사건(鐵原私刑事件)’이다. 살점이 떨어져 나간 순덕이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오자 부모는 기겁하여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다. 그러자 철원경찰서에서 순사 2명과 협성의원 의사가 순덕이네 집으로 와서 상처를 조사했다. 결론은 후지사와가 나뭇가지 치는 전정가위로 순덕의 살점을 베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재는 게 편’이라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3월은 시작을 알리는 달이다. 학교는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고,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 논밭을 갈아야 하는 때다. ‘빼앗긴 들녘에 봄이 오기’를 기다렸던 일제강점기, 국권을 탈환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독립운동가에게도 3월은 비슷한 의미였을 것이다. 1919년 3월 1일 뿌려진 독립의 씨앗은 1945년 8월 15일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의인의 희생을 양분으로 자랐다. 민족대표 48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수원과 이천, 충남지역의 독립운동 조직 활동을 주도하며, 수원지역 교육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김세환(金世煥, 18889~1945)이 3·1운동 101주년을 맞는 2020년 3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뽑혔다.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라 수원을 기반으로 독립운동과 민족운동 및 교육에 헌신한 그의 발자취를 조명해본다. 수원의 민족정신 지킨 수원 토박이 김세환 김세환은 1888년 11월 18일 수원시 남수동 242번지에서 태어났다. 그의 소년기는 수원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변화의 시점이었다. 1901년 성안 보시동에 감리교회(북수동 수원 종로교회)가 들어왔는데, 소년 김세환은 집에서 가까운 이 교회를 출입하며 교회를 통해 기독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일제강점기 우리 겨레의 위대한 역사를 되찾아 낸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 순국 84주기 추모식’이 오는 21일(금) 오전 11시, 청주시 상당구 단재 묘소에서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회장 유인태)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은 장숙남 충북남부보훈지청장을 비롯한 각계인사, 독립운동 관련 단체 대표와 회원, 유족,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재 선생 약력보고, 헌사 및 추모사, 추모공연,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 주요 공적 내용 신채호 선생(1880. 12. 8.∼1936. 2. 21.)은 충청도 회덕현 산내면 어남리(現 대전 중구 어남동)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 유교학문 수양에 힘썼으나, 1898년 성균관에 입학한 후 개화사상을 접하고 ‘독립협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05년 4월에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나 바로 사직하였다. 그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황성신문》에 논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양기탁의 요청으로 《대한매일신보》의 주필로 활약하며 일제의 침략과 친일파의 매국행위를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언어와 문자는 인간의 삶과 이상과 철학을 가장 잘 담아낸 문화 그 자체다. 문자가 만들어진 뜻과 그 과정을 알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신간 《漢字 創造의 뜻》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비교적 쉽게 풀이한 책이다. 한자는 ‘뜻글자’로 하나의 모양에 하나 또는 여럿의 뜻을 품고 있다. 처음에는 모양을 본떠 그림으로 단순화하여 뜻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상형문자(象形文字)라고한다. 그렇다면 형체가 없는 추상명사나 형용사는 어떻게 나타내었을까? 저자는 그 해답을 ‘사람’에 두고 있다고 해석한다. 예를 들어 ‘안쪽’을 나타낸 내(內)자와 ‘바깥’을 나타내는 외(外)자를 보면 사람이 안과 밖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를 지사문자(指事文字)로 볼 수 있지만 해석하는 틀이 다르다. 이 밖에도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인 형성(形聲), 회의(會意), 전주(轉注), 가차(假借) 등을 다루고 있지만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이다. 《漢字 創造의 뜻》을 쓴 저자(오문규 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생을 산 분이지만 최소한 한자와 고전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것을 누가 질문하여도 막힘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도서관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고여 있는 연못이다. 불멸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24p.) - <도서관의 삶, 책들의 운명> 가운데- 이 책은 미국의 논픽션 작가 수전 올리언(Susan Orlean)이 1986년 4월 29일에 일어난 로스엔젤레스 공공도서관 화재 사건을 다룬 책이다. 이 도서관은 로스앤젤레스 사람들이 저녁에 가족들과 십자말풀이를 하다가 정답을 모르겠으면 도서관에 전화해 물어보고, ‘넥타이가 욕조에 빠졌어요’를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물어보는 등 온갖 사소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 도서관이 없으면 못살 것 같은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도서관이었다. 그런 도서관이 섭씨 1,100도까지 불길이 치솟으며 장장 7시간 38분 동안 활활 타버리는 대참사를 지켜보았을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상상조차 어렵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도서관 화재 사건이었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묻혀 로스엔젤레스 지역에서만 크게 보도되는 바람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수전 올리언은 도서관에서 불 냄새가 나지 않느냐는 사서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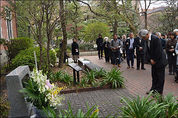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27살의 나이로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윤동주 시인. 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그가 숨을 거둔 2월 16일(1945년)을 전후해서 일본 각지에서는 오래전부터 해마다 추모회를 열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15일, 홍매화꽃이 곱게 핀 일본 교토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学)에서 윤동주를 그리는 모임(尹東柱を偲ぶ会)과 도시샤코리아동창회(同志社コリア同窓会) 주최로 추모회가 열렸다. 특히 올해는 “윤동주 시비 건립 25주년”을 맞이하여 1995년 한일공동제작으로 윤동주 시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타고 기치로(多胡 吉郎) 씨를 비롯하여 후쿠오카 윤동주 시를 읽는 모임(福岡尹東柱の詩を読む会)의 대표인 마나기 미키코(馬奈木 美喜子) 씨, 시인 윤동주를 기념하는 릿쿄모임(詩人尹東柱を記念する立教の会)의 대표 야나기 하라 야스코(楊原 泰子) 씨, 일본성공회나라기독교회(日本聖公会奈良基督教会) 이다 이즈미(井田 泉)목사를 비롯하여 윤동주 시인의 조카인 윤인석 교수를 초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관계로 많은 초청인사가 불참한 가운데 타고 기치로 씨, 우에노 미야코(上野 都) 시인 등 100여 명만 참석하여 추모회를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일제강점기에 ‘조선고적연구회(朝鮮古蹟硏究會)’라는 단체가 있었다. ‘조선고적연구회’는 조선총독부의 행정지원과 일본의 재벌, 궁내부, 일본학술진흥원, 이왕가 등의 재정지원으로 활동하던 식민사학의 뿌리가 되는 조직이다. 1910년대 이 조직이 등장하기 전에 생긴 조선총독부 주도로 실행하던 고적조사사업이 조선내의 문화재 단순한 파악 수준이었다면 조선고적연구회는 각 지역에 해당 유적의 전문가를 상주시키면서 기존에 파악된 유적이나 유물이 발굴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파헤치는 조직이라는 점이 다르다. 《청구학보(靑丘學叢), 5호(1931)》에 따르면 구로이타 가츠미(黑板勝美)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조선고적연구회는 고분(古墳) 발굴에 주력한 조직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고분 발굴을 했을까? 도쿄 국립박물관 3층에는 “오구라 컬렉션(小倉 Collection)”이 기증한 우리나라 유물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오구라는 1922년부터 1952년까지 조선에서 문화재를 약탈해갔는데 무려 1,100여 점이나 되며, 이 가운데 39점은 일본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정도의 수준 높은 문화재들이다. 그런가 하면 앞 이름이 비슷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최대 승리로 우리 겨레의 자주독립 역량을 입증한 ‘청산리대첩 100주년’을 기리는 ‘독립군가 다시 부르기 경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많은 국민이 독립군가를 부르면서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군의 공로를 기리고 그 뜻을 계승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경연대회의 참가신청과 경연 곡 등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참가신청은 2월 17일(월)부터 3월 6일(금)까지이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경연 곡은〈독립군가〉, 〈용진가〉, 〈승리 행진곡〉*, 〈압록강 행진곡〉 모두 4곡으로 이 가운데 한 곡을 뽑아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편곡, 개사 등)하여 부르면 된다. *〈승리 행진곡〉은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김좌진 장군이 직접 작사한 곡으로, 배우 송일국, 황성대, 정태성과 음악감독 최재관이 참여한 녹음 음원을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한다. 심사 결과 발표는 3월 23일(월)이며, 시상식은 3월 28일(토)에 진행할 계획으로, 대상 1인에게는 국가보훈처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우리문화신문= 이윤옥 기자] 최근 급속도로 번져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일으키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는 현재로서는 마땅한 백신이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다. 아프리카의 가축용 돼지에서 시작되어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 바이러스를 뉴스로 접하다 보면 모든 바이러스가 이렇듯 생명체를 위협하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바이러스의 많은 부분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존재가 밝혀지고 연구가 이어지는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중 1%도 되지 않는다. 세계적인 과학 칼럼니스트 칼 짐머(Carl Zimmer)는 이 책의 서문에서 “바이러스의 다양성을 배우는 목적은 그저 아름다움을 감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알아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바이러스의 공세는 오늘도 계속되며, 이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바이러스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이러스를 알아야 한다. 이 책 《바이러스》에서는 ‘어떻게’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작용하며, 바이러스가 자신을 복사하고 포장하며 숙주와 상호작용하고 면역체계에 대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