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初伏)이다. 초복은 삼복의 첫날인데 하지 뒤 셋째 경일을 초복, 넷째 경일을 중복, 입추 뒤 첫 경일을 말복이라 하여, 이를 삼경일(三庚日) 또는 ‘삼복’이라 한다.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의 천간(天干)과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12지지(地支)에서 하나씩 붙여 해(年)와 달(月) 그리고 날(日)을 말하는데 날에 경(庚)이 붙은 날을 경일(庚日)이라 한다. 올해를 보면 오늘 곧 2021년 7월 11일은 셋째 경일 곧 경신(庚申)으로 초복이며, 7월 21일 넷째 경일은 경오(庚午)로 중복, 입추 뒤 첫 경일 곧 8월 10일은 경인(庚寅)으로 말복이다. 복날은 열흘 간격으로 오기 때문에 초복과 말복까지는 20일이 걸린다. 그러나 올해처럼 해에 따라서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이 되기도 하는 경우 이를 월복(越伏)이라고 한다. 삼복 기간은 한해 가운데 가장 더운 때로 이를 '삼복더위'라 하는데 조선시대 궁중에서는 더위를 이겨 내라는 뜻에서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빙표(氷票)를 주어 관의 장빙고에 가서 얼음을 타 가게 하였다. 복중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충남 부여에서 열린 2021년도 정례 강습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보존회는 회원들의 공개발표회도 열고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이날 발표는 평시조를 비롯하여, 사설, 여창지름, 남창지름, 반각, 중허리, 엮음지름 등을 선보였다는 이야기, 시조창은 고악보에 보이는 <경제(京制)의 평시조(平時調)>가 원형으로 보이고, <향제시조>는 그 지방의 환경이나 풍속, 성격, 기호에 따라 토착화되면서 지방의 특징을 지니고 전승되어 온다는 이야기, 충청의 내포제, 전라의 완제, 경상의 영제를 비롯하여 더 세분된 형태 등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일찍이 이병기는 시조시의 연원을 신라로 올라가 향가(鄕歌) 가운데서 시조의 형식과 유사한 것이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안랑은 불가(佛歌)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고, 정래동은 한시(漢詩)의 번역 중에서 발견한 시형(詩形)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태준은 고려조의 한문 악장에 대하여 생긴 별곡이 파괴되어 장가(長歌)와 단가(短歌)로 구분되는 과정에서 단가가 시조로 분화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여하튼 시조시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지난주까지는 성남의 경기소리꾼, 방영기 명창에 관한 이야기를 해 왔다. 어려서부터 춤과 노래 부르기에 뛰어나 이창배, 정득만, 김옥심 등, 서울의 명창들을 찾아다니며 소리공부를 해 왔고, 30여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그 기념으로 매해 <우리소리를 찾아서>라는 개인 발표회를 열어오고 있다는 이야기, 그는 <이무술 집터다지는 소리>, <판교 쌍용 거 줄다리기놀이>를 발굴, 재현하였고, 앞으로도 <숯골 축제>를 비롯한 성남지역의 전통소리나 놀이를 발굴, 전승해 나갈 계획이란 이야기를 했다. 또 방영기는 경기권 음악의 남성 소리꾼으로는 흔치 않은 공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으며 전문예술인으로는 흔치 않게 성남시의원, 경기도의원 등을 역임하며 성남아트센터, 문화예술의 발전기금 조성, 시립국악단의 창단, 등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였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이번 주에는 충남 부여에서 열린 2021년도 정례 강습회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다. 동 시조보존회는 강습을 개회함에 앞서 언제부터인가 회원들의 정례발표회를 열고 있다. 이번 강습회에도 김연소 예능보유자를 비롯하여,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이무술 집터다지는 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방영기의 소리인생 50주년 기념 공연에서도 이 소리는 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 큰 돌을 높이 들었다, 놓았다 하며 땅을 다지는 중노동의 힘든 과정을 소리를 주고받으며 이겨 냈다는 이야기, 그러나 현대화의 물결은 이러한 노동요도 잊게 했고, 가정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고사와 덕담의 민속놀이도 단절시켜 버렸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성남시는 2017년, <이무술 집터다지는 소리>를 향토문화재 제15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방영기 명창의 말이다. “우리 고장에는 앞으로 더 발굴해야 할 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중부면에서는 <숯골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내릴 때 하는 소리이고요. 대왕면에서는 봉화를 올리는 민속놀이를 만들 예정인데, 이것은 천림산에 있는 봉화터에서 과거에 봉화를 올리던 장면을 놀이로 재현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탄천과 관련된 것으로 과거에는 저수지가 없어서 농사를 지으려면 보를 막아야 했는데, 이에서 착안한 <보막이 놀이>도 만들 예정입니다.” 기타, 천연두로 3달 사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도롱이 접사리며 삿갓은 몇 벌인고 모찌기는 자네 하소 모심기는 내가 함세 들깨 모 담뱃 모는 머슴아이 맡아 내고 가지 모 고추 모는 아기 딸이 하려니와 맨드라미 봉선화는 내 사천 너무 마라 아기 어멈 방아 찧어 들 바라지 점심 하소 보리밥 찬국에 고추장 상추쌈을 식구들 헤아리되 넉넉히 능을 두소” 위는 조선 헌종 때 정학유(丁學游)가 지은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가운데 5월령 일부로 이 음력 오월 망종ㆍ하지 무렵 농촌 정경을 맛깔스럽게 묘사했습니다. “모찌기는 자네 하소 모심기는 내가 함세 / 들깨 모 담뱃 모는 머슴아이 맡아 내고”라며 모내기에 바쁜 모습을 그려내고, “보리밥 찬국에 고추장 상추쌈을 식구들 헤아리되 넉넉히 능을 두소”라며 맛있는 점심이야기를 노래합니다. 오늘은 24절기의 열째 “하지”입니다. 이 무렵 해가 가장 북쪽에 있는데, 그 위치를 하지점(夏至點)이라 합니다. 북반구에서는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 14시간 35분이나 되지요. 한해 가운데 해가 가장 오래 떠 있어서 지구 북반구의 땅은 해의 열을 가장 많이 받아 이때부터 날이 몹시 더워집니다. 그런데 하지는 양기가 가장 성한 날입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판교 널다리 쌍용 거 줄다리기>의 발굴과 재현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농촌이 하루아침에 현대화되는 환경속에서, 이와 같은 옛 민속놀음이 온전하게 보존되기 쉽지 않은데, 방영기 명창과 같은 토박이 소리꾼들의 참여와 봉사로 재현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번 주에는 <이무술 집터다지는 소리>에 관한 이야기다. 글쓴이는 방영기 명창의 소리인생 50주년 기념 공연에 다음과 같은 축사를 보낸 바 있다. “이날,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순서는 <이무술 집터 다지는소리>다. ‘이무술’은 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二梅洞)의 옛 이름이며 이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향토색이 짙은 민속놀이의 하나다. ‘지경다지는 소리’는 여러 일꾼들이 큰 돌을 높이 들었다, 놓았다 하며 땅을 다지는 소리인데, 중노동의 힘든 과정을 잊고 작업성과를 올리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란 장단에 맞추어 불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소리는 경기 중부지역의 음악적 토리와 특색있는 선율이 그 가치를 높여온 소리제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역의 현대화는 신명을 북돋우던 노동요도 잊게 했고, 가정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던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명절 단오입니다. 단오는 단오절, 단옷날, 천중절(天中節), 포절(蒲節:창포의 날), 단양(端陽), 중오절(重午節, 重五節)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우리말로는 수릿날이라고 하지요. 단오의 '단(端)'자는 첫째를 뜻하고, '오(午)'는 다섯이므로 단오는 '초닷새'를 뜻합니다. 수릿날은 조선 후기에 펴낸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이날 쑥떡을 해 먹는데, 쑥떡의 모양이 수레바퀴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리'란 이름이 붙었다고 했으며, 또 수리란 옛말에서 으뜸, 신(神)의 뜻으로 쓰여 '신의 날', '으뜸 날'이란 뜻에서 수릿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해에 세 번 신의 옷인 빔(비음)을 입습니다. 설빔, 단오빔, 한가위빔이 바로 그것이지요. 단오빔을 ‘술의(戌衣)’라고 해석한 유만공의 《세시풍요(歲時風謠)》 할주(割註, 본문 바로 뒤에 두 줄로 잘게 단 주)에 따르면 술의란 신의(神衣), 곧 태양신을 상징한 신성한 옷입니다. 수릿날은 태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지요. 단옷날 쑥을 뜯어도 오시(午時)에 뜯어야 약효가 가장 좋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태양신[日神]을 가장 가까이 접하게 되는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소리 공부 30년에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거머쥔 방영기 명창의 이야기를 하였다. 수상했을 때의 결심으로 해마다 개인발표회를 열어 오고 있는데, 지난해는 국악입문 50돌이었으나 감염병 확산으로 무관중 영상 공연을 하였다는 이야기, 2009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 산타령의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어 그 보급과 확산에 전력하고 있다는 이야기, 성남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전통놀이를 발굴하였고, 공연 작품으로 재구성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번 주에는 <판교 널다리 쌍용 거 줄다리기>의 발굴과 재현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종목은 현재 성남의 대표적인 공연 작품으로 재구성하여 많은 시민의 관심을 받는 작품이 되었다. 우선, <판교 널다리 쌍용 거 줄다리기>라는 긴 이름의 놀이는 정월 대보름날, 널다리 마을(판교동)에서 행해졌던 민속놀이의 하나다. 이름이 긴 놀이, 그 뜻부터 풀어보도록 한다. 지금 판교(板橋)신도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일대에 조성된 계획도시로 대도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분담하고 있지만, 첨단과학이나, 또는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아홉째인 “망종(芒種)”이다. 망종이란 벼, 보리 같이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씨앗을 뿌려야 할 적당한 때라는 뜻이다. 이 때는 모내기와 보리 베기에 바쁜 때로 “발등에 오줌 싼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도 있는데 망종까지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된다는 뜻이며,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볏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요.”, “햇보리를 먹게 될 수 있다는 망종”이라는 말도 있다. 또 이때쯤은 가뭄이 들기도 한다. 논과 밭 모두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옹달샘 물마저 끊겨 먼 데까지 먹을 물을 길러 다니기도 했다. 농사가 나라의 근본이었던 조선시대엔 비가 오지 않으면 임금까지 나서서 기우제를 지내야 했는데 《조선왕조실록》에 “기우제”가 무려 3,122건이나 나올 정도다.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먼저 산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놓는 방법이 있다. 이는 산에서 불을 놓으면 타는 소리가 천둥 치는 소리같이 난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 연기를 통해 하늘에 간절함을 전한다는 얘기도 있다. 또 하늘님을 모독하거나 화나게 하여 강압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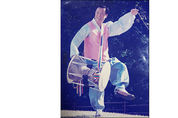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방영기는 춤과 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춤은 한영숙, 소리는 이창배 명인을 비롯하여 당대 내로라하는 명창들에게 배웠다는 이야기, 1991년 경기국악제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은 이후, 1999년 제6회 전국민요경창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방영기는 본격적으로 소리 공부를 시작한 지 꼭 30년 만에 그것도 산타령을 불러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거머쥔 것이다. 대한제국 말기 박춘재는 고종 앞에서 산타령을 불러 총애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지만, 방영기는 산타령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일반인들은 소리 공부 30년 만에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뭐 그리 대단하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나, 속을 아는 사람들은 그 상이 얼마나 힘든 노력의 대가요, 결정인가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상을 걸고 열리는 경서도 소리 대회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서도 민요란 말은 경기소리와 서도소리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중부지방, 곧 서울ㆍ경기ㆍ인천ㆍ충북ㆍ충남의 북부지방, 강원도의 서남부 지방을 포함하는 중부지역의 소리를 흔히 경기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