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겨울내내 목이 말랐던 꽃들에게 / 시원하게 물을 주는 고마운 봄비 / 봄비가 내려준 물을 마시고 / 쑥쑥 자라는 예쁜 꽃들 / 어쩜 키가 작은 나도 / 봄비를 맞으면 / 키가 쑥쑥 자라지 않을까? / 봄비야! 나에게도 사랑의 비를 내려서 / 엄마만큼, 아빠만큼 크게 해줄래?” -홍가은/강릉 남강초교 3년- 파릇파릇한 새싹을 키우는 봄비는 대지를 촉촉이 적시고 가은이의 꿈도 쑥쑥 자라게 합니다. 우리 토박이말 중엔 비에 관한 예쁜 말이 참 많습니다. 봄에는 ‘가랑비’, ‘보슬비’, ‘이슬비’가 오고 요즘 같은 모종철에 맞게 내리는 ‘모종비’, 모낼 무렵 한목에 오는 ‘목비’도 있지요. 여름에 비가 내리면 일을 못 하고 잠을 잔다고 하여 ‘잠비’,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내리는 시원한 소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세차게 내리는 비는 ‘달구비’, ‘무더기비’(폭우, 집중호우), ‘자드락비’, ‘채찍비’, ‘날비’ ‘발비’, ‘억수’ 등도 있습니다. 또 가을에 비가 내리면 떡을 해 먹는다고 ‘떡비’가 있고 겨우 먼지나 날리지 않을 정도로 찔끔 내리는 ‘먼지잼’도 있습니다. 또한, 볕이 난 날 잠깐 뿌리는 ‘여우비’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박을 쪼개지 않고 꼭지 부분을 따내거나 꼭지 옆에 주먹만 한 구멍을 내고 속을 파낸 다음 거기에 씨앗을 갈무리해 두는 그릇이 ‘뒤웅박’입니다. 뒤웅박은 두베, 됨박, 두벵주름박, 뒝박, 두뱅이주룸박, 두룸박 같은 말로도 부릅니다. 경북 상주지방에서는 오짓물로 구운 것을 쓰며, 박이 나지 않는 데서는 짚으로 호리병처럼 엮어서 쓰기도 하지요. 또 함경도 지방에서는 뒤웅박에 구멍을 뚫고 속이 빈 작대기를 꿰어 씨를 뿌릴 때 썼습니다. 뒤웅박의 모양은 보통 바가지처럼 둥글지만, 호리병처럼 위가 좁고 밑이 넓은 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뒤웅박은 씨앗을 갈무리하는 데만 쓰지 않고, 도시락처럼 쓰기도 하는데 습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밥을 담아두면 잘 쉬지 않습니다. 그 밖에 달걀 따위도 넣어두며, 가을에 메뚜기를 잡아 담는 통으로도 썼습니다. 흔히 처마 밑이나 보꾹(지붕의 안쪽) 밑 또는 방문 밖에 매달아둡니다. 뒤웅박은 보통 씨앗 5∼10리터를 담을 수 있지요. ‘뒤웅박’이 들어간 속담을 보면 “뒤웅박 신고 얼음판에 선 것 같다”가 있는데 이는 몹시 위태로워서 불안하고 조심스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또 “여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나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사무치는 고마움으로 이 아름다움의 뜻을 몇 번이고 자문자답했다.” 위는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고 최순우 선생의 책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학고재)》에 나오는 글 일부입니다. 최순우 선생은 ‘배흘림기둥’이 얼마나 아름답기에 사무치는 고마움을 얘기했을까요? 한국 전통집들은 백성집으로부터 궁궐에까지 모두 나무집 곧 목조건축입니다. 목조건축의 기둥은 원통기둥, 배흘림기둥, 민흘림기둥의 3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먼저 ‘원통기둥’은 기둥머리ㆍ기둥몸ㆍ기둥뿌리의 지름이 모두 같은 기둥을 말합니다. 이게 보통 집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와는 달리 ‘민흘림기둥’은 기둥머리 지름이 기둥뿌리 지름보다 작게 마름질(옷감이나 재목 등을 치수에 맞추어 마르는 일) 한 기둥인데 구조적이기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지요. 해인사 응진전(應眞殿), 화엄사 각황전(覺皇殿), 수원 화성의 장안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흘림기둥’도 있습니다. 배흘림기둥은 기둥의 중간 곧 기둥몸이 굵고 위(기둥머리)ㆍ아래(기둥뿌리)로 가면서 점차 가늘게 되어가는 모양의 기둥입니다. 배흘림기둥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국립경주박물관은 국보 제29호 ‘성덕대왕신종’ 주종 1,250돌을 맞아 지난 2월 8일(월) 성덕대왕신종의 종소리를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성덕대왕신종 소리체험관”을 일반 공개했습니다. 봉덕사종, 에밀레종이라고도 부르는 ‘성덕대왕신종’은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완성은 혜공왕 때인 771년에 이루어졌지요. 이 종은 맨 처음 봉덕사에 걸려있었지만, 영묘사로 옮겼다가 1915년엔 박물관으로 옮겼는데 국립경주박물관이 신축 이전함에 따라 이 종도 박물관 경내로 이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종으로 제작 연대가 확실하고 각 부의 양식이 풍요롭고 화려할뿐더러 종은 장중하면서도 맑은소리와 유난히 길고 신비스러운 소리를 들려주어 듣는 사람을 꼼짝 못 하게 하는 매력이 있지요. 독일 고고학자 켄멜은 이 종을 일컬어 “한국 제일의 종이 아니라 세계 으뜸 종”이라고 평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지난 1년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 신라미술관에 새롭게 문을 열게 된 “성덕대왕신종 소리체험관”은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성덕대왕신종의 진정한 울림을 찾아 떠나는 여정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셋째 경칩(驚蟄)입니다. 봄이 되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고 하여 계칩(啓蟄)이라고도 하는데, 풀과 나무에 물이 오르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 벌레들도 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지요. 경칩 무렵의 봄 천둥소리에 따라 북을 치거나 연기를 집 안팎에 내어 잠에서 깨어난 벌레와 뱀들을 집 밖으로 몰아내었는데, 이는 점차 경칩에 불운을 쫓아내는 풍습으로 발전했습니다. 경칩에는 개구리 알을 먹으면 허리 아픈 데 좋고 몸에 좋다고 해서 이날 개구리알 찾기가 혈안이 되는데 지방에 따라선 도룡뇽 알을 건져 먹기도 합니다. 단풍나무나 고로쇠나무에서 나오는 즙을 마시면 위병이나 성병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약으로 먹는 지방도 있지요. 또 이때 흙일을 하면 탈이 없다고 해서 이날 담벽을 바르거나 담장을 쌓습니다. 또 경칩 때 벽을 바르면 빈대가 없어진다고 해서 일부러 흙벽을 바르는 지방도 있지요. 옛날에는 경칩날 젊은 남녀들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징표로써 은행 씨앗을 선물로 주고받으며, 은밀히 은행을 나누어 먹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날 날이 어두워지면 동구 밖에 있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 나드니 금일도 상봉에 임 만나 보겠네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임 만나 보겠네 갈 길은 멀구요 행선은 더디니 늦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성황님 조른다” 얼마 전 JTBC ‘펜텀싱어’라는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서도민요 <몽금포타령>이 울려 나왔습니다. 시즌3에서 2위를 차지한 '라비던스'라는 그룹의 노래인데 이들은 소리꾼 고영열을 이끔이로 베이스바리톤 김바울, 테너 존노, 뮤지컬배우 황건하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도민요 <몽금포타령>에 경기민요 <배띄워라>를 조합해서 불렀지요. 한 블로거는 자신이 음악 교사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음색들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하나로 어우러진다. 오직 자신들의 개성과 빛나는 목소리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냥 그냥 하나가 되어 들린다.”라고 칭찬합니다. 이날 라비던스의 <몽금포타령>은 민요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민요의 매력에 씸취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몽금포타령>은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온 가장 많이 알려진 황해도민요로 <장산곳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짚신은 볏짚으로 삼은 신발로 초혜(草鞋)라고도 하며, 재료에 따라 왕골신[菅履]ㆍ청올치신[葛履]ㆍ부들신[香蒲履]도 있는데 특히 짚신과 같은 모양이지만 삼[麻]이나 노끈으로 만든 것을 ‘미투리’ 또는 삼신[麻履]이라 하며 이는 짚신보다 훨씬 정교하지요. 짚신의 역사는 약 2천여 년 전 마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송나라 마단림(馬端臨)은 《문헌통고(文獻通考)》에서 “마한은 초리(草履)를 신는다.”라고 했는데 이 초리가 바로 짚신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익은 그의 책 《성호사설》에서 “왕골신과 짚신은 가난한 사람이 늘 신는 것인데 옛사람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선비들은 삼으로 삼은 미투리조차 부끄럽게 여기고 있으니, 하물며 짚신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라고 개탄합니다. 이익의 개탄처럼 조선 후기로 오면서 짚신 신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풍조가 생겼지만, 그 이전엔 정승을 했던 선비들도 짚신을 예사로 신었습니다. 짚신은 원래 처음 삼을 때는 왼쪽 오른쪽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만듭니다. 다만 오래 신으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는 것이지요. 또한 조선 초기엔 양반과 평민 사이에서 옷은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여기 만취한 선비가 흐느적거리면서 갈 ‘지(之)’ 자로 걷고 친구들이 부축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후기 화가 김후신(金厚臣)이 그린 <대쾌도(大快圖)>로 자본담채, 크기 33.7 x 28.2 cm, 간송미술관 소장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때는 살벌한 금주령이 내려진 영조임금 때였습니다. 술을 빚거나 마시는 것을 엄하게 다스리던 시절이었지만 금주령 앞에 희생당하는 건 양반이 아닌 일반 백성이었지요.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 하는 백성은 술을 빚어 팔았다고 잡혀가고, 몰래 술 마셨다고 잡혀가지만, 금주령이 내려진 대낮에도 양반들은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고 대로를 활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날렸던 조선의 많은 유명 화가들도 술에 취해야만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많습니다. 조선의 대표적 주당 화가들을 보면 우선 심한 술버릇과 기이한 행동으로 많은 일화를 남겼음을 물론 마침내는 눈밭에서 술에 취해 얼어 죽은 최북이 있지요. 또 술에 취해야 그림을 그렸던 장승업, 술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섭섭해할 정도였으며, 호를 ‘취화사(醉畵史)’로 붙였던 김홍도, 역시 호를 취옹(醉翁)이라 붙였던 김명국도 그 대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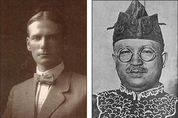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3.1만세운동 102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일절을 맞아 3.1만세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미국 AP통신 임시특파원 앨버트 W. 테일러(1875∼1948)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원래 앨버트 테일러는 1896년 조선에 들어온 광산 사업가였는데 AP통신 특파원으로도 활동하면서 3.1만세운동과 제암리 학살사건을 나라 밖에 알렸습니다. 특히 테일러는 3.1만세운동 독립선언문을 손에 넣은 뒤 이를 일제에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3.1만세운동 전날 태어난 아들의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가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테일러가 서울 종로구 행촌동에 짓고 살았던 가옥 '딜쿠샤'(Dilkusha)의 원형이 복원되어 삼일절을 맞아 개방합니다. 서울시는 2017년 딜쿠샤 고증 연구를 거쳐 2018년 복원 공사에 착수, 건물 정면 토지 매입비 등 모두 43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했습니다. 딜쿠샤 내부 1ㆍ2층 거실은 테일러 부부가 살 때의 모습을 당시 사진 6장을 토대로 재현했다고 하지요. 가구 등은 대부분 1800년대 후반∼1900년대 초반 출시된 고전 제품을 사서 배치했고, 구하지 못한 물건 일부는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한해 가운데 보름달이 가장 크고 밝다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은 예부터 사람과 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화합하고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비손하며 점쳐보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동국세시기》에 "초저녁에 횃불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 달맞이하는 것을 망월(望月)이라 하며, 먼저 달을 보는 사람이 운수가 좋다."고 하여 이날은 남녀노소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며 저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대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면 '부럼 깬다' 하여 밤, 호두, 땅콩, 잣, 은행 등 견과류를 깨물며 한해 열두 달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도록 빕니다. 또 부럼을 깨물 때 나는 소리에 잡귀가 달아나고 이빨에 자극을 주어 건강해진다고 생각했지요. 또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을 보면 상대방 이름을 부르는데 이때 상대방이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하는데, 이름을 불린 사람이 그걸 알면 “먼저 더위!”를 외칩니다. 이렇게 더위를 팔면 그해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재미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대보름날엔 세 집 이상의 성이 다른 사람 집의 밥을 먹어야 그해 운이 좋다고 하며, 평상시에는 하루 세 번 먹는 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