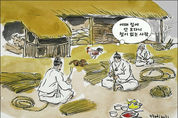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내일은 명절의 하나인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의 다른 이름은 원소절(元宵節), 원석절(元夕節), 원야(元夜), 원석(元夕), 상원(上元), 큰보름, 달도, 등절(燈節), 제등절(提燈節)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특히 신라 제21대 소지왕(炤智王)이 까마귀의 도움으로 죽음을 모면했다고 하여 까마귀를 기리는 날, 곧 “오기일(烏忌日)”이라고도 합니다. 정월은 노달기라고 하여 설날부터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는 민속놀이와 세시풍속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전해오는 속담에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은 새해가 시작하는 때이므로 객지에 나간 사람도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조상에게 예(禮)를 다하고 이웃에게 인사를 다녀야 하는데 부득이 설을 집에서 쇨 수 없다면 정월대보름에라도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보름 이후부터는 슬슬 농사철이 다가오므로 농사 준비를 위해서도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월보름임에도 여전히 나들이 중이면 ‘철(농사철)을 모르는 사람이요, 철이 없는 사람이요, 농사와 연을 끊은 사람’이라고 해서 욕을 먹었고 농사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가도 가도 붉은 황톳길 숨 막히는 더위 속으로 절름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千里), 먼 전라도 길. 한센병을 온몸으로 껴안고 살다간 천형(天刑)의 시인 한하운의 <전라도 길 - 소록도로 가는 길> 시 일부입니다. 신발도 아니고 일본의 일할 때 신는 신발겸용 버선인 지까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고 피를 토하듯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5년 전인 1916년 오늘(2월 24일)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의 남쪽 섬 소록도에 자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한센병 환자 100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설립했습니다. 그 뒤 일제는 1931년 만주 침략 이후 나예방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일반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절대적 격리정책을 소록도에 적용하였지요. 소록도 갱생원은 1930년대 말에 이르면 세계 제2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대규모 수용시설이 되었지만, 동시에 환자들의 강제노동, 감금, 생체실험, 단종 등이 마구 이루어져 마치 종신감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한센인들은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전남 구례 지리산 자락에는 유서 깊은 절 화엄사가 있습니다. 화엄사는 멀고먼 인도에서 오신 연기조사가 지은 절로 알려져 있는데 연기조사는 효성이 지극한 스님이었습니다. 화엄사 대웅전 뒤편 언덕을 효대(孝臺)라 부르는데 이곳에는 4마리 사자가 석탑을 떠받치고 있는 4사자삼층석탑(四獅子三層石塔)이 있습니다. 그 4사자석탑 4마리 사자 한가운데에는 연기조사의 어머니가 합장하고 단아하게 서 있습니다. 석탑이 마주 보이는 곳에는 아담한 석등이 하나 있는데 이 속에는 연기조사의 모습이 어머니를 우러르고 있지요. 머나먼 고국 인도에서 건너온 연기조사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가 자리잡고 있었고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연기조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들만을 보고싶어 했을 어머니를 그리며 즈믄해(천 년)를 합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대각국사 의천은 연기조사의 효심을 시로 읊었는데 효대라는 이름은 여기서 나온 말이지요. 국보 제35호 지정된 4사자석탑은 남북국시대(통일신라) 전성기인 8세기 중엽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탑의 높이는 5.5m이고 탑 안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 72과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석탑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키는 탈곡이 완전히 기계화되기 전까지 농가에선 없어서 안 되는 도구였습니다. 곡물을 털어내는 탈곡 과정에서 곡물과 함께 겉껍질, 흙, 돌멩이, 검부러기들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로 곡물을 까불러서 이물질을 없앴지요. 고리버들이나 대나무를 납작하게 쪼개어 앞은 넓고 평평하게, 뒤는 좁고 오목하게 엮어 만듭니다. 키는 지방에 따라서 ‘칭이’, ‘챙이’, ‘푸는체’로도 부르는데 앞은 넓고 편평하고 뒤는 좁고 우굿하게 고리버들이나 대쪽 같은 것으로 결어 만들지요. "키" 하면 50대 이상 사람들은 어렸을 때 밤에 요에다 오줌싼 뒤 키를 뒤집어쓰고 이웃집에 소금 얻으러 가던 물건쯤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키를 쓰고 간 아이에게 이웃 아주머니는 소금을 냅다 뿌려댑니다. 그리곤 “다시는 오줌을 싸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렇게 놀래주면 오줌을 싸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또 싸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방법이 그리 신통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경상남도 지방에서는 정초에 처음 서는 장에 가서는 키를 사지 않는데 키는 까부는 연장이므로 복이 달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르고 사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한 사람이 67년이나 일기를 썼다면 엄청난 일일 것입니다. 조선시대 무관 노상추는 현존 조선시대 일기 가운데 가장 긴 67년 동안 일기를 썼고 최근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를 국역하여 《국역 노상추일기》 펴냈습니다. 《국역 노상추일기》는 18~19세기 조선의 사회상을 생생히 보여주는 귀중한 1차 사료입니다. 노상추가 1763년(18살)부터 1829년(84살)까지 기록한 일기에는 4대에 걸친 대가족의 희로애락, 각처에서의 관직 생활, 당시 사회의 정황 등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담겨있지요. 노상추는 자신의 일기가 후손들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이 되기를 희망하며 삶의 경험과 의례 풍습 절차, 올바른 처신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국역 노상추일기》를 통해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정제된 자료에는 기록되지 않은 조선 사회의 실상을 더욱 실감나게 엿볼 수 있으며, 조선후기 정치의 비주류인 영남 남인 출신 무관 노상추는 당시 문관 중심의 양반 관료 사회를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노상추의 일기장에는 무관을 깎아내리고, 영남 출신 남인을 차별하는 주류 양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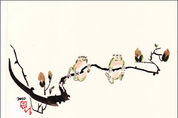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둘째 ‘우수’입니다. 우수날에 비 오면 까끄라기 있는 곡식들, 밀과 보리는 대풍을 이룬다 했지요. 보리밭 끝 저 산너머에는 마파람(남풍:南風)이 향긋한 봄내음을 안고 달려오고 있을까요? 동네 아이들은 양지쪽에 앉아 햇볕을 쬐며, 목을 빼고 봄을 기다립니다. "꽃샘잎샘 추위에 반늙은이(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계절 인사로 "꽃샘잎샘 추위에 집안이 두루 안녕하십니까?"라는 것도 있지요. 또 봄을 시샘하여 아양을 떤다는 말로 화투연(花妬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꽃샘추위라는 토박이말보다 정감이 가지 않는 말입니다. 우수에는 이름에 걸맞게 봄비가 내리곤 합니다. 어쩌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은 봄비와 함께 꿈을 가지고 오는지도 모르지요. 그 봄비가 겨우내 얼었던 얼음장을 녹이고, 새봄을 단장하는 예술가일 것입니다. 기상청의 통계를 보면 지난 60년 동안 우수에는 봄비가 내려 싹이 튼다는 날답게 무려 47번이나 비가 왔다고 하니 이름을 잘 지은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일부러 이날 비를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은 정월 초이렛날로 우리 겨레는 이날 ‘이레놀음’을 즐겼습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우리 겨레는 예부터 밥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밥의 종류도 무척이나 많았지요. 먼저 밥의 이름을 보면 임금이 먹는 수라, 어른에게 올리는 진지, 하인이 먹는 입시, 제사상에 올리는 젯메 등이 있습니다. 밥에도 등급이 있다는 말인데 지금 수라ㆍ입시ㆍ젯메를 먹은 사람은 물론 없겠네요. 또 벼 껍질을 깎은 정도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 현미밥부터, 조금 더 깎은 7분도밥과 가장 많은 사람이 해 먹는 백미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밥에 섞는 부재료에 따라서도 나누어집니다. 먼저 정월대보름에 해 먹는 오곡밥, 계절에 따라 나는 푸성귀(채소)나 견과류를 섞어서 짓는 밥이 있으며, 콩나물밥, 완두콩밥, 무맙, 감자밥, 밤밥, 김치밥, 심지어는 굴밥까지 있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밥 종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봄에는 시루떡에 고물로 쓰는 팥을 넣어 만든 거피팥밥, 여름에는 햇보리밥, 초가을에는 강낭콩밥이나 청태콩밥, 겨울에는 붉은 팥 또는 검정콩으로 밥을 해 먹습니다. 그밖에 1800년대 말 무렵 나온 조리서에 처음 등장하는 골동반(骨董飯)이라고 하는 비빔밥도 있고, 옛날 공부하던 선비들이 밤참으로 먹으려고 제삿밥과 똑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그대들은 다투지 말라. 나도 잠깐 공을 말하리라. 미누비 세누비 누구로 하여 젓가락같이 고우며, 혼솔(홈질한 옷의 솔기)이 나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우리요. 바느질 솜씨가 그다지 좋지 못하여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나의 손바닥을 한번 씻으면 잘못한 흔적이 감추어져 세요(바늘)의 공이 나로 하여금 광채 나니라." 이는 바느질(침선)에 사용하는 자, 바늘, 가위, 실, 골무, 인두, 다리미를 의인화하여 인간 세상을 풍자한 한글 수필 《규중칠우쟁론기(閨中七友爭論記)》의 인두(인화낭자) 부분입니다. 이젠 잊혔지만, 예전 어머니들이 바느질할 때 쓰던 도구 가운데 화롯불에 묻어 놓고 달구어 가며 옷감의 구김살을 눌러 펴거나 솔기를 꺾어 누르는 데 쓰던 인두가 있었습니다. 인두는 무쇠로 만들며 바닥이 반반하고 긴 손잡이가 달렸지요. 형태는 인두머리의 끝이 뾰족한 것, 모진 것, 둥근 것 따위가 있는데 특히 인두머리가 뾰족한 것은 저고리의 깃ㆍ섶코ㆍ버선코ㆍ배래ㆍ도련 등 한복의 아름답고 정교한 곡선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또, 마름질(재단)할 때 재단선을 표시하려고 금을 긋는 데에도 썼는데 지금은 그 역할을 초크가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운서(韻書)에 이르기를 ‘동무(同舞)는 바로 마주 서서 춤을 추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지금 ‘동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 글은 조선후기의 학자 조재삼(趙在三)이 쓴 백과사전 격인 책 《송남잡지(松南雜識)》에는 나오는 말입니다. 이 “동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 어떤 일을 짝이 되어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북한에서 쓰는 말이라고 하여 언젠가부터 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두문불출 골방에 엎드려 한서나 뒤적이는 이가 다 빠진 늙은이는 내 걸음동무다." 이 글은 신경림 시인의 “산동네"라는 시 일부입니다. “걸음동무”는 같은 길을 가는 친구 곧 “동행”을 말하지요. 동무와 비슷한 말로 “벗”과 “친구”도 있습니다. “벗”은 비슷한 나이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을 말하며, “친구(親舊)”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뜻하지요. 김인호 시인은 <어깨동무>란 시에서 “태풍이 지나간 들 / 주저앉아 버린 벼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 대여섯 포기를 함께 모아 혼자서는 일어서지 못하는 벼들이 서로를 의지해 일어서는 들판”이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도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