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까지 여러 회에 걸쳐 송서와 시창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해 왔다. 송서는 책을 읽되, 음악적으로 고저를 넣어 읽는 형태이고, 시창은 한문으로 지은 시(詩)를 노래하는 지식인 계층의 소리라는 점, 현재 서울시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전국 시(市), 도(道)의 무형문화재로 확대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가문화재, 세계무형유산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서울시는 송서의 책읽기 운동이나 시창의 시 읊기 운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각 문화원 교양강좌의 개설이나, 경연대회의 주최, 구청별 시범학교의 선정 및 운영방안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또한 책읽기나 노래 부르는 방법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심성이 황폐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어린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책읽기 지도가 중요하다는 점, 책을 읽되, 송서나 율창 형태의 독서생활화가 필요한 현실이란 점도 이야기 하였다. 이번 주에는 고 묵계월 명창의 타계 5주기 추모음악회 이야기로 이어간다. 경기소리 예능보유자 임정란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며 정성껏 준비한 음악회가 지난 3월 28일 저녁, 국립국악원 예악당 무대에서 <예맥 그를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궁중음악의 수제천과 같은 불규칙 장단, 그리고 무장단으로 불러 나가는 송서ㆍ 율창에서의 숨자리와 교감(交感)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교감이란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세계로 오랜 경험을 축적해 온 연주자들의 감각이 아니고는 이러한 연주나 제창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제까지 수차에 걸쳐 송서나 시창이 어떤 장르의 성악이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소리인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우선, 느린 박자로 부르는 무장단의 소리라는 점, 하나의 악구가 숨의 단위가 되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소리라는 점, 창법은 깊은 소리를 내는 육성(肉聲)과 고음의 가성(假聲)창법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 선율 형태는 장인굴곡의 가락과 다양한 시김새를 구사하고 있는 점 등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조창의 형태와 유사한 노래임으로 단순히 타인의 소리를 듣고 따라 부르기만 되는 노래가 아니라, 정가의 창법이나 호흡법을 익혀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시창은 한문으로 지은 시(詩)를 노래하는 것으로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나 의미를 이해하고 난 뒤에 불러야 하기에 누구나의 접근이 용이치 않았던 지식인 계층의 가락이었던 것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오늘은 음력 3월 3일 삼짇날이다. 고려시대에는 9대 ‘속절(俗節)’이라 하여 명절의 하나로 지냈으며, 강남갔던 제비오는날, 삼질(삼짇날의준말), 삼샛날, 여자의날(女子), 삼중일(三重日), 삼진일(三辰日), 상사일(上巳日), 상제(上除), 원사일(元巳日), 중삼일(重三日), 답청절(踏靑節, 들에 나가 풀을 밟는 풍습의 날), 계음일(禊飮日, 액막이로 모여 술을 마시는 날) 같은 이름으로도 불렸다. 양의 수 3이 겹치는 삼짇날은 파릇파릇한 풀이 돋고 꽃들이 피어 봄기운이 완연하기에 이날은 봄에 걸맞는 모든 놀이와 풍속이 집중되어 있다. 삼짇날은 9월 9일에 강남으로 갔던 제비가 옛집을 찾아와서 추녀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치며, 꽃밭에는 나비도 날아든다. 이날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놀러 가는데, 이를 ‘화류놀이’, ‘화전놀이’, ‘꽃놀이’ 또는 ‘꽃다림’이라고 하며, 대개 비슷한 연배끼리 무리를 지어 가서 화전을 비롯한 음식들을 먹고 하루를 즐긴다. 또 이날 절에 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기도 한다. 삼짇날의 세시풍속, 각시놀음과 제비집손보기 해마다 3월이 되면 여자아이들은 각시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요ㆍ이불ㆍ베개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박자가 아닌, 또 다른 시간의 단위로 <숨>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호흡은 비단, 정가나 민요, 송서ㆍ율창, 등 일부 성악에서만 강조되는 음악적 조건은 아니라는 점, 기악합주곡에도 해당되며 특히 <수제천>과 같은 불규칙 장단으로 이어가는 연주에서는 매우 중요한 음악적 요소라는 점, 송서나 율창도 박자와 장단이 불규칙적이어서 『숨자리』, 곧 호흡의 약속은 창자들 사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앞에서 예를 든 수제천과 같은 불규칙적인 장단구조를 지닌 악곡들이나 또는 송서ㆍ율창과 같이 무(無)장단으로 이어지는 성악이나, 또는 춤에 있어서 숨을 쉬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숨자리가 하나의 악구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수제천 한 장단의 소요시간을 예로 들면, 가장 빠르게 연주되는 장단은 약 40초, 제일 느리게 연주되는 장단은 49초 정도로 <쌍-편>, <편-고>, <고-요>, <요-쌍> 간의 시간이 매 장단 다르다. 이처럼 일정한 박자에 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선율을 시작하고 맺을 수 있는 것은 호흡, 곧 한 장단을 몇 숨에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송서나 시창의 음악적 분위기는 정가와 유사하나, 가성(假聲-falsetto)창법을 허용하는 점에서 보면 시조나 가사창과 가깝다는 점, 가성창법이란 속소리를 쓰는 변칙의 창법으로 남창가곡에서는 금기시 된 창법이란 점, 발음법에서도 하노라, 하여라, 하느니, 등은 모두 허노라, 허여라, 허느니, 등의 음성모음으로 바꾸어 장중미를 강조한다는 점, 송서나 시창의 불규칙 장단과 악구(樂句)의 단락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호흡, 즉 <숨자리>라는 점, 등을 이야기를 하였다. 호흡은 비단 정가나 민요, 송서, 율창, 등 일부 성악에서만 강조되는 음악적 조건은 아니다. 성악 전반은 물론이고, 기악합주곡에서도 매우 중요한 음악적 요소이다. 특히 장단의 흐름이 일정치 않은 음악에서의 호흡은 그 중요성이 배가된다고 하겠다. 한국의 대표적인 악곡으로 널리 알려진 <수제천>이란 궁중음악이 있는데, 이 곡이 바로 불규칙 장단으로 이어가는 대표적인 음악이다. 원래의 이름은 정읍(井邑)으로 백제의 정읍사와 관련이 있으나 조선조 후기로 내려오면서 가사는 잃고 관악합주곡으로 전해오고 있다. 이 악곡의 악기 편성은 피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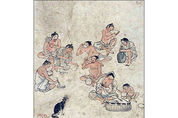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오늘은 24절기의 넷째 춘분(春分)입니다. 이날 해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적도를 통과하는 점, 곧 황도(黃道)와 적도(赤道)가 교차하는 점인 춘분점(春分點)에 이르렀을 때여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가 진 뒤에도 얼마간은 빛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낮이 좀 더 길게 느껴집니다. 춘분 무렵엔 논밭에 뿌릴 씨앗을 골라 씨 뿌릴 준비를 서두르고, 천둥지기 곧 천수답(天水畓)에서는 귀한 물을 받으려고 물꼬를 손질하지요. 옛말에 ‘춘분 즈음에 하루 논밭을 갈지 않으면 한해 내내 배가 고프다.’고 하였습니다. 또 춘분은 겨우내 밥을 두 끼만 먹던 것을 세 끼를 먹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지금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하루 삼시세끼를 먹지만 예전엔 일을 하지 않는 농한기 겨울엔 세 끼를 먹는 것이 부끄러워 점심은 건너뛰었지요. 여기서 “점심(點心)”이란 말은 아침에서 저녁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에 먹는 곧 허기가 져 정신이 흐트러졌을 때 마음(心)에 점(點)을 찍듯이 그야말로 가볍게 먹는 것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때, 일꾼들의 배를 주릴 수 없었기에 세 끼를 먹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밖에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앞에서 시창(詩唱)과 시조창(時調唱)은 박자가 느리며, 장중한 창법으로 부르는 것이 비슷하고, 각 구성음의 기능, 곧 요성(搖聲)이나 퇴성(退聲)의 자리가 동일하며, 시조창이나 12가사에 나오는 가락들이 시창에도 보이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시창과 시조, 양자가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노랫말인 시(詩)가 다르다는 점, 곧 시창은 7언의 한시이고, 시조는 3장 형식의 시조시란 점이다. 송서와 율창(시창)을 주전공으로 공부하면서 호흡과 소리의 기본이 튼튼해졌다는 이송미양은 한자 풀이를 통해 시의 의미를 되새기고, 발음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특히, 발성을 통해 호흡의 안정, 공명, 역동성의 유지가 가능해 졌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번 주에는 시창의 음악적 분위기와 악구의 단위를 결정하는 숨 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다. 송서나 시창의 창법을 관심있게 살펴보면 그 음악적 분위기가 흡사 가곡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영락없이 시조창을 부르는 듯하기도 하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12가사의 한 부분을 듣는 듯 같아서 마치 정가의 음악적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점을 느끼게 된다. 시조창이나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시창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경포대, 만경대의 앞부분 소개와 함께 촉석루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촉석루>라는 한시를 시창으로 옮기는 소리꾼들이 많다는 점, 시조시가 창으로 부르기 위해 지어진 것처럼, 시창의 경우도 부르기 위해 한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촉석루>의 구성음은 黃(황, 솔)-仲(중, 도)-林(임, 레)-南(남, 미)의 4음과, 옥타브 위로 潢(황, 솔)-㳞(중, 도)-淋(임, 레)의 3음이어서 7음의 구성이란 점, 장단에 맞추지 않고 자유스럽게 숨으로 단락을 짓고 있는 점은 시조창과 구별된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다. 시창과 시조창은 서로 어떻게 구별되고,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시창과 시조, 양자가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노래말인 시(詩)가 다르다는 점이다. 곧 시창은 7언의 한시이고, 시조는 3장 형식의 시조시를 노랫말로 쓰고 있어 서로 다르다. 노랫말 이외에 음악적으로도 다른 듯 보이지만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얼핏 들으면 분간이 어렵기도 한 것이 시창과 시조이다. 나는 오래전에 「시조음악의 일반적 특징」이란 논문에서 평시조 음악은 黃(E♭)-仲(A♭)-林(B♭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오늘은 24절기의 셋째 '경칩(驚蟄)'이다. 경칩은 놀라다는 ‘경(驚)’과 겨울잠 자는 벌레라는 뜻의 ‘칩(蟄)’이 어울린 말로 겨울잠 자는 벌레나 동물이 깨어나 꿈틀거린다는 뜻이다. 만물이 움트는 이날은 예부터 젊은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씨앗을 선물로 주고받고 날이 어두워지면 동구 밖에 있는 수나무 암나무를 도는 사랑놀이로 정을 다졌다. 그래서 경칩은 토종 연인의 날이라고 얘기한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임금이 농사의 본을 보이는 ‘적전(籍田)’을 경칩이 지난 뒤의 ‘돼지날 (해일, 亥日)’에 선농제(先農祭)와 함께 하도록 했으며, 경칩 이후에는 갓 나온 벌레 또는 갓 자라는 풀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을 놓지 말라는 금령(禁令)을 내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 고대 유가의 경전 《예기(禮記)》 「월령(月令)」에도 “이월에는 식물의 싹을 보호하고 어린 동물을 기르며 고아들을 보살펴 기른다.”라고 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경칩에 개구리 알이나 도룡뇽 알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였으나 어린 생명을 그르치는 지나친 몸보신은 금해야만 한다. 또 단풍나무나 고로쇠나무에서 나오는 즙을 마시면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 회에는 7언(言) 1구(句)의 한문시는 곳곳에서 볼 수 있으나 그 의미를 알기 어렵고, 시창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점, <송서ㆍ율창>의 보존회원들이나 <글 읽는 나라 문화제전>에 참가하고 있는 남녀노소 경창자들이 부르고 있다는 점, 한시의 암기는 창을 통해 가능한데, 창의 효과가 바로 시창이나 율창, 송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란 점을 얘기했다. 제3회 글 읽는 나라 문화제전에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한 김형주 수상자는 깊은 내용 위에 가락을 얹어 부르면 마치, 하늘의 신선이 된 기분이라는 소감과 미래 시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며, 그 아름다운 가락은 정서적으로 차분해 져서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음악치료로도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벽파의 가창대계에 소개되어 있는 시창에는 경포대, 만경대, 촉석루, 만류무민, 영풍, 신추, 관산융마,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 예능보유자, 유창이 발매한 음반 속에는 영남루, 강능경포대, 죽서루, 효좌, 사친, 영풍, 만경대, 개천절노래 등이 담겨 있어 다양한 시창이 다양한 가락으로 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