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 이야기 한 율창과 시창은 한시(漢詩)를 율조(律調)에 올려 부르는 노래로 송서, 시창, 율창 등은 모두 소리를 내어 글을 읽는 독서성이나 낭송에서 출발하였다는 점, 판소리 춘향가에 나오는 어사가 된 이몽룡이 변사또의 잔치상에 들어가 지어 부른 -금준미주천인혈(金樽美酒千人血), 옥반가효만성고(玉盤佳肴萬姓膏), 촉루락시민루락(燭淚落時民淚落), 가성고처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의 7언4구는 유명한 시창이란 점을 얘기했다. 이 시는 조선조 광해군 때 성이성이 지었다고 하는데, 이는 명나라에서 온 사신의 시를 고쳐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는 점, 벽파는 <관산융마(關山戎馬)>를 서도식 율창(律唱)이라 불렀는데, 이는 높은 청으로 속소리를 내며 비애조(悲哀調)가 섞인 서도지방의 시창이기 때문에 일반 시창과 구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7언(言) 1구(句)의 한문시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전통가옥에는 거의 예외 없이 보이고 있으며, 그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글을 읽거나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더욱이 그 시의 의미를 이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송서 중에서 삼설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삼설기는 송서의 입문곡처럼 알려진 대표적인 소리제로 묵계월이 1930년대 중반, 이문원으로부터 배웠고, 이를 다시 유창에게 전해준 소리로 그 내용은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진리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 또 송서의 창법은 정가와 유사하며, 느린 한배나 호흡으로 길게 끄는 가락이나, 요성의 형태, 또는 장식음 등이 정가의 음악적 분위기를 느끼게 된다는 점, 송서와 율창은 박자라든가 장단의 형태는 논하기 어려우며, 악구(樂句)의 시작과 맺음을 호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마치 궁중음악의 수제천과 같이 장단이 불규칙하지만, 오랫동안 호흡을 맞추어 온 연주자들은 능숙한 연주로 청중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말했다. 이번주에는 시창(詩唱), 혹은 율창(律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시창이나 율창은 한시(漢詩)를 긴 가락에 올려 읊는 형태를 말한다. 율창이란 말에서 율(律)은 음(音)을 뜻하는 말이라 하겠다. 곧 율려(律呂)로 음의 높고 낮은 고저를 의미한다. 또한 시창은 시(詩)를‘읊조린다’, ‘노래한다’는 의미이니, 시(詩)에 고저를 넣어 부르는 형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오늘은 한해 가운데 보름달이 가장 크고 밝다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은 예부터 사람과 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화합하고 한 해 동안 이루어야 할 일을 계획하고 비손하며 점쳐보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동국세시기》에 "정월대보름 초저녁에 횃불을 들고 높은 곳에 올라 달맞이하는 것을 망월(望月)이라 하며, 먼저 달을 보는 사람이 운수가 좋다."고 하여 이날은 남녀노소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며 저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정월대보름 무렵에 하는 세시풍속으로는 ‘망월’ 말고도 더위팔기(賣暑), ‘다리밟기(踏橋)', ’부럼 깨물기‘, ’줄다리기‘, ’복토 훔치기‘, ’용알 뜨기‘,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복토 훔치기”는 부잣집의 흙을 몰래 훔쳐다 자기 집의 부뚜막에 발라 복을 비손합니다. 또 “용알 뜨기”는 대보름날 새벽에 가장 먼저 우물물을 길어오면 그해 운이 좋다고 믿었던 재미난 풍속이지요. 정월대보름엔 세시풍속 말고도 여러 가지 명절음식 곧 약밥, 오곡밥, 복쌈, 진채식(陳菜食), 귀밝이술 따위를 먹었습니다. 먼저 약밥은 찹쌀을 밤, 대추, 꿀, 기름, 간장들을 섞어서 함께 찐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겨우내 참았던 그리움이 실핏줄로 흘러 버드나무 가지마다 저리 파란 물이 들었구나 강나루 얼음 풀리면 그대 오시려나 코끝을 스치는 바람 아직은 맵지만 내 마음은 벌써 봄 원영래 시인의 시 <우수>입니다. 올제(내일)은 24절기 둘째인 우수(雨水)입니다. 우수는 말 그대로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뜻인데 이름에 걸맞게 봄비가 내리곤 합니다. 어쩌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은 봄비와 함께 꿈을 가지고 오는지도 모르지요. 그 봄비가 겨우내 얼었던 얼음장을 녹이고, 새봄을 단장하는 예술가인 것입니다. 기상청의 통계를 보면 지난 60년 동안 우수에는 무려 47번이나 비가 왔다고 하니 이름을 잘 지은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일부러 이날 비를 주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수 때 나누는 인사에 "꽃샘잎샘에 집안이 두루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이 있으며 "꽃샘잎샘 추위에 반늙은이(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속담도 있지요. 이 꽃샘추위를 한자말로는 꽃 피는 것을 샘하여 아양을 떤다는 뜻을 담은 말로 ‘화투연(花妬姸)’이라고도 합니다. 봄꽃이 피어나기 전 마지막 겨울 추위가 선뜻 물러나지 않겠다는 듯 앙탈을 부려보기도 하지만 봄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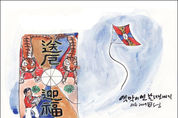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눈이 내리면 소년은 연을 날렸다. / 산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지면 / 더욱 높이 띄웠다. 팽팽한 연실을 곱은 손으로 / 움켜쥐고 실을 풀거나 당기면서 연과 이야기했다. / 연이 공중바람을 타고 높디높게 오르면 연실이 모자랐다.” 신영길 시인의 <나는 연 날리는 소년이었다> 시 일부입니다. 여기서 연(鳶)은 종이에 가는 댓가지를 붙여 실로 꿰어 공중에 날리는 놀이 용구인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날려 왔지요. 그런데 한국의 연 특히 방패연은 그 형태와 구조면에서 다른 나라의 연과 달리 방구멍이 잇는 매우 과학적인 구조입니다. 이 방구멍은 맞바람의 저항을 줄이고, 뒷면의 진공상태를 메워주기 때문에 연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연을 높이 띄우거나 그림, 모양 등에 관심을 두는 중국, 일본 등의 연과는 달리 한국의 연은 연을 날리는 사람이 다루는 것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기, 급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기는 물론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연은 연 날리는 사람에 의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서 연싸움(연줄 끊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세 번째 열린 <글 읽는 나라 문화제전>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 전국에서 많은 경창자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이 제전은 2018년 서울특별시가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사업 민간축제로 선정한 행사였다는 점, <명인부>, <일반부>, <단체부>, <학생부>, <신인부> 등으로 구분되며 단체부와 신인부 경연자들이 많아 축제의 분위기를 살렸다는 점, 명인부는 해당종목의 이수자, 일반부는 전수생들이 참가하는데, 암기수준이나 발음, 창법, 호흡처리 등이 수준급이었다는 점, 특히 초, 중학생들이 한문을 정확하게 읽고 고저를 구별해 내는 실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얘기했다. 타 대회와는 달리, <계자제서(戒子弟書)>를 부름으로 경연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세상을 살면서 삼가고 경계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글이라는 점, 경연마당의 출전자들은 주로 삼설기(三說記), 계자제서(戒子弟書), 명심보감(明心寶鑑), 권학문(勸學文) 주자훈(朱子訓), 촉석루(矗石樓), 등왕각시(滕王閣詩), 매일생한불매향(梅一生寒不賣香) 등을 불렀으며, 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우리 겨레는 설날 아침이면 일찍이 남녀노소가 설빔으로 갈아입고, 차례를 지낸 뒤에 할아버지ㆍ할머니, 아버지ㆍ어머니 등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한 다음 일가친척과 이웃어른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엔 직장인들은 회사 윗사람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조선시대엔 새해 초에 대문 앞에 세함(歲銜)을 두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홍석모(洪錫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각사의 서리배와 각영의 장교와 군졸들은 종이에 이름을 적어 높은 관원과 선생의 집에 들인다. 문 안에는 옻칠한 소반을 놓고 이를 받아두는데, 이를 세함(歲銜)이라 하며, 지방의 아문에서도 이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양(漢陽)의 세시풍속에 대해 쓴 책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에 따르면, 설날부터 정월 초사흗날까지는 승정원과 모든 관청이 쉬며, 시전(市廛) 곧 시장도 문을 닫고 감옥도 비웠다고 합니다. 이때는 서울 도성 안의 모든 남녀들이 울긋불긋한 옷차림으로 왕래하느라고 떠들썩했다고 하며, 이 사흘 동안은 정승, 판서와 같은 높은 관원들 집에서는 세함만 받아들이되 이를 문 안으로 들이지 않고 사흘 동안 그대로 모아 두었다고 하지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책읽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송서ㆍ율창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소리를 내어 음악적으로 읽는 방법이야말로 오래 읽는다 해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뿐더러 암기에도 효과적이란 점, 서울시 문화재로 <송서와 율창>을 지정한 것은 훌륭한 결정이지만,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해당 종목이 저절로 보존, 계승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열의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다. 그 가운데서도 송서ㆍ율창 분야는 전승자의 층이 엷어서 진승구조가 취약하다는 점, 이러한 종래의 인식을 뒤엎고, 송서ㆍ율창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보유자와 보존회원들은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왔다는 점, 그 대표적인 활동들이 전국국악학 학술대회를 통한 학술적 가치의 확보, 정기 비정기 공연활동을 통한 관객확보, 보다 쉽고 재미있는 새로운 음반의 제작, 보존회의 확장을 통한 전승자의 교육, 2회에 걸쳐 개최했던 송서ㆍ율창 경연대회 등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지난주에 이어 <글 읽는 나라 문화제전> 관련 이야기들을 계속하기로 한다. 세 번째 맞이한 경연에는 전국에서 참가한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열린 퉁소 신아우보존회의 두 번째 정기 연주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퉁소 신아우는 함경남도가 무형문화재(보유자 - 동선본)로 지정한 종목이며 인접지역인 강원도 인제군 원통에서 연주회를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 분단 이후 퉁소 음악이 위기에 처하자, 뜻있는 국악인들이 한국퉁소연구회를 결성, 단절의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했다. 퉁소는 과거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연주되었지만, 남쪽보다는 북쪽이 더더욱 활발했으며 연주회는 거문고와 퉁소의 2중주, 김진무의 함경도 민요창, 퉁소 음악과 북청의 사자놀음 등이 청중의 호응을 받았다는 이야기, 평안도 황해도의 서도소리가 인천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처럼, 함경도의 퉁소나 신아우 음악은 그 아랫마을인 강원도에서 보존, 전승해 나가다가 함경도 지방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종로구 있는 조계사 내의 한국불교역사 문화기념관에서는 송서ㆍ율창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공식명칭은 <글 읽는 나라 문화제전>이었다. 국민 모두가 글을 읽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듯한 행사여서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제5회 벽파 대제전에서 대상에 오른 홍주연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녀는 “선소리 산타령을 활용한 유아교육을 위한 교수법”이란 논문을 작성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산타령을 유아교육에 접목시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예사롭지도 않지만, 현장 실습의 경험이 없으면 다루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다는 점, 음악학습은 조기에 시작 되어야 한다는 코타이 교수법을 응용해서 민요를 다루되, 노래의 억양이나, 귀에 익숙한 음악적 요소들의 학습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는 점을 얘기했다. 또 산타령으로 유아의 창의성, 인지 발달의 감성, 언어의 활용, 장단과 발림, 리듬감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그 결과 산타령은 학교, 직장,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 정신에 따른 협동심과 사회성의 증진을 꾀할 수 있는 노래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아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놀이중심의 음악 교육용으로 산타령의 활용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지도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이번 주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열린 퉁소 신아우 두 번째 정기 연주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