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지난주에는 젊은 국악인들이 조직한 <민속악회 정(正)> 이란 그룹의 창단연주회를 소개하였다. 현대감각이란 명분아래 전통음악의 뿌리가 점점 허약해져 가고 있는 공연계를 바라보며 의기투합하여 악단을 조직하였고, 삼성동 소재, 한국문화의 집(Kous)에서 창단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악자위동(樂者爲同)’이란 음악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하나같이 같게 만든다는 의미로 이는 신분이 다른 사회 구성원을 음악을 통해서 상호 조화의 길로, 화합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음악이 해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남과 북이 총부리를 겨눌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나와 아리랑을 부르는 것이 화합의 길로 더 빨리 달려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예(禮)가 구분해 놓은 인간과 인간의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바로 음악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음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전하면서 젊은 국악인들이에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이번 주에는 김수연의 판소리보존회 발표시, 특별출연을 해서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왕기석 일행의 토막창극 <화초장>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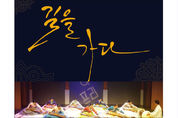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지난주에는 경기도 과천시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경기소리보존회>가 마련한 제15회 정기공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다. 국악공연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해 보고자 동 보존회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왔는데, 대체적으로 좌창형태의 긴소리를 동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반주형태의 확대 편성과 창자가 가야금을 연주하며 부르는 병창의 형태, 그리고 소리극 형태의 작업 등이다. 소리극 가운데서는 대동가극단의 맥을 이어가려는 열정이 남다른데, 그 까닭은 1930년대 중반, 경기도 과천 찬우물 마을에 살던 임종원이 창단하였다는 점, 일제치하에서 억압받고 있던 동포들에게 항일정신을 고취시켜 민족의 단합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던 단체였다는 점을 얘기 했다. 또 과천 출신의 임상문, 임종선, 임세근, 임명옥, 명월 자매 등 임정란의 집안으로 선대의 예술혼을 오늘에 이어가려 하는 정신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번 공연은 15개 지부 1,000명의 회원들의 힘과 뜻이 담겨 있고, 내년으로 도래한 경기 천년의 해를 맞아 경기소리의 음악적 특색을 들어내는 무대였다는 이야기를 말했다. 선유가(船遊歌)를 가야금병창의 형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지난주에는 홍성에서 개최된 역사인물축제 이야기와 <제13회 홍성 가무악 전국경연대회>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 홍성이 낳은 역사적인 인물, 6인을 선정하여 이들의 업적이나 나라사랑 정신을 영원히 기리자는 의미를 축제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 인물 6인은 고려의 명장 최영 장군을 비롯하여 성삼문, 김좌진, 한용운, 한성준, 이응로 화백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로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문(文)과 무(武), 그리고 예(藝)에서 장식했던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역사인물 축제와 연계되어 열린 제13회 <전국 가무악전국대회>는 국악의 신진을 발굴하는 등용문으로 손색이 없는 대회로 평가된다는 이야기, 홍성을 찾은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음악이나 전통춤에 대한 인식을 더욱 넓혀 주었었다는 이야기, 분야의 확대를 고려하기 바란다는 주문과 함께 100세 시대에 걸맞은 노인부를 반드기 신설해 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 앞으로 홍성의 역사인물축제와 병행되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대표적인 형태의 축제라는 점에서 상당부분 탄력을 받게 될 대회여서 기대가 모아진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이번 주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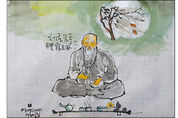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오늘은 24절기의 열여덟째 “상강”입니다. “상강(霜降)”은 말 그대로 수증기가 땅 위에서 엉겨 서리가 내리는 때며, 온도가 더 낮아지면 첫 얼음이 얼기도 하지요. 벌써 하루해 길이는 노루꼬리처럼 뭉텅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면 하룻밤 새 들판 풍경은 완연히 다른데 된서리 한방에 푸르던 잎들이 수채색 물감으로 범벅을 만든 듯 누렇고 빨갛게 바뀌었지요. 옛 사람들의 말에 “한로불산냉(寒露不算冷),상강변료천(霜降變了天)”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한로 때엔 차가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상강 때엔 날씨가 급변한다.”는 뜻입니다. 이즈음 농가에서는 가을걷이로 한창 바쁘지요. 〈농가월령가〉에 보면 “들에는 조, 피더미, 집 근처 콩, 팥가리, 벼 타작 마친 후에 틈나거든 두드리세……”라는 구절이 보이는데 가을걷이할 곡식들이 사방에 널려 있어 일손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 "가을 들판에는 대부인(大夫人) 마님이 나막신짝 들고 나선다."라는 말이 있는데, 쓸모없는 부지깽이도 요긴하고, 바쁘고 존귀하신 대부인까지 나서야 할 만큼 곡식 갈무리로 바쁨을 나타낸 말들이지요. 갑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지난주에는 김세종제의 춘향가를 김수연에게 전수해 준 성우향 명창과 성우향에게 전해 준 정응민 사범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성우향은 국가지정 문화재 제5호 판소리(춘향가)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친 명창으로 특히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다는 점, 판소리를 배우기 이전에 가곡과 시조를 배워서 긴 호흡이나 힘찬 발성, 소리의 역동성이 돋보이는 명창이었다는 점, 스승 정응민의 영향을 받아 바른 마음(正心), 정직한 소리(正音), 지나치지 않는 몸동작이나 연기를 강조했다는 점, 이러한 판소리 관(觀)은 정응민-성우향-김수연에게 이어졌기에 김수연은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소리꾼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말했다. LA문화원에서 기념 공연을 할 때나, 또는 라스베가스로 가는 사막 중간에 한국인 식당에서 김수연의 <흥타령>을 듣고 흥과 감동,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관광객이나 동포들이 많았다는 이야기 등도 덧붙였다. 전승계보가 뚜렷하고, 예술적 실연 능력에 있어서도 국내 최정상급 명창으로 인정받고 있는 김수연의 소리를 이제는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줄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관계자들에게 청원한다는 이야기 등을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창극에 대한 이론과 비평이 당세의 독보적인 존재였다는 김세종 명창의 이야기를 하였다. <김세종제 춘향가의 미적(美的)접근>이라는 학술모임에서도 김세종제 춘향가의 전승과정이나 동편소리의 특징으로 통성이나 대마디 대장단, 기교보다는 통목을 쓰는 점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전의 춘향가와는 달리, 양반적 취향이 상당부분 가미되어 사설 내용이 우아해 졌고 섬세해 졌다는 이야기나 시창(詩唱)의 삽입이나 우조(羽調)가 강하게 포함되며 감정의 표출을 자제하는 미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김세종은 동편에 속한 대명창으로 신재효 문하에서 지침을 받아 문견이 고상하고, 문식(文識)이 넉넉하며 창극에 대한 이론과 비평이 당세 독보적인 존재였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특히 김세종은 사설의 이면(裏面)과 형용동작이 사설에 맞도록 적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김세종의 춘향가 소리를 보존해 나가고 있는 모임을 현재 김수연이 이끌고 있는 것이다. 김세종제의 춘향가를 김수연에게 전수해 준 스승이 얼마 전 작고한 성우향 명창이다. 성우향은 국가지정 문화재 5호 판소리(춘향가)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제자들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현재 국악속풀이는 김수연이 이끄는 <김세종제 춘향가보존회> 발표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존회원들의 순서가 진행 중에 찬조 출연한 신영희 명창의 춘향가 중 박석치 대목이 이어졌다. 이 대목은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서 남원에 내려오던 중, 입구의 박석고개에 올라 좌우를 내려다보며 지난날 춘향과의 만남을 회상하는 대목으로 사설이 시(詩)적이다. “박석치 올라서서 좌우 산천을 둘러보니 산도 옛 보든 산이요, 물도 옛 보든 녹수로구나. <중략> 광한루야 잘 있으며 오작교도 무사트냐?” 신영희 명창은 근세 한국을 대표하던 김소희 명창의 수제자로 국가문화재 예능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그는 판소리 북을 들고 대중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판소리를 널리 알리고 대중화 하는데, 일조를 한 명창으로 유명하다는 점, 그는 극장 무대가 크든, 작든 간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통성으로 부르는 명창으로 또한 유명하다는 점을 얘기했다. 또 김수연의 강습생들이 부른 옥중(獄中)가, 쑥대머리 대목은 임방울(1905~1961)에 의해 유명해졌다는 점, 김수연의 큰 제자들이 남도민요로 끝을 맺었으나, 객석의 요구로 김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서울 삼성동 소재 한국문화의 집(Kous)에서 열렸던 <김세종제 판소리보존회> 정례 발표회 이야기를 하였다. 김수연 명창을 비롯하여 제자들의 열연과 특별 출연자, 그리고 관객의 호응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발표회였다는 점, 판소리나 경기지방의 긴소리, 가곡이나 가사, 시조와 같은 장르의 노래들은 노랫말이나 사설의 이해가 감상의 성공요인이라는 점,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부르는 단가(短歌)라는 노래는 짧고 간단한 노래로 긴 노래를 부르기 전, 목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점를 얘기했다. 초앞 대목의 ‘기산영수 별건곤 소부 허유 놀고’에서, 기산(箕山)은 중국 하남성에 있는 높고 깊은 산 이름이고, 영수(潁水)는 그 근처에 있는 맑은 강, 이곳에 소부나 허유와 같은 선비들이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고 해서 별천지, 곧 별건곤(別乾坤)이라고 한다는 점, ‘허유’ 선비는 요임금으로부터 임금자리를 맡아 달라는 청탁을 받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며 영수강에 가서 귀를 씻었다고 하고, ‘소부’는 허유가 귀를 씻은 물이라고 소에게 먹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김수연의 수제자인 강경아의 ‘이별가’가 또한 청중들로부터 갈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2017년 9월 13(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삼성동 소재 한국문화의 집(Kous)에서 열렸던 <김세종제 판소리보존회> 정례 발표회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 이 보존회는 성우향의 뒤를 이어 김수연이 이끌고 있으며 문화재 종목의 전승과 보급 활동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무대라는 점, 각 단체에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 또 이 날의 발표회는 김수연 명창과 소속 회원들이 중심이지만, 서영호의 아쟁산조, 판소리 예능보유자 신영희 명창의 <김소희제 춘향가>, 왕기석 일행의 <흥보가 중 화초장>대목의 창극도 곁들여진 발표회였다는 점도 아울렀다. 그뿐만이 아니라 판소리 제곡(諸曲)들은 여러 명창들에게 전해지면서 각각의 특징이 실리고 첨삭되어 더 세련된 모습으로 후대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세종제 춘향가>는 이전의 송흥록으로부터 비롯된 동편제 소리를 더욱 가다듬었다는 점, 김세종제의 춘향가는 김세종, 김찬업, 정응민과 같은 뛰어난 명창들이 짠 것인 만큼, 옛날 명창들의 더늠이 고루 담겨 있고, 조(調)의 성음이 분명하며 부침새,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연변대학 무대에서 인기를 모았던 김병혜 교수, 송효진, 김보배양과 이들이 부른 남도민요 중 <육자배기>와 <뱃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육자배기는 남도의 대표적인 노래로 듣기도 어렵지만, 부르기는 더더욱 어려운 노래라는 이야기, 김병혜는 대학원까지 판소리를 전공한 정통파 소리꾼으로 현재,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판소리 적벽가의 예능보유자였던 정미옥이나 심청가의 성창순으로부터 소리와 인생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했다. 효진과 보배 역시 완창 발표회를 가질 정도로 실력을 갖춘 차세대 명창들로 이들은 지방에서 활동하며 이익 창출의 목표가 아닌, 지역의 문화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공연물을 기획, 제작, 출연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야기,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 <갈대향과 미르지무>, 순천 정원 박람회기간에 셋트장 상설 공연을 기획한 바 있는 <드라마틱> 등 등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다. 또 미국이나 중국교류 공연에 이들 트리오가 참여함으로써 교류회가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전통문화의 해외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며 여기에 참여하는 자신들의 역할이나 존재의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