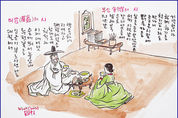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내일은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말뜻 그대로 찬이슬이 맺힌다는 24절기 열일곱째인 한로(寒露)이며, 모레는 우리 겨레가 명절로 지내왔던 중양절(重陽節, 重九)입니다. 한로와 중양절 무렵에는 국화전(菊花煎)을 지지고 국화술을 담가 먹었는데 국화술은 그 향기가 매우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막걸리에 노란 국화를 띄워 마셨지요. 또 이무렵에는 추어탕(鰍魚湯)을 즐겨 먹었습니다. '미꾸라지 추(鰍)' 자를 보면 '가을 추(秋)' 자 앞에 '고기 어(魚)' 자를 붙인 것으로 보아 미꾸라지가 가을이 제철인 물고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초강목》에는 미꾸라지가 양기를 돋우는 데 좋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重陽節), 또는 중구일(重九日)이라 했는데 여기서 중양이란 음양사상에 따라 양수(홀수)가 겹쳤다는 뜻이며, 중구란 숫자 '9'가 겹쳤다는 뜻으로 양수가 겹친 날인 설날ㆍ삼짇날ㆍ단오ㆍ칠석과 함께 명절로 지냈습니다. 신라 때에는 중양절에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모여 시를 짓고 품평을 하는 일종의 백일장을 열었습니다. 또 중양절에는 붉은 수유 열매를 머리에 꽂고 산에 올라 시를 지으며 하루를 즐기는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향당교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향당(鄕唐)이란 말에서 향(鄕)은 향악, 향악곡, 향악기를 지칭하는 말이고, 당(唐)은 당악, 당악곡, 당악기를 아우르는 말이라는 점, 고려시대에는 송(宋)에서 아악과 당악이 유입이 되었는데, 이들은 종래의 향악과 형식, 악기 편성, 장단, 음 높이(Key) 따위에서 다르기 때문에 대칭을 이루었다는 점, 그래서 처음에는 향악과 당악을 교대로 연주하다가 합주의 단계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향당교주는 향당합주라는 의미가 되었다는 점을 말했다. 또 조선조 후기에는 향악기와 당악기의 합주라는 개념에서 무용반주의 악곡 이름처럼 쓰이기 시작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점, 현재는 삼현영상회상의 상령산(上靈山)을 지칭하며 무용반주를 할 때의 별칭이라는 점, 관악 상령산은 박자가 일정치 않은 불규칙 장단형이어서 이를 규칙적인 장단으로 만들고, 가락을 첨가한다는 점이 연주용과 무용반주이 다르다는 점 등을 이야기 하였다. 이번 주에는 김종옥의 정가 모음집 음반 출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 대한시우회(時友會) 성남 지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는 김종옥 사범이 얼마 전 가곡, 가사, 시조 등 5매의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충남 홍성에서 열렸던 <가무악 전국대회> 관련이야기를 하였다. 홍성은 현재 충남의 도청 소재지로 내포문화권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많은 역사 인물이 배출된 곳이다. 예를 들면 국악과 관련해서는 명고수 이면서 승무, 살풀이 등의 명무였던 한성준을 배출한 예향이며 명공 석사나 선비들이 즐겨 부르기도 했던 시조가 널리 불리기도 한 지역이란 점, 현재, 충청남도는 내포제시조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으나 관현악을 비롯하여 지역의 특징을 담고 있는 성악 등, 일반적인 국악의 공연은 활발하지 못해서 전통음악의 불모지가 되어버렸다는 점을 얘기했다. 그럼에도 지역의 예술인들과 유지들이 전통문화의 발굴이나 전승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맥락에서 이 <가무악 전국대회>도 홍성군의 축제와 연계시켜 그 규모를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이 돋보였다는 점, 특히 시상식에 앞서 마련한 특별공연에 국악의 명인, 명창 외에도 학생들이나 젊은 연령층이 선호하는 가수들을 초대해 자연스럽게 전통음악과 군민을 연계한 프로그램도 인상적이란 점 등을 이야기 하였다. 다시 이번 주에는 <향당교주>란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줄다리기는 농경의식의 하나인 일종의 편싸움 놀이입니다. 그 가운데 충남 당진 기지시리에 가면 국가무형문화제 제75호로 지정된 “기지시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는 마을을 뭍(육지)과 바닷가쪽 두 편으로 나누는데 생산의 의미에서 여성을 상징하는 바닷가 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믿었습니다. 줄다리기는 윤년 음력 3월초에 재앙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를 지낸 다음 행해졌지요. 전설에 따르면 기지시리는 풍수적으로 옥녀가 베 짜는 모양이어서 베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시늉을 한데서 줄다리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줄의 길이는 50∼60m이며 지름이 1m가 넘는 경우도 있어 사람이 줄을 타고 앉으면 두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라고 하지요. 또 줄이 커서 손으로 잡아당길 수가 없기 때문에 원줄의 중간 중간에 가늘게 만든 곁줄을 여러 개 매달아 잡아당기기 좋도록 만듭니다. 줄 위에 올라선 대장이 지휘를 하면 줄다리기가 시작되지요. 줄다리기가 끝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칼로 줄을 끊어 가는데 이 줄을 달여 먹으면 요통이나 불임증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줄에 양잿물을 떨어뜨리거나 바늘을 꽂으면 줄이 끊어지고 여자가 줄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낮때와 밤때가 똑 같다 하느니 오면 앗 읽고 달 돋으면 임 생각고 고요히 깊어가는 갈 선비는 졸 닦고 위 노래는 일본 교토의 한밝 김리박 선생이 쓰신 “갈 같 날”입니다. 여기서 ‘갈같날’은 추분(秋分)을 가리키는 토박이말이며, ‘앗’은 책, ‘갈’은 가을, ‘졸’은 지조(志操)를 뜻합니다. 조금 쉽게 풀어본다면 “추분은 낮과 밤이 똑 같다 하느니 / 추분 오면 책 읽고, 달 돋으면 임 생각나는 때라 / 고요히 깊어가는 가을, 선비는 지조를 닦고 있어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분은 낮과 밤이 같다고 하는데 춘분과 함께 바로 “더함도 덜함도 없는 날”이어서 우리는 이때 중용(中庸)을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세상일이란 너무 앞서가도 뒤쳐져도 안 되며, 적절한 때와 적절한 자리를 찾을 줄 아는 것이 슬기로운 삶임을 추분은 깨우쳐 줍니다. 더불어 가을 벌판 고개 숙이는 벼가 보여주는 겸손, 그리고 한여름 강렬한 햇빛과 천둥과 비바람을 견디어낸 벼의 향[香]를 생각해볼 때입니다.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산타령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는 최창남 명창의 경서도 소리공연 이야기를 하였다. 평생을 무대에서, 방송국에서, 전수교육장에서 후진들을 키워오며 살아온 80을 넘긴 고령의 최명창이 해마다 제자들과 함께 소리판을 꾸준히 열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노테크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 대형 국악공연을 기획해서 흥행 공연을 많이 했던 김뻑국씨에 따르면 “국악계 누구, 누구 온다고 해도 최창남 빠지면 지방공연은 계약이 성사되기 힘들었다”는 경험담도 소개하였다. 최창남은 황해도에서 인천으로 내려와 정착을 했고, 그곳에서 민형식을 위시하여, 신경문, 김추월, 양소운, 임명옥, 최경명 등 당대 이름을 날리던 서도 명창들에게 수심가, 사설방아타령, 산염불, 난봉가 류의 소리를 익혔다는 이야기, 이은관의 소개로 벽파 이창배 명인을 만나 시조며 가사, 좌창, 입창, 민요, 등 경서도 소리 전 바탕도 배웠다는 이야기, 그의 소리속에는 굳세고 부드러운 강유(剛柔)와, 밝고 어두운 명암(明暗)이 교차하고 있으며 진하고 옅은 농담(濃淡)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현란한 기교들이 숨어있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이번 주 속풀이에서는 지난 9월 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내일은 우리 겨레의 가장 큰 명절 한가위입니다. 이 한가위에는 여러 가지 세시풍속이 전해 오는데 그 세시풍속 가운데 민속놀이는 강강술래, 줄다리기, 가마싸움, 소놀이, 거북놀이, 밭고랑기기, 원놀이, 올게심니, 소싸움, 닭싸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밭고랑기기”는 전남 진도에서 전해지는 것인데 한가위 전날 저녁에 아이들이 밭에 가서 발가벗고, 자기 나이대로 밭고랑을 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고 밭농사도 잘된다고 믿었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거북놀이”입니다. 거북놀이는 수수 잎을 따 거북이 등판 마냥 엮어 이것을 등에 메고, 엉금엉금 기어 거북이 흉내를 내는 놀이지요. 이 거북이를 앞세우고 “동해 용왕의 아드님 거북이 행차시오!”라고 소리치며, 풍물패와 함께 집집이 방문하는데, 대문에서 문굿으로 시작하여 마당, 조왕(부엌), 장독대, 곳간, 마굿간, 뒷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들보 밑에서 성주풀이를 합니다. 이때 조왕에 가면 “빈 솥에다 맹물 붓고 불만 때도 밥이 가득, 밥이 가득!” 마구간에 가면 “새끼를 낳으면 열에 열 마리가 쑥쑥 빠지네!” 하면서 비나리(걸립패가 마당굿에서 잘 되기를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지난 속풀이에서는 9월 8일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황용주 명인의 예악생활 60주년 기념공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평생 선소리 산타령을 부르면서 살아온 황용주(黃龍周) 명인이 인생 80을 맞아 제자들과 더불어 장충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산타령 외 경기소리 전 분야를 공연하면서 핫 에이지(Hot Age)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는 이야기, 여럿이 대형을 갖추며 놀량-앞산타령-뒷산타령-자진산타령 등을 연이어 부르는 입창(立唱)형식의 산타령은 답교(踏橋)놀이의 단골 메뉴였다는 이야기, 그 대표적인 예가 ‘살고지다리’의 정월 대보름 축제라는 이야기, 그러나 안타깝게도 변화의 물결은 전문 선소리패들의 연창(演唱)을 단절시켜 유명 소리패들의 공연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행이 1960대 후반, 《산타령》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그 명맥이 오늘에 이어졌다는 이야기, 그러나 산타령의 전문가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서 자생력이 약한 종목으로 남아 있으므로 전승을 위한 특별배려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청도 비인기 종목에 대한 특별 육성책을 강구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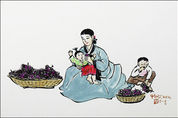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오늘은 24절기 열다섯째로 흰 이슬이 내린다 하는 백로(白露)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때만 되면 편지 앞머리에 “포도순절(葡萄旬節)에 기체후 일향만강(氣體候一向萬康) 하옵시고”라는 인사를 꼭 넣었습니다. 그것은 포도가 제철인 때 곧 백로부터 추분까지의 절기에 어른에게 안녕하신지 묻는 것입니다. 포도는 예부터 다산(多産)의 상징으로 생각해서 맨 처음 따는 포도는 사당에 고사를 지낸 다음 그 집 맏며느리가 통째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포도를 먹으면 망측하다고 호통을 들었지요. 또 이때쯤 되면 ‘포도지정(葡萄之精)’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포도를 먹일 때 한 알 한 알 입에 넣고 씨와 껍질을 발라낸 뒤 아이의 입에 넣어주던 정을 일컫습니다. 누구나 어렸을 땐 어머니의 지극 정성한 공으로 자라건만 다 자라면 저 홀로 자란 듯 부모의 은공을 잊고 때론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세상이어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백로 때는 밤 기온이 내려가고, 풀잎에 이슬이 맺혀 가을 기운이 완연해집니다. 원래 이때는 맑은 날이 계속되고, 기온도 적당해서 오곡백과가 여무는데 더없이 좋은 때입니다.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내리쬐는 하루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명예교수] 흔히, 은퇴 후 30년의 시기를 핫 에이지(Hot Age)라고 한다. 열정을 갖고 일하는 시기라는 뜻이다. 보통 60살 안팎에 은퇴하게 되는데, 그로부터 30년 뒤인 90살 전후가 이 시기에 속하는 것이다. 실제로 90, 또는 100살을 넘긴 노인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쓰고, 자기가 평소 하고 싶어 하던 일을 마음껏 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된다. 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 70, 80살의 노인에게도 열정이 있다면 마음은 청춘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 평생 선소리 산타령을 부르면서 살아온 황용주(黃龍周) 명인이 인생 80을 맞아 제자들과 더불어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 특설무대에서 오후 2시부터 기념공연을 갖는다고 한다. 그야말로 열정을 지니고 핫 에이지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어서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사람이 외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은 법인데, 그것도 10년이나 20~30년도 아니고 60년을《산타령》을 부르며 살아왔으니 그가 후학들로부터 존경과 축하를 듬뿍 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보람차고 자랑스러운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