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세상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出家)라 한다. 그리움도 버리고 인연도 끊었기에 출가한 줄 알았다. 하지만 보이는 게 온통 세상사이거늘 어쩔 것인가. 이슥토록 기울이는 술잔 위로 학조차 비껴가는구나! <상선약수> 소책자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온통 고통스럽고 복잡한 세상에 이슥토록 기울이는 술잔 위로 학조차 비껴간단다. 또 “한국춤의 특성으로 꼽히는 멋과 한과 흥의 결정체가 ‘한량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춤의 근원은 불가에서 말하는 방하착의 수행과 맞닿아 있다. 마음을 내려놓는 일로부터 슬픔과 즐거움, 인생의 무상과 유상, 흥취와 정취가 유발된다. 그뿐만 아니라 죄고 푸는 긴장과 이완의 연속이 유장하게 이어지는 무기교의 기교 또한 독보적이다. 이러한 한량춤은 원래 남녀의 구별이 없었으나 이제는 장부의 기백과 풍류를 대표하는 남성춤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 이제 ‘한량무’는 장부의 기백과 풍류를 대표하는 남성춤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장부의 춤이다. 무대에는 그동안 여성 춤꾼들이 장악했던 한국춤의 모습을 떠나 남성 춤꾼들도 ‘술잔을 피해가는 학(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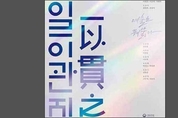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이진경 문화평론가] 우리는 공연의 3요소를 흔히 무대ㆍ배우ㆍ관객으로 말한다. 이 전통적 개념에서 볼 때, 공연을 완성하는 주요한 요소가 창작자의 것을 바라보는 관객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작자가 무대 위에서 창의적 활동을 할 때, 이를 보고 소통하는 관객이 없다면 공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연예술에서 관객은 시대에 따라 그 대상이 점점 더 다양해졌다. 예전에 예술은 소수의 부유층이 누리는 문화예술로서 그 희소가치가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곧 특별한 것을 누리는 고급문화로서 계급적 권위와 품격을 높이는 행위로서의 예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예술은 대중의 향유에 시선을 맞추고 대중성에 입각한 상업의 흥행을 목적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술의 값어치를 돈으로 지급하는 부유층의 후원에 따라 진행하던 것이 나중에는 대중의 흥행에 의한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관객은 예술성과 대중성의 경계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서 살고 있다. 소수의 부유층이 향유 했던 예술을 전통 또는 클래식으로 말했지만, 이는 소수의 예술이 아닌 대중들에게도 향유되는 예술로서 그 범위가 확산하였다. 그러나 대중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