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 이윤옥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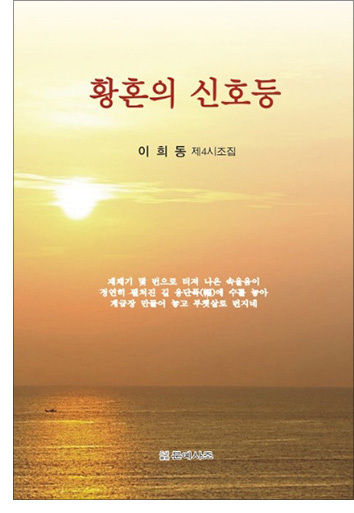
아부지 초가 한 칸 손보러 왔습니다
그동안 자주자주 찾아뵌다 해 놓고서
어느덧 일 년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짐을 저버리고 목구멍만 풀칠하다
벌초는 해야겠다, 번뜩 생각에 고삐조여
뒤늦게 맨주먹으로 염치없이 뵈옵니다
지갑이 얇은 탓에 상석도 가벼워서
당신이 하신 말씀 박주산채 뿐이오니
허물을 나무라시고 흠향 많이 하십시오(뒷 줄임)
이희동 시인은 ‘아부지를 뵈옵니다’에서 그렇게 말했다. ‘다짐을 저버리고 목구멍만 풀칠하다’는 표현이 필자를 두고 하는 말 같아 가슴이 아리다. 어머니 가신지 석 달 엿새! 이희동 시인은 초가 한 칸일지언정 아부지를 음택에 모셨건만 필자는 어머니를 캐비닛 같은 납골당에 모셨다. 한줌 재로 변한 어머니를 납골당 그 비좁은 곳에 모시고 이희동 시인처럼 자주자주 뵙는다면서 ‘목구멍 풀칠하느라’ 외면하고 있다. 아 어머니시여! 그리고 이땅의 아버지시여!
아는 듯 모르는 듯 깊어지는 주름살은
세월의 수레바퀴 되돌릴 수 없는 자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 종착역이 보이네
-‘황혼의 신호등’ 가운데서-
시인도 나이를 먹는다. 끝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신 그 길을 가야한다. ‘황혼의 신호등’에서 종착역이 가까운 시인의 마음을 읽는다.
지인으로부터 지난 연말에 이희동 시인의 《황혼의 신호등》 시집을 받았다. ‘이희동 제4시조집’이라고 쓰여 있다. 명색이 시인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시집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든다. 열어보면, 미안하게도 몇장 읽다가 덮어버리기 일쑤다. 왜, 이 사람은 이런 책을 썼을까? 그런 생각에 받아든 《황혼의 신호등》 도 사실 책상 위에서 꽤 여러 날 잠재우고 있었다.
보잘 것 없는 글 농사
어쩌면 속옷을 세탁해서
사거리 한 복판에 널어놓은 꼴
이라는 머리말을 읽으며, 아차 싶었다. 꼭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았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글을 부끄러워 하는 사람치고 좋지 않은 글이 없었다. 경험학상 그렇다. 세상에는 수십 수백 편을 냈어도 읽을 것이 없는
작가들이 허다한데 말이다.
날마다 기다리며 /눈길주던 우편함이
인터넷 발달되어 /뒷방으로 나 앉아서
이제는 광고 전단만 /수북 쌓여 있어라
-우편함-
이희동 시인의 ‘우편함’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의 우편함도 너의 우편함도 우리의 우편함도 매한가지다. 이제 편지도 한물간 지 오래다. 그런데 시는 읽혀질까?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이희동 시인의 시는 술술 읽히는데다가 ‘마음에 이슬하나 남기게 하는 그 무엇’이 분명 있다. 시집을 건넨 지인에게 모처럼 맑고 깨끗한 시집을 선물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다.
《황혼의 신호등》 이희동 제4시집, 도서출판 문예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