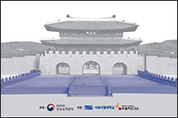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신성희)는 오는 10월 5일(목) 낮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서울 종로구)에서 ‘광화문 월대 복원,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포럼)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문화재청에서 2006년부터 추진했던 광화문 복원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것을 기려 그간 추진됐던 복원 사업의 과정과 연구 결과 등을 소개하고, 월대 복원의 의미와 값어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기획되었다. 행사는 6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먼저, 1부에서는 ▲ 광화문 월대 발굴조사 경과(양숙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 광화문 월대 복원 과정 등 소개(전의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광화문과 근정전 월대 서수상의 상징과 제작시기(김민규, 문화재청 전문위원)의 순서로 주제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 광화문 월대 고증연구(김우웅, 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 ▲ 광화문과 월대의 역사(배우성, 서울시립대학교), ▲ 경복궁과 월대 복원의 역사적ㆍ도시적 값어치(안창모, 경기대학교)의 순서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이후에는 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이경미, 역사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10월을 맞아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전국 곳곳에서 연다. 해마다 열리는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는 행사이다. 10월에는 전승자들의 합동ㆍ연합 행사를 중심으로 모두 36건의 공연과 전시가 펼쳐진다. * 합동 공개행사: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직접 주관하여 기획하는 공개행사 * 연합 공개행사: 2종목 이상 보유자ㆍ보유단체가 연합하여 주관하는 공개행사 먼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삼도수군통제영 12공방(경남 통영시)에서는 ▲「갓일」(정춘모)과 ▲「두석장」(김극천)이 연합하여 전통 갓과 자물쇠 제작 시연과 작품 전시행사를 열고, 21일 한국문화의집 코우스 극장(서울 강남구)에서는 ▲「승무」(채상묵)와 ▲「태평무」(양성옥)가 연합공연을 펼칠 예정으로,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우리 전통문화가 한데 어울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또한 경복궁(서울 종로구)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예능종목들의 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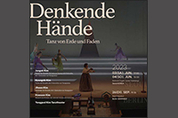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개원 10주년과 한독수교 140돌을 맞아 주독일 한국문화원(원장 양상근)과 한국 전통 도자기와 매듭의 장인이 현대 무용가와 함께하는 특별공연 <생각하는 손-흙과 실의 춤>(이하 <생각하는 손>)을 9월 26일 저녁 7시 30분(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아드미랄스팔라스트(Admiralspalast)에서 연다. 앞서 올해 6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국내 관객들을 맞이한 데 이어,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인 베를린에서 펼쳐지는 이번 <생각하는 손> 공연은 우리 무형유산의 값어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립무형유산원이 2020년부터 열어오고 있는 나라 밖 무형유산 공연 사업인 ‘K-무형유산잔치’의 하나로 진행된다. <생각하는 손>은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의 저서 《장인(The Craftsman)》에서 영감을 받아, ‘으뜸 경지를 향해 정진하는 사람’을 뜻하는 ‘장인’을 중심에 두고, 국가무형유산 ‘사기장’과 ‘매듭장’의 실제 작업을 공연 화한 첫 작품이다. 2021년 11월 국립무형유산원이 제작하고 초연한 작품으로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08년~2009년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사업 터의 무연고 여성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 모두 52건 71점 가운데 사료적 값어치가 있는 10건을 국가민속문화유산 「남양주 16세기 여성 무덤 출토복식」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복식 유물은 16세기 중기 복식 연구 자료로서 값어치가 높으며, 당시의 복식과 장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유물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직금사자흉배 운문단 접음단 치마’는 조선전기 연금사(撚金絲)*로 비단 바탕에 무늬를 짜 넣어 만든 사자흉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16세기 단령*이나 원삼* 등 남녀 예복용 포에 사용했던 옷감을 하의인 치마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처음 발견된 사례자, 해당 치마의 겉감을 이루는 사운문(四雲紋)* 등을 통해 구름무늬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 연금사(撚金絲): 속심 실에 납작한 금실을 돌려 감아 만든 금실 * 흉배(胸背): 조선시대 문무관(文武官)의 관복 단령에 날짐승이나 길짐승 무늬를 직조하거나 수놓아 만든 품계를 표시하던 사각형 장식. 단종 대에 처음 흉배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지난 9월 10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렸던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 이하 “위원회”)가 9월 24일 폐막했다. 이번 위원회는 2022년 러시아 카잔으로 예정되었던 위원회의 개최가 연기됨에 따라 2023년 안건을 함께 다루는 확대 위원회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가야고분군(Gaya Tumuli)」을 포함하여 문화유산 33건, 자연유산 9건 등 모두 42건의 유산이 새로이 세계유산에 올랐었고, 5건이 확장 등재되었다. 이로써 문화유산 933건, 자연유산 227건, 복합유산 39건으로 세계유산은 모두 1,199건이 되었다.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중국의 「푸에르 징마이 산의 고대 차 숲의 문화 경관(문화유산)(Cultural Landscape of Old Tea Forests of the Jingmai Mountain in Pu’er)」을 비롯한 모두 13건(신규등재 12건, 확장등재 1건)이 세계유산에 올랐다. 또한, 1994년 등재된 베트남의 「하롱베이-캇 바 군도(Ha Long Bay – Cat Ba Archipelago)」가 2000년 2차 확장 등재에서 반려를 받았으나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신성희)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캐릭터 4종(수문장, 종사관, 갑사, 대졸)을 새롭게 개발했다. * 수문장: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사대문인 흥인지문, 숭례문 등 도성과 궁궐의 문을 지키던 책임자 * 종사관: 수문장을 보좌하고 관청의 업무를 수행하던 관직 * 갑사(甲士) : 조선 전기의 직업군인으로 중앙군의 정예병 * 대졸(隊卒) : 조선 시대에 오위(五衛) 가운데 용양위에 속한 중앙군으로 광화문을 경비하던 병사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조선시대 왕실 호위문화와 의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통문화 재현 행사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병전(兵典)」의 기록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궁중 문헌을 바탕으로 재현된 수문장 교대의식은 경복궁 쉬는 날인 화요일을 빼고 날마다 아침 10시와 낮 2시에 시행되며, 서울을 대표하는 고궁행사로서 나라 안팎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아왔다. 문화재청은 국민이 수문장 교대의식을 더욱 재미있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2014년부터 직책별 수문장 캐릭터를 개발하여 운영해왔으며, 한층 다양한 볼거리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오는 12월 30일까지 (사)한국판소리보존회에서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서울 강남구청의 후원을 받아 인류무형유산 판소리 <수궁가> 사설교육을 진행 중이다. 판소리 5대목 곧 춘향가ㆍ심청가ㆍ흥보가ㆍ수궁가ㆍ적벽가 사설은 역사적, 인류사적, 문화적, 문학적, 예술적, 민족적, 민중적, 언어적, 전통적, 사회적인 내용이 총망라된 것으로 2003년 11월 7일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형문화 자산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사설의 뜻도 모르고 판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사)한국판소리 보존회에서는 2014년 심청가, 2015년 춘향가, 2016년 수궁가의 사설 풀이교육을 하고 사설집을 펴냈으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었다가 2023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으로 판소리 수궁가 사설 풀이 교육을 현재 진행 중이다. 강사는 동국대 김세종 교수(한국음악학 박사)가 맡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낮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삼성동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904호에서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 이어 2024년도에는 흥보가 사설 풀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1월 26일 저녁 4시에는 전수관 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지난 9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고 있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세계유산에 오른 「가야고분군」은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7개 고분군으로 이루어진 연속유산입니다. 7개 고분군은 ▲ 전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 경남 김해 대성동 고분군, ▲ 경남 함안 말이산 고분군, ▲ 경남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 경남 고성 송학동 고분군, ▲ 경남 합천 옥전 고분군이지요. 그런데 고분이 1,700여 기나 있는 상주 함창 오봉산 고분군 곧 고녕가야 고분군은 낙동강 상류지역에 있는 것으로 가히 가야를 대표하는 정도 이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에 올린 학자들과 문화재청은 이를 외면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야고분군」 목록에서 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분들이 분명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방치한 틈을 타서 대규모 도굴이 이루어져 1,700여 기나 된다는 고분들 가운데 현재 온전한 고분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훼손되었습니다. 왜 이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신성희)는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계유산 조선왕릉의 값어치를 널리 알리고, 왕릉 숲길에서 여유와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선왕릉 숲길 8개소를 한시 개방한다. 가을철을 맞아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 파주 삼릉 ‘영릉~순릉 작은 연못 숲길’, ▲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로 모두 8개소로 전체길이는 16.82km다.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봄ㆍ가을철 기간을 정하여 조선왕릉 숲길을 일반에 공개해 왔으며 방문객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한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비공사 중인 ▲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과 파주 삼릉 내 ‘공릉 능침 북측 구간(2km)’은 이번 개방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가을철 개방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길어진 한가위 연휴에 많은 국민이 조선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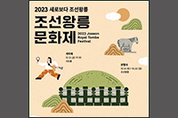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신성희)는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2023년 조선왕릉문화제」를 10월 13일 서오릉에서의 개막제를 시작으로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조선왕릉 9곳(홍유릉, 동구릉, 선정릉, 태강릉, 헌인릉, 서오릉, 김포장릉, 융건릉, 영릉(세종대왕릉))에서 연다. 「조선왕릉문화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왕릉 활용 문화행사로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다. 올해 행사는 예년보다 하루가 더 늘어나 모두 9일 동안 확대 운영되며, 지난해에 좋은 호응을 얻었던 융복합 공연 콘텐츠와 야행, 답사(투어)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문화강좌 프로그램과 미디어 전시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유일하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었던 서삼릉 내 ‘효릉(孝陵)’이 공개되어 조선왕릉이 전면 개방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조선왕릉원정대’를 지난달 선보인 바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40명의 원정대원은 효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를 모두 답사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