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조선시대 병을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침과 뜸 곧 침구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침구술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있는 수백 개의 경혈을 침구술을 시술하는 사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했지요.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시술하면 환자가 위험할 수 있어서 조선 왕실에서는 청동으로 경혈을 표기한 인체상을 만들어 정확한 침구술을 익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침구술을 연습하기 위해 만든 청동인체상 머리 위에는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물이나 수은을 넣은 뒤, 시술자가 올바른 혈 자리에 침을 놓으면 액체가 흘러나오도록 하였지요. 《승정원일기》 기록에 따르면 1747년(영조 23년) 숙종의 왕비인 인원왕후를 치료하기 전 2명의 의관을 뽑을 때 청동인체상으로 시험했다는 기록이 있어 그 근거가 확실한 것입니다. 현재 왕실에서 쓴 것으로 전해지는 인체상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이 유일하지요. 국립고궁박물관은 2019년 5월부터 다달이 전시되고 있는 유물 가운데 한 점을 뽑아,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큐레이터 추천 왕실유물‘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난 9월 뽑힌 유물인 청동인체상은 유튜브 채널로 9월 23일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자장 자장 와리 자장 우리 애기는 잘두 잔다. 남의 애기는 울구 잔다. 자장 자장 와리 자장 꽃밭에는 나비오구 자장밭에는 잠이 온다.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님께는 효자동이, 일가에는 화목동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혜화동 JCC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조교 유지숙 명창의 <북녘땅에 두고 온 노래 Ⅳ> 공연이 이었지요. 바로 위 노래는 이날 공연에서 불렸던 것으로 평안남도에서 전래했던 토속 <자장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차르트ㆍ슈베르트 등 서양 자장가를 익숙히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 겨레에겐 이런 자장가들이 전승돼온 것입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불린 것들은 평안남도에서 전해 내려온 자장가 10곡이었는데 이 자장가들은 아가의 고운 잠결을 바라는 엄마의 간절함이 부드럽게 담겨있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자장가 말고도 죽은 어머니를 추모하는 ‘타박네야’와 함께 며느리의 시집살이를 표현하는 "시집가서 삼 일 만에 밭 김매러 나갔네 / 한 골 매고 두 골 매니 달이 떴네 달 떴네" 하는 ‘시집살이’, 그리고 ‘며느리의 말대답’, ‘물레질 소리’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 /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위는 김광규 시인의 “대장간의 유혹”이란 시입니다. 우리는 조선 풍속도의 대가라고 하면 단원 김홍도(金弘道, 1745 ~ ?)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 김홍도의 그림 가운데 “대장간”이 있는데 또 다른 풍속화가 김득신(金得臣, 1754 ~ 1822) 그림에도 “대장간”이 보입니다. 김득신은 김홍도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김득신의 ‘대장간’은 김홍도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김홍도의 그림에서 보이던 대장장이가 아닌 낫 갈던 녀석을 김득신은 과감히 빼버렸습니다. 대신 대장장이들이 훨씬 젊고 힘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김홍도는 대장간을 사실 그대로 그렸지만, 김득신은 생략할 건 생략하고 그 대신 대장간에 걸맞게 생동감 있고, 힘 있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또 한 가지 더 김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일반 백성과 양반가의 음식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들의 차이를 음식의 재료나 종류, 그리고 가짓수나 조리법으로 봅니다. 물론 이런 것의 차이도 있지만, 요리전문가에 따르면 양반가의 음식은 조상이나 집안 어른을 위하는 마음 씀씀이를 듬뿍 담고, 양념으로 쓰는 실고추ㆍ깨소금 하나에도 정성을 담아 오랜 시간 조리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양념장 속의 양념은 진이 나도록 다졌고, 고명을 만들 때도 일정한 맛과 모양을 냈으며 쇠고기도 결을 따라 곱게 써는 것이 원칙이었지요. 그러고 보니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음식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양지머리 고깃국이라도 끓이는 날엔 핏물을 빼려고 찬물에 담가두는 일부터 시작하여 고기에 무ㆍ대파ㆍ마늘ㆍ생강 등을 넣고 푹 고아야 합니다. 이때 국 위에 떠오른 것들은 일일이 서서 걷어내야 할뿐더러 다 끓여낸 국을 뜰 때는 국그릇을 뜨거운 물에 미리 담가 따뜻하게 한 다음 마른행주로 잘 닦아 담아내야 했지요. 국 한 대접이 밥상에 오르려면 어머니들의 이러한 정성과 공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음식의 기본으로 오랫동안 숙성시켜야 제맛이 나는 김치나 오래 둘수록 깊은 맛이 나는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지난 8월 27일 문화재청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가거도 섬등반도」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7호로 지정하였습니다. 섬 모두가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신안 가거도’는 나라땅 최서남단이라는 지리적인 상징성이 있지요. 수많은 철새가 봄철과 가을철에 서해를 건너 이동하면서 중간에 잠시 들르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넓게 펼쳐진 후박나무 군락과 다양한 종류의 희귀식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가거도 북서쪽에 있는 섬등반도는 섬 동쪽으로 뻗어 내린 반도형 지형으로서,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암봉과 병풍처럼 펼쳐진 바닷가 낭떠러지가 볼만한 광경을 이루며, 특히, 해넘이 경관이 아름답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지요. 가거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고문헌과 《여지도서》, 《해동지도》, 《제주삼현도》 등 고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조선 시대의 본래 섬 이름은 가가도(加佳島)이었는데, 다른 한자표기로 ‘가가도(加可島)’라는 기록도 보입니다. 「신안 가거도 섬등반도」의 명승 지정은 마지막 ‘끝섬’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지요. 나라땅 최서남단의 가거도는 나라땅의 동쪽 끝인 독도(천연기념물 제336호),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우리 겨레는 예전 한겨울 추위를 누비옷으로도 견뎠습니다. 누비는 원래 몽골의 고비 사막 일대에서 시작되어, 기원전 200년쯤 중국과 티베트에서 쓰였다고 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치마, 저고리, 포, 바지, 두의(頭衣), 신발, 버선. 띠 등 옷가지와 이불 따위에 누비가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누비는 보통 보온을 위해 옷감 사이에 솜을 넣고 함께 홈질해 맞붙이는 바느질 방법입니다. 그냥 솜옷은 옷을 입을수록 옷감 안에서 솜이 뭉쳐버립니다. 하지만, 누비를 해놓으면 이렇게 뭉치는 일도 없고, 누비 사이에 공기를 품고 있어서 더 따뜻할 수가 있지요. 본래 누비는 스님들이 무소유를 실천하려고 넝마의 헝겊 조각을 누덕누덕 기워서(納) 만든 옷(衣) 곧 `납의장삼(納衣長衫)`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납의가 `나비`로 소리 나다가 이것이 다시 `누비`로 자리 잡은 것이라지요. 여기서 `누비다`라는 새로운 바느질 양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누비는 무늬의 모양에 따라 줄누비, 잔누비, 오목누비 따위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홈집이 촘촘한 잔누비는 홈질줄의 간격이 1밀리미터 정도인데 정말 정교하고 아름답습니다. 누비는 섬세한 작업인 만큼 정성을 쏟지 않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조선시대 장애인을 바라보는 눈은 오늘날보다 훨씬 선진적이었는데 장애인에겐 조세와 부역을 면해주고, 죄를 지으면 형벌 대신 면포로 받았으며, 연좌제도 적용하지 않았지요. 또한 시정(侍丁) 곧 활동보조인을 붙여주고, 때때로 잔치를 베풀어주며 쌀과 고기 같은 생필품을 내려주었습니다. 또 동서활인원이나 제생원 같은 구휼기관을 만들어 어려움에 부닥친 장애인을 구제하였지요. 특히 조선시대엔 장애가 있어도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벼슬을 할 수가 있었지요. 예를 들면 조선이 세워진 뒤 예법과 음악을 정비하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공을 세운 허조(許稠, 1369~1439)는 어려서부터 몸집이 작고 어깨와 등이 구부러진 꼽추였지만 좌의정까지 오를 수 있었지요. 또 간질 장애인이었던 권균(權鈞, 1464~1526)은 이조판서와 우의정에 오르고 영창부원군에까지 봉해졌으며, 체제공(1720년~1799)은 사팔뜨기였지만 영의정까지 올라 정조 때 큰 공을 세웠습니다. 더구나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장애인에게 사회분위기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북학파의 선구자 홍대용은 그의 시문집 《담헌서(湛軒書)》에서 “소경은 점치도록 하고, 벙어리와 귀머거리, 앉은뱅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경주시 분황로에 가면 사적 제548호 경주 ‘분황사터’가 있습니다. 분황사터는 신라의 대표적인 절 가운데 하나인 ‘분황사’가 있던 곳으로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분황사’는 선덕왕 3년(634)에 창건되었으며, 신라의 승려 자장(慈藏)과 원효(元曉)가 머무르면서 불법을 펼쳤던 유서 깊은 절입니다. 또 분황사는 황룡사, 흥륜사 등과 함께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 왕경(경주)에 조성되었으며,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던 7곳의 가람 곧 칠처가람(七處伽藍)의 하나라고 하지요. 분황사터에 남아있는 유물 가운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보 제30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模塼石塔)’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걸작품으로,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올린 모전석탑(模塼石塔)으로 원래 9층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지금은 3층만 남아있습니다. 탑은 넓직한 1단의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착실히 쌓아올린 모습입니다. 선덕여왕 3년(634) 분황사의 창건과 함께 세워진 것으로 추측되며, 부드러우면서도 힘차게 표현된 인왕상 조각은 당시 7세기 신라 조각양식을 살피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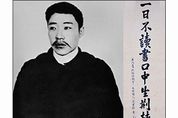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白日靑天霹靂聲 푸른하늘 대낮에 벽력소리 진동하니 大州諸子魂膽驚 6대주(大州)의 많은 사람들 가슴이 뛰놀았다 英雄一怒奸雄斃 영웅 한번 성내니 간웅(奸雄)이 거꾸러졌네 獨立三呼祖國生 독립만세 세 번 부르니 우리조국 살았다. 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무총장과 외무총장 등을 지낸 신규식 선생이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보고 지은 시입니다. 오늘은 111년 전인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를 깬 일본제국주의의 원흉 이등박문을 처단한 날이지요. 아침 9시 이등박문이 탄 열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했고, 잠시 뒤 그가 열차에서 내려 걸어갈 때 안 의사는 권총을 빼들고 이등박문을 향하여 4발의 총을 쏘았고, 4발 모두 명중했습니다. 안 의사는 일본 헌병이 그를 체포하려고 대들자 하늘을 향하여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습니다. 거사 직후 안 의사는 하얼빈 내 일본영사관으로 잡혀갔다가 여순(旅順)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되어 심문과 재판을 받았지요. 당당했던 안중근 의사는 공판정에서 의병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독립전쟁을 하여 적 이등박문을 죽였으니 이런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하여 재판을 거부하기도 하였지요. 이후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오늘 23일은 24절기의 열여덟째 “상강(霜降)”입니다.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때인데 벌써 하루해 길이는 노루꼬리처럼 뭉텅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면 하룻밤 새 들판 풍경은 완연히 다릅니다. 된서리 한방에 푸르던 잎들이 수채색 물감으로 범벅을 만든 듯 누렇고 빨갛게 바뀌었지요. 그리고 서서히 그 단풍은 하나둘 떨어져 지고 나무들은 헐벗게 됩니다. 옛사람들의 말에 “한로불산냉(寒露不算冷), 상강변료천(霜降變了天)”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로 때엔 차가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상강 때엔 날씨가 급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상강이야말로 가을 절기는 끝나고 겨울로 들어서기 직전이지요. 갑자기 날씨가 싸늘해진 날 한 스님이 운문(雲門, 864~949) 선사에게 “나뭇잎이 시들어 바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운문 선사는 “체로금풍(體露金風)이니라. 나무는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것이고(體露), 천지엔 가을바람(金風)만 가득하겠지.”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상강이 지나면 추위에 약한 푸나무(식물)들은 자람이 멈추지요. 천지는 으스스하고 쓸쓸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로 들어가는데 들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