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조 족 등 꼭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먼 곳을 보라한다 자기 발밑은 보지 않고 허공만 보라한다 그래서 지금도 조족등이 필요한 건 아닐까 잡다한 곳 비추지 말고 자신의 발밑을 비추는 조족등 네가 그립다. 조족등(照足燈)은 밤거리에 다닐 때 들고 다니던 등으로 댓가지로 비바람에 꺼지지 않게 둥근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촛불을 켜는 등이다. 특히 조족등은 순라군이 야경을 돌 때 주로 썼다. 조족등을 이름 그대로 풀어 보면 비출 조(照), 발 족(足), 등잔 등(燈) 자를 써서 발을 비추는 등이라는 뜻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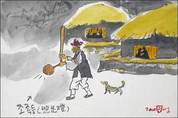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기억에 남아 있을 ‘통행금지‘. 광복을 맞으면서 시작된 통행금지는 1982년 1월까지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는데 광복 직후엔 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1961년부터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가 통금시간이었습니다. 동무들하고 신나게 놀다가도 통금시간이 다가오면 ‘오금아 날 살려라’라면서 집으로 줄행랑을 쳤었지요. 어떤 이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꾀를 낸다는 것이 장승처럼 멀뚱히 서 있다 여지없이 잡혀 파출소행을 했던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통행금지가 물론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조선이 개국 되자마자 치안과 화재 예방을 위해 한성을 비롯해 주요 도시와 국경지방에까지 통행금지 시간을 두었지요. 시계가 없던 시절 성문이 닫히고 통금이 시작되는 때를 “인정(人定)”이라 하며 28번의 종을 칩니다. 인정을 친 이후는 지위가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통행금지를 위반하여 잡히면 엄한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통금이 풀리는 때를 파루(罷漏)라 하여 33번의 종을 쳐 백성들에게 알렸지요. 그런데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1401) 9월 21일 기록을 보면 사헌부(司憲府)의 우두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