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엘리자베스 키스. 1919년 처음 한국을 찾은 뒤 한국의 여러 가지 풍속과 사람을 그린 화가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근무하는 언니 부부를 따라 일본에 왔다가 동양에 매혹되어 머물렀다. 그 뒤 언니 제시와 함께 1919년 3월 28일, 조선에 와서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이렇게 그린 그림을 1946년 《올드 코리아》라는 책으로 펴냈다.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은 색동옷을 입고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 좁은 방에 마주 앉아 학문을 논하는 노인들, 추운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남바위 등 1900년대 초 한국의 모습을 따뜻하면서도 정교하게 담아내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배유안이 쓴 이 책,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 그림에서 우리 문화 찾기》를 보면 경성시대 한국의 모습이 한층 정겹게 느껴진다. 물론 식민지배 치하의 엄혹한 시대, 사는 것이 신산하다고 고달팠을 테지만 그럼에도 일상은 무심히 흘러갔던 것 같다. 책에 실린 그림들은 ‘정겨운 사람들’, ‘마음에 남는 풍속들’, ‘아름다운 사람들’, ‘기억하고 싶은 풍경들’의 네 가지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엘리자베스 키스는 어떤 모습을 그리든 따뜻하고 애정

[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외세의 침략이 전혀 없었던 나라도 세월의 힘을 견디기 쉽지 않은데, 하물며 우리나라처럼 갖은 침입에 식민지 시절까지 겪었던 경우라면 옛 유산을 잘 보전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실제로 많은 유산이 무관심 속에 잃어버리고, 도둑맞고, 팔려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유산들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물론 문화유산의 나라 밖 반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적법한 경로로 판매된 것이라면 엄연한 소유권 이전으로 그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값어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이 너무나 많은 유산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난폭한 방식으로 없어져 버린 것이다.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안민영이 쓴 이 책, 《문화재를 지킨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잃은 문화유산을 되찾아 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그리고 멋진 용기를 발휘해 돌려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빼앗긴 입장에서야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할 수 있지만, 반출 경로가 어찌 되었든 돌려주기로 하는 것은 큰 용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실에서는 한번 잃어버린 문화유산은 좀처럼 되찾기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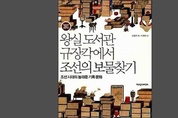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우지원 기자] (p.10)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마라. 일할 때는 공적인 일이 아니면 마루로 내려가지 마라. 규장각에서 공부하는 학자가 아니면 아무리 높은 관리라 하더라도 규장각에 올라갈 수 없다. 일할 때는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해라.’ 조선 후기의 명군, 정조가 왕실도서관 규장각에서 일하는 관원들에게 내린 지침이다. 쓱 훑어봐도 정조가 규장각 관원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뒤 창덕궁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답고 한적한 곳에 2층 건물, 규장각을 지었다. 정조는 24년 동안 재위하면서 규장각 학자들과 151종류, 3,960권의 책을 펴냈다. 직접 펴낸 책 말고도 중국이나 외국의 희귀한 책을 구해와 보관하기도 했다. 책이 귀했던 시절, 규장각은 모든 종류의 책을 모아놓은 ‘조선의 보물창고’였다. 이 책, 신병주 교수가 이혜숙 작가와 함께 펴낸 《왕실도서관 규장각에서 조선의 보물찾기》는 규장각에 소장된 책들 가운데 잘 모를 법하거나 관심을 가질만한 책들을 가려 뽑았다. 옛 규장각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각종 국보와 보물, 옛 책과 문서, 지도, 정부 기록물 26만여 점 가운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