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장상훈)은 언론인이자 민속학자였던 예용해(芮庸海, 1929~1995) 선생의 30주기를 맞아, 오는 8월 5일(화) ‘언론인 예용해, 조선의 마지막 장인, 인간문화재를 기록하다’를 주제로 기념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고 값어치를 알리고자 했던 예용해 선생의 기록과 활동을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이다.

인간문화재: 기예(技藝)도, 그것을 지닌 사람도 문화재
‘인간문화재’라는 용어는 오늘날엔 익숙하지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낯설었다.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대, 한 기자의 기사에서였다. 그 기사는 ‘문화재는 물건’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도 문화재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무형문화유산의 값어치를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 그 기자가 바로 예용해이다. 그는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로 전국을 돌며 전통 기술을 지닌 장인들을 발굴했고, 「인간문화재」 기사를 연재하며 이들의 삶과 기예를 세상에 알렸다. 이로써 무형문화재 제도 수립의 단초가 되었고, ‘인간문화재’라는 표현은 이후 공식 제도 용어로 정착했다.
「인간문화재」 연재, 조선의 마지막 장인들을 기록하다.
예용해 선생이 「인간문화재」에서 조명한 장인들은 대부분 1870~1920년대 출생자로, 궁중악기 제작, 방짜유기, 탈춤, 지게, 지붕잇기 등 조선 후기의 기술을 보유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격변하는 사회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었다. 선생은 이들을 찾아내 기사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속학자의 눈으로 장인의 삶과 손끝의 기술을 치밀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그의 기사에 소개된 인물들 다수가 훗날 ‘인간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네 개의 주제 발표, 예용해의 활동을 다각도로 조명
이번 학술대회는 언론, 문화정책, 민속공예, 민속예능 등 네 분야의 발표와 전문가 좌담으로 구성된다. 발표자들은 예용해 선생과 인연을 맺은 이들로, 그의 기록과 민속문화에 대한 기여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조명한다.
언론 분야에서는 최성자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인간문화재’ 용어의 기원과 「인간문화재」 시리즈의 기획 과정, 당시 언론 환경에서 선생의 역할을 살핀다. 문화정책 분야에서는 김권구 계명대 명예교수가 국립민속박물관의 위상 정립과 무형문화재 제도 수립에 대한 정책적 기여를 소개한다.
민속공예 분야 발표자인 김인규 전 국립고궁박물관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선생의 조사 방식과 민속공예 기록 활동을 살펴본다. 나아가 전승 단절의 위기 속에서 그가 제안한 정책적 대응도 함께 고찰한다. 민속예능 분야에서는 서연호 고려대 명예교수가 판소리, 무속, 무예, 탈춤 등 전통 예능을 발굴하고 제도화하여 언론을 통해 널리 알린 과정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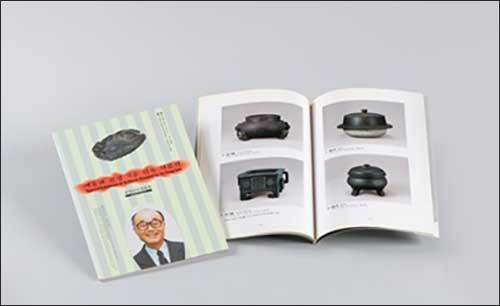
전문가 좌담회, 증언과 기억으로 엮는 구술 아카이브
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좌담회에는 발표자 4인을 비롯해, 예용해 선생과 함께 민속 현장을 누볐던 김양동 계명대학교 석좌교수, 이종철 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예용해전집》을 총괄한 흥선 스님이 참여한다. 좌장은 배영동 국립경국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이 좌담에서는 발표문에 담지 못한 생생한 현장 경험과 기억을 나누고, 예용해 선생이 생전에 힘썼던 전통 차 문화와 해외 소재 한국 문화재 조사 활동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과 실천을 함께 되새길 예정이다.
모두에게 열린 학술대회
학술대회는 8월 5일(화)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현장에서 접수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발표문이 담긴 자료집은 박물관 누리집(www.nfm.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