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요즈음 뉴스 제목를 보면 “‘추석선물 도착’…이 문자 조심하세요”, “추석 풍경도 변화…‘혼추족’과 여행객들로 달라진 명절”, “추석 연휴 환자 몰리는 응급실…경증ㆍ중증 구분법은?”처럼 명절 ‘추석’에 관한 얘기가 넘쳐납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한가위만 같아라? 기후 위기가 만들어 낸 ‘찜통’ 추석”처럼 ‘한가위’와 ‘추석’을 섞어 써놓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가위’ 경기도 ‘둥근 보름달’ 명소 6곳”처럼 ‘한가위’라는 말만 쓴 기사도 보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명절 이름을 두고도 이렇게 혼란스럽게 써야만 할까요? "신라 유리왕 9년에 국내 6부의 부녀자들을 두 편으로 갈라 두 왕녀가 그들을 이끌어 7월 기만(음력 열엿새)부터 길쌈을 해서 8월 보름까지 짜게 하였다. 그리곤 짠 베의 품질과 양을 가늠하여 이기고 짐을 결정하고,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 이긴 편을 대접하게 하였다. 이날 달 밝은 밤에 임금과 벼슬아치를 비롯해 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왕녀와 부녀자들이 밤새도록 ‘강강술래’와 ‘회소곡(會蘇曲)’을 부르고, 춤을 추며 질탕하고 흥겹게 놀았다.“ 위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장장채승(長長彩繩:오색의 비단실로 꼰 긴 동아줄) 그넷줄 휘늘어진 벽도(碧桃, 선경[仙境]에 있다는 전설상의 복숭아)까지 휘휘 칭칭 감어 매고 섬섬옥수(纖纖玉手) 번듯 들어 양 그넷줄을 갈라 잡고 선뜻 올라 발 굴러 한 번을 툭 구르니 앞이 번 듯 높았네. 두 번을 구르니 뒤가 점점 멀었다. 머리 위에 푸른 버들은 올을 따라서 흔들 발밑에 나는 티끌은 바람을 쫓아서 일어나고 해당화 그늘 속의 이리 가고 저리 갈제” 이 구절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서 춘향이가 그네 타는 장면인데, 그네뛰기는 단옷날의 대표적 민속놀이다. 우리 겨레는 예부터 설날, 한식, 한가위와 함께 단오를 4대 명절로 즐겼지만 이제 그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단오의 이름들과 유래 단오는 단오절, 단옷날, 천중절(天中節), 포절(蒲節 : 창포의 날), 단양(端陽), 중오절(重午節, 重五節)이라 부르기도 하며, 우리말로는 수릿날이라 한다. 단오의 '단(端)'자는 첫 번째를, '오(午)'는 다섯으로 단오는 '초닷새'를 뜻한다. 중오는 오(五)의 수가 겹치는 음력 5월 5일을 말하는데, 우리 겨레는 이날을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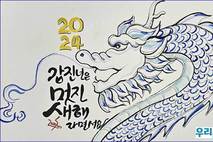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2024년 갑진년 푸른 용해가 밝았다. 지난해 나라가 온통 어수선해 온 국민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제 밝아온 새해는 지난해의 시름을 떨쳐 버리고, 힘찬 한 해가 되기를 비손해 본다. 설날,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여 세배하고 성묘하며, 정을 다진다. 또 온 겨레는 “온보기”를 하기 위해 민족대이동을 하느라 길은 북새통이다. “온보기”라 한 것은 예전엔 만나기가 어렵던 친정어머니와 시집간 딸이 명절 뒤에 중간에서 만나 회포를 풀었던 “반보기”에 견주어 지금은 중간이 아니라 친정 또는 고향에 가서 만나기에 온보기인 것이다. 설날의 말밑들 설날을 맞아 먼저 “설날”이란 말의 유래를 살펴보자. 조선 중기 실학자 이수광(李睟光, 1563~1628년)의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설날을 “달도일(怛忉日)”이라고 했다. 곧 한 해가 지남으로써 점차 늙어 가는 처지를 서글퍼하는 말이다. 그리고 '사리다' 또는 삼가다.'의 `살'에서 비롯했다는 설도 있다. 여러 세시기(歲時記)에는 설을 '삼가고 조심하는 날'로 표현하고 있는데 몸과 마음을 바짝 죄어 조심하고 가다듬어 새해를 시작하라는 뜻으로 본다. 또 '설다. 낯설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