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제7회 벽파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지난 12월 12(일), 서울 삼성동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작년에는 감염병으로 인해 대회 자체가 열리지 못해 아쉬웠는데, 올해에는 비(非) 대면(對面)으로 실시하는 영상 심사로 예선을 거친 뒤, 본선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2021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돌림병 확진자가 줄어들기는커녕, 또 다른 새로운 이름의 병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서 매우 불안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철저히 방역해 가며 대회를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년에 견줘 다소 출전자들이 줄기는 했어도 100여 명 이상이 참가신청을 냈다고 하니 벽파 대회의 위력은 나름대로 살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제7회 대회에서 명창부의 대상은 서도좌창 가운데서 초한가(楚漢歌)를 힘차게 부른 최은서가 차지하였다. 초한가란 어떤 노래인가? 아니 그보다도 벽파 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벽파(碧波)>란 무슨 뜻이고 누구를 일컫는 이름인가? 벽(碧)은 푸르다는 의미, 또한 파(波)는 물결이라는 의미여서 벽파란 <푸른 물결>을 뜻한다. 바로 경기민요의 대명사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종대)은 임인년 호랑이띠 해를 맞이해 2021년 12월 22일(수)부터 2022년 3월 1일(화)까지 기획전시실 2에서 《호랑이 나라》 특별전을 연다. 이번 특별전은 호랑이에 관한 상징과 문화상을 조명하는 자리로, 오랫동안 우리의 삶과 함께하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 동물로 자리매김한 호랑이에 얽힌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조선 사람들은 반년 동안 호랑이 사냥을 하고, 나머지 반년 동안은 호랑이가 조선 사람을 사냥한다”: 방대한 호랑이 흔적 약 120년 전에 출간된 여행기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rs)》(1897)에서 저자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은 “조선 사람들은 반년 동안 호랑이 사냥을 하고, 나머지 반년 동안은 호랑이가 조선 사람을 사냥한다.”라고 하며, 조선에는 많은 수의 호랑이가 있다는 기록을 남겼다. 호랑이와 관련해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는 1,000건 이상의 설화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는 700건 이상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구술과 기록으로 대표되는 두 문헌에 나타난 방대한 호랑이 흔적은 오랫동안 호랑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금슬상화(琴瑟相和)라는 말이 있다. 금이라는 악기와 슬이라는 악기가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뜻으로 보통 부부 사이가 좋을 때, ‘금실이 좋다’는 표현을 한다. 슬을 타는 자는 그 뜻을 슬에 두지만, 금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금을 타는 자, 역시 그 뜻은 금에 두되, 그 슬과 더불어 조화를 통해 즐거움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무룻 여기에 조화를 모르는 자는 즐거움 또한 넓지 아니하며 뜻도 없고 음악의 역할도 구차하게 스스로 얽어매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악기를 붙잡고 그 솜씨를 다투는 자와 비슷할 것이다. 마음의 교류를 통하여 조화의 멋을 느끼며 유유자적하던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흔히 영산회상이나 가곡을 일러 ‘점잖은 음악’이라고 말한다. 점잖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을 말함인가? 성재 유중교(1821~1893)는 이항로의 문인으로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던 인물로 유명하다. 외국과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척사위정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유고로는 《성재문집》 60권이 있다. 그 유중교가 쓴 《현가궤범》 서(序)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듣건대, 세상에 금(琴)과 가(歌)에 종사하는 자는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종대)에서는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사업의 하나로 2021년 11월 30일 《한국민속상징사전: 호랑이 편》을 펴냈다. 이번 사전은 임인년(壬寅年) 호랑이해를 맞아 우리 문화 속에 다채롭게 깃들어 있는 호랑이 상징에 대한 해설서로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호랑이의 다양한 모습과 그 문화적 의미를 정리한 호랑이 사전이다. 호랑이 상징의 변천사를 한눈에 호랑이 상징 사전은 고대 ‘단군신화’로부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마스코트였던 ‘수호랑’에 이르기까지 호랑이 관련 내용을 전부 수록하고 있다. 또한, 콜레라 고통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호랑이가 살점을 찢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의미의 ‘호열자(虎列刺)’로부터 ‘몹시 사납고 무서운 사람’을 비유하는 ‘호랑이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호랑이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하여 호식장(虎食葬,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난 뒤에 유구-遺軀를 거두어 장사하는 의례), 호살량굿(호환에 희생된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황해도굿의 굿거리 가운데 하나) 등 우리 민속에 나타나는 호랑이에 대해서도 학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생활문화 속 호랑이 상징에 대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정종섭 원장)은 2017년부터 5년 동안 구축해온 전국 종가의 제례문화 디지털 창고(아카이브)를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12월 7일(화) 공개된 창고(https://jongga.koreastudy.or.kr/)에는 전국 100개 종가의 제례문화 사진자료 1만 2천 장과 100여 개의 동영상 등이 실려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오늘날 제례문화는 간소화와 현대화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 시점에서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종가의 제례문화를 전통문화의 보존 차원에서 디지털로 구현하게 됐다”라고 했다. 아카이브의 ‘종가정보’ 배너를 누르면 100개 종가 목록이 나타난다. 여기서 종가를 고르면 종가별 역사적 배경과 제물 정보 등이 사진과 함께 나온다. 또 삽화(일러스트) 이미지로 구현해둔 종가의 실제 제사상에서 제물을 클릭하면 누름창이 나타나 사진과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 그림(인포그래픽)으로 만든 ‘제물분포지도’도 올려 있다. 홍어ㆍ고등어 같은 제물을 누르면 지역별 ㆍ종가별 사용처가 지도 위에 표시된다. 이에 따르면 홍어는 전라도 종가에서 주로 쓰지만, 경상도 종가에서는 전혀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영산회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 음악은 전문 국악인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큰 고개라는 이야기, 영산회상과 관련하여 1970년대 중반, 서울 음대에 출강하고 있던 서한범과 김선한(거문고)은 김정자의 제안으로 정악 공부 모임인 【정농악회】를 조직하였다는 이야기를 했다. 【정농악회】의 원로 사범으로는 김천흥(해금), 김성진(대금), 김태섭(피리, 장고), 봉해룡(단소), 이석재(피리, 장고) 선생 등으로 이분들은 오로지 영산회상 중심의 정악만을 연주해 온 정통음악인들이라는 이야기를 더했다. 또 크고 작은 소리의 대비, 강하고 약한 소리, 잔가락이나 표현적인 시김새의 처리, 장단과의 호흡, 관(管)가락과 현(絃)가락의 조화, 내 소리와 다른 악기와의 조화 등등, 우리는 원로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그분들로부터 배운 경험은 지금도 소중한 자산이 되어 후진 양성에 큰 교훈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예기》 중에서 악기(樂記) 편에 나오는 말이다. “음악의 생성은 음양의 기(氣)가 흘러 하나 되고, 화(化)하여 일어나며, 만물의 변하여 이루는 것이 곧 악(樂)이요, 악을 천지의 화합이라고 한다.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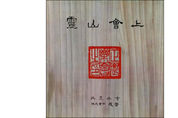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나는 영산회상과 관련하여 잊지 못하고 있는 경험담을 지니고 있다. 1970년대 중반이다. 당시 서울 음대에 출강하고 있던 나와 이화여대의 김선한(거문고)은 기말 전공시험의 채점을 마치고, 서울 음대 국악과 김정자 교수의 제안으로 함께 식사와 차를 나누며 영산회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주된 내용은 오늘 시험에 치른 학생들의 연주 능력이나 해석이 제각각 달라 지도하는 선생들이 더욱 더 근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리하여 우리 3인과 한양대학의 양연섭(양금) 교수는 함께 정악 공부 모임인 【정농악회】를 조직하게 된다. 그리고 당시 국악계의 원로 사범이었던 김천흥(해금), 김성진(대금), 김태섭(피리, 장고), 봉해룡(단소), 이석재(피리, 장고) 선생 등을 모시고, 정례적으로 영산회상 합주를 주 1회 정도 공부한 적이 있다. 겨울에 시작된 공부가 3달 정도 지날 무렵, 우리 젊은이들은 노 선생들과 함께 영산회상 전곡을 국립극장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하고 연습계획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젊은 교수들은 ‘매매일의 일정이 바쁘다.’, 또는 ‘이미 다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곡이며, 현재 학생들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동물모양 띠고리[動物形帶鉤]는 옷을 여밀 때 쓴 갈고리 모양의 허리띠에 딸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원삼국시대에 주로 사용했으며, 한쪽은 갈고리모양의 걸쇠, 다른 한쪽은 원형 혹은 타원형 고리로 되어 있어 서로 걸게 만들었습니다. 가죽이나 천으로 된 허리띠는 땅속에서 썩어 남아있지 않고 금속 부속구만 현재까지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모양 띠고리는 대부분 청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동물모양 띠고리가 사용된 원삼국시대는 철기가 보급되며 청동기 사용은 줄어든 시기였으나, 일부 장신구나 작은 부품은 계속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작 공방 터나 도구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띠고리에 남아 있는 흔적으로 합범(合范), 즉 두 개의 거푸집을 이용하여 주조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동물모양 띠고리는 걸쇠를 동물모양으로 장식한 것이 특징입니다. 앞면에는 동물의 옆모습을 표현하였고, 오목한 뒷면에는 가죽띠와 연결하기 위한 고정쇠를 달았습니다. 동물의 가슴 앞쪽으로 끝이 구부러진 긴 막대를 연결하여 걸쇠를 만들었습니다. 동물 장식의 형태에 따라 호랑이모양 띠고리[虎形帶鉤]와 말모양 띠고리[馬形帶鉤]로 구분합니다. 호랑이모양 띠고리 호랑이모양 띠고리의 호랑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계면조는 우조(羽調), 또는 평조(平調)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슬픈 느낌이 들게 하는 음조직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영산회상은 시김새, 형식, 장단, 기보체계, 변천과정, 향제 줄풍류의 전승현황, 풍류명인과 전승계보, 풍류문화 등을 다양하게 살펴야 이론적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의 보고(寶庫)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하였다. 이번 주에는 영산회상을 위시하여 정악의 매력이 어떤 점인가? 하는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작곡가 알렌 호바네스,(Alan Hovhness)는 일찌기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데, 당시 영산회상을 비롯한 정악(正樂)과 가곡(歌曲) 등, 한국 정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그 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정악곡을 감상하고 있노라면 누구나 그 선율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마련이다. 그윽하고도 유장한 젓대 독주의 <상령산>이나 영롱한 단소 독주의 <세령산> 가락을 듣거나, 혹은 여러 악기가 엎치락뒤치락 어우러져 가며 장려하게 엮어가는 합주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어느덧 선율의 매혹에 홀려 이내 현실을 잊고 끝없는 환상의 피안(彼岸)에 몰입하기 마련인 것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오늘(11월 22일)은 24절기 가운데 스물 째 절기로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입니다. 눈이 내려 추위가 시작되는 때여서 겨울 채비를 합니다. 그러나 한겨울이 아니어서 아직 따뜻한 햇볕이 비치므로 “소춘(小春)”이라고도 하지요. 이때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솜바지로 바뀐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날씨가 추워지므로 사람들은 김장하기 위해 서두릅니다. 또 여러 가지 월동 준비를 하는데 무를 구덩이에 묻고, 시래기를 엮어 달고 무말랭이나 호박을 썰어 말리기도 하며 목화를 따서 손을 보기도 하고, 겨우내 소가 먹을 볏짚을 모아두기도 하지요.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소설은 ‘손돌이 죽은 날’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에 임금이 배를 타고 통진과 강화 사이를 지나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 임금은 사공이 고의로 배를 흔들어 그런 것이라고 사공의 목을 베었습니다. 사공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사공의 이름이 손돌이었지요. 그래서 해마다 그날이면 큰바람이 불고 날씨가 찬 데, 이는 억울하게 죽은 손돌의 원혼 때문이라고 하여 강화에서는 이날 뱃길을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의 추위를 손돌추위, 그 바람을 손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