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경주 황룡사지(사적)의 생활공간에 해당하는 강당 북동편지구 발굴조사 내용을 수록한 《황룡사 발굴조사보고서Ⅲ-강당지 북동편지구》를 펴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경주고적발굴조사단이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모두 8차에 걸쳐 실시한 황룡사지 발굴조사 성과를 정리하여 공개하고 있다. 지난 1984년에 발간된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Ⅰ》에 이어, 2019년에는 동회랑 동편지구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 《황룡사 발굴조사보고서Ⅱ》를 펴낸 바 있다. 이번 《황룡사 발굴조사보고서Ⅲ》에는 1981년~1983년에 시행한 강당지 북동편 지구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 황룡사 강당지 북동편의 건물 배치와 구조, ▲ 황룡사의 공동 생활공간을 추정할 수 있는 건물지와 유물들, ▲ 황룡사 승원영역(승지, 僧地)으로 이어지는 문터와 통로(도로)에 대한 조사 성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고서에 수록된 황룡사 강당지 북동편 지구에서는 사역의 북쪽과 동쪽 외곽 경계가 드러났으며, 동문터, 창고터, 승방터, 식당터 등 건물터 39곳과 담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고려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예고하고, 조선왕조의 법전 《경국대전》과 정조(正祖)의 한글편지, 천문도로 만들어진 「신구법천문도 병풍(新舊法天文圖 屛風)」, 그리고 ‘안중근의사 유묵’ 등 조선~근대기에 이르는 전적 및 회화, 서예작품 등 모두 10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국보 지정 예고된 「청양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靑陽 長谷寺 金銅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은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고려 후기의 유일한 금동약사불상이자 단아하고 정제된 당시 조각 경향을 잘 반영한 작품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어 왔다. 특히, 발원문에는 1346년(고려 충목왕 2)이라는 정확한 제작시기가 있어 고려 후기 불상 연구의 기준 연대를 제시해주고 있다. 고려 후기 불상조각 가운데 약합(藥盒)을 들고 있는 약사여래의 도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온화하고 자비로운 표정, 비례감이 알맞은 신체, 섬세한 의복의 장식 표현 등 14세기 불상조각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어 이 시기 불상 중에서도 뛰어난 예술적 조형성을 지닌 대표적인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의 허가를 받아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여 왕릉원 동고분군 발굴조사’에서 백제 고분의 축조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고분 2기가 확인되었다. 부여 왕릉원은 일제강점기에 3차례(1915년, 1917년, 1938년)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조사구역인 동고분군에서도 5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새로운 고분 1기(6호분)를 추가로 발견하였고, 일제강점기에 확인되었던 고분 1기(1호분)의 실체를 재확인하였다. 조사된 고분은 모두 원형의 봉분과 지하에 매장주체부를 둔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분, 橫穴式石室墳)이다. 새롭게 발견된 6호분은 동쪽 능선 남사면에 있으며, 고분 축조 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어 백제 사비기 왕릉급 고분의 조성과정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봉분은 지름 20m 정도로, 외부에는 둘레돌이 확인되었고, 고분 외곽의 사면부 아래의 부분에는 2단의 축대도 설치하여 묘역을 조성하였다. 또한, 돌방무덤 앞의 무덤길은 두 차례에 걸쳐 조성되어 추가 매장의 흔적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봉분 내 추가 매장 흔적은 부여 왕릉원에서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전라북도 고창군에 자리한 「고창 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했다. 「고창 무장기포지」는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과 부패의 척결, 반외세의 기치(旗幟)를 내걸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대규모 민주항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포고문을 선포한 집결지이자 출발점이다. 그동안 「고창 무장기포지」는 장소성에 의미가 있었으나, 유적과 유물로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기 어려워 장소를 명확히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 무장기포지(茂長起包址): 무장(茂長)은 무장기포지 일대의 조선 시대 지명이며, 기포지(起包址)는 동학동민혁명의 포고문을 선포한 집결지 동학농민혁명의 기포지를 찾기 위해 1985년부터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학술대회가 열렸고, 관련 고문헌(『수록(隨錄)』, 『무장현 채색지도』와 『무장현도』등)의 분석을 통해, ‘전북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대’가 동학동민혁명의 기포지(起包址)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술적 검토 외에도 ‘구암리 590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부터 이 일대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집결하고, 훈련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유재은)는 전북 동부지역 고대 유적과 유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해 사적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14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한다. * 발굴조사 지역: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 두락리 679-2 일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은 남원시 인월면 성내마을 북쪽 구릉부에 자리 잡은 삼국시대 가야 고분군으로, 남원 청계 고분군, 월산리 고분군과 함께 5~6세기 전북 동부지역 문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9년 첫 조사가 이뤄진 이후 몇 차례 조사과정에서 백제와 대가야계 유물이 확인된 바 있다. 올해 발굴조사 구역은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14호분이다. 1989년 조사된 3ㆍ5호분(현재 15·16호분) 동쪽에 자리 잡은 14호분은 근대 경작과 수목 등으로 인해 훼손이 심하였다. 따라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고분의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고 정비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정밀학술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2020년 전북 동부지역 고대 유적과 유물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표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30호분에 대한 학술 발굴 조사를 시행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인규)은 ‘어차(御車)’를 5월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정해 1일부터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로 온라인 공개한다. * 문화재청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luvu *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ogungmuseum 어차는 대한제국 제2대 황제이자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재위 1907~1910년)과 순종의 비 순정효황후(1894~1966년)가 탔던 차다. 순종의 어차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사의 캐딜락 리무진이며, 순정효황후의 어차는 영국 다임러(DAIMLER)사가 제작한 리무진이다. 본래 창덕궁 어차고御車庫(옛 빈청)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던 두 어차는 자연 부식에 의한 노후화, 부품 손실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분 훼손되었다. 현대자동차의 후원으로 1997년부터 5년 동안의 수리ㆍ복원 작업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찾게 되었고, 2005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 두 어차 모두 7인승의 대형 리무진 차량으로, 목조로 된 마차 형태의 차체가 초기 자동차의 형태를 보여준다. 외부는 전통 기법인 옻칠로 도장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이 주최하는 2022년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전승활동 기획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의 진행으로 5월에도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다. 전승자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개행사>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된 국가무형문화재를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전하는 실연이며,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무형문화유산의 대중화 및 전승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승자의 자유로운 기획에 따른 공연·전시이다. 5월은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4월 18일부로 해제됨에 따라 각 행사가 정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별 방역상황으로 부득이하게 무관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때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행사가 끝난 뒤 약 한 달 앞뒤로 전승지원통합플랫폼(support.nihc.go.kr)에서 예능 종목 실연과정을 영상으로 공개한다. 대표적인 <공개행사>로는 서울 ‘놀이마당‘에서 진행되는 ▲「송파산대놀이」(5.28.), 인천 ‘화도진공원 내사마당‘에서 펼쳐지는 ▲「황해도평산소놀음굿」(5.5.)

[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서울시가 조선왕조 수도 한양을 수호했던 성곽인 ‘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을 통합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그 첫걸음으로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성곽이었던 ‘탕춘대성’에 대한 첫 발굴조사를 28일(목) 시작한다. 탕춘대성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1976년)된 지 46년 만이다. 종로구와 서대문구 경계의 북한산 자락 1,000㎡(정밀발굴 50㎡)가 대상으로, 7월까지 발굴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탕춘대성의 성벽 원형과 구조, 성격 등을 규명해 연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등재를 추진한다.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문화유적임에도 제대로 된 보존‧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탕춘대성을 한양도성, 북한산성과 동일하게 사적으로 승격해 보존‧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탕춘대성은 도성인 한양도성과 산성인 북한산성을 잇는 성곽으로, 1718년(숙종 44년)~1753년(영조 29년) 축조됐다. 전란 시 왕실은 물론, 도성 사람들이 북한산성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연결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평상시에는 도성 내부 평창동 일대의 식량과 물자를 보관하는 군수창고를 보호하는 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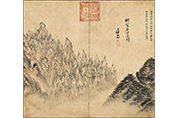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옥황상제가 금강산의 경치를 돌아보고 구룡연 기슭에 이르렀을 때, 구룡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고는 관(冠)을 벗어 놓고 물로 뛰어들었다. 그때 금강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나타나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물에서 목욕하는 것은 큰 죄다.’라고 말하고 옥황상제의 관을 가지고 사라졌다. 관을 빼앗긴 옥황상제는 세존봉 중턱에 맨머리로 굳어져 바위가 되었다.” 위는 금강산에 전해지는 설화다. 얼마나 금강산이 절경이었으면 옥황상제마저 홀리게 했을까? 심지어 《태종실록》 태종 4년(1404) 9월 21일 기록에는 태종이 "중국의 사신이 오면, 꼭 금강산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전하는 말로는, 중국인에게는 ‘고려에 태어나 직접 금강산을 보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말이 있다는데 맞는가?" 하고 묻는 대목이 나온다. 심지어 중국인들조차 금강산에 가보는 게 소원이라 할 정도였다. 그 금강산을 가장 잘 그린 겸재 정선의 그림에 금강산을 멀리서 한 폭에 다 넣고 그린 <금강전도(金剛全圖)>가 있으며, 단발령에서 겨울 금강산을 바라보고 그린 그림 <단발령망금강(斷髮嶺望金剛)>도 있다. ‘단발(斷髮)’이라는 것은 머리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은 <2022 봄 궁중문화축전>을 오는 5월 10일부터 22일까지 5대궁(경복궁ㆍ창덕궁ㆍ덕수궁ㆍ창경궁ㆍ경희궁)과 종묘ㆍ사직단 일대에서 13일 동안 연다. 특히, 올해 궁중문화축전은 경복궁 후원 개방을 기념하여 행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궁중문화축전은 지난 7년 동안 380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국내 가장 큰 규모의 문화유산 축제로, 올해는 ‘나례(儺禮)와 연희’를 주제로 궁중에서 행했던 벽사의식(辟邪儀式)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코로나19 극복과 새로운 일상을 향한 희망을 전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국민을 위한 전시, 공연, 체험 등 대면 프로그램을 확대해 봄(5월)과 가을(10월) 두 차례에 걸쳐 궁궐 현장에서 관람객을 맞이한다. * 나례(儺禮): 섣달그믐날 궁중과 민가에서 귀신을 몰아내던 전통의식 * 벽사의식(辟邪儀式): 귀신을 물리치는 의식 상반기 <2022 봄 궁중문화축전(이하 ‘축전’)>은 오는 5월 10일 열리는 ‘개막제’에서 관람객과 직접 만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에서 개막제를 진행했던 작년과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