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불가에서는 ‘묵언수행([默言修行)’이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는 참선을 말하는 것이지요. 말함으로써 짓는 온갖 죄업을 짓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알림 소리,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를 괴롭히지요. 이러한 소음공해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소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나 고독을 의미하기도 하고, 깊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필요하지요.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도록 도와주니까요. 침묵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은 매우 중요하지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은 침묵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소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우리문화신문=이창수 기자] 국민이 나라의 임자(주인)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임자(주인)를 위해 일하는 나라일터(국가기관)의 이름과 그들이 쓰는 갈말(용어)은 임자(주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되어 있습니까? 슬프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입법부(국회), 사법부(법원), 행정부(대통령, 정부 각 부처)의 이름부터 '법률(法律)', '예산(豫算)', '정책(政策)'과 같은 고갱이 갈말(핵심 용어)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꾸리는 바탕(국가 운영의 근간)이 온통 어려운 한자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뭇사람(일반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담과 같으며, 국정을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일(그들만의 리그)'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영어까지 마구 들여와 쓰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청와대의 'AI수석' 같은 이름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드러내는 듯 보이지만, 참일(사실)은 국민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또 다른 말담(언어 장벽)입니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관련 로드맵을 공표할 예정"과 같은 말을 버젓이 쓰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빼앗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9라길 26. ‘알지비큐브’에서는 <숨겨진 이야기들> 전시가 열린다. 삶은 복잡하고, 단면만으로는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맥락’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절대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무언가를 제대로 헤아리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때로는, 과연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을까 싶기도 한다. 더욱이, 이러한 교류를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이어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개인적이거나 평범해서, 혹은 부끄럽거나 이상하게 보일까 봐, 더 나아가서는 혹여 사회적으로 비난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 남에게 말하기 꺼리거나 숨겼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비밀들은 종종 약점이자 두려움으로 남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이 훌륭한 소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조금 더 관대해지고, 자유로워지며, 확장되곤 하니까. 단체전 ‘숨겨진 이야기들’에서는 삶에서 표면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주목하는 다섯 명의 작가가 각자의 개인적ㆍ사회적 이야기를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조선시대 정조는 백성을 사랑한 나머지 ‘상언(上言)’과 ‘격쟁(擊錚)’ 제도로 백성이 임금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습니다. 상언은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것이고, 격쟁은 임금 행차 길에 백성들이 징이나 꽹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최근 수원시는 백성의 목소리의 귀 기울이며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폈던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계승한다며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정조 임금뿐 아니라 세종은 당시 벼슬아치들이 공정성을 잃어 양반과 부자만 좋게 하고 가난한 백성을 괴롭히고 있음을 꿰뚫고 있었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백성이 싫다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생각이 만능이 아님을 잘 알고 임금이라도 맘대로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세종은 안건이 올라오면 마지막에는 자기가 결정하더라도 신하들이 충분히 갑론을박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직전의 대통령은 회의 때도 1시간 가운데 55분 이상을 혼자 말하는가 하면 조금이

[우리문화신문=정운복 칼럼니스트] 열대지방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캄보디아지요. 싱카포르는 도시국가로 밭 한뙈기 없고 인구밀집형 도시국가입니다. 잘 살기 어려운 나라였지요. 그런데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9만달러가 넘는 세계 5위의 부국입니다. 대신 캄보디아는 땅덩어리가 넓고 3모작이 가능하며 앙크로와트라는 매우 훌륭한 관광자원이 존재하기에 못살기가 참으로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은 3천달러로 세계 최빈국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두 나라가 극단적이 된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건 싱가포르에는 훌륭한 정치가가 있었고 캄보디아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큽니다. 이광요는 싱가포르를 중계무역을 통해 세계의 정상으로 우뚝 서게 했고 캄보디아는 정치인들이 국부를 외국으로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에 바쁩니다. 그러니 정치인을 잘 뽑는 것은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먼 옛날, 중국에 요(堯) 임금이 선정을 베풀어 온 지도 어느덧 50년이 지난 어느날 남루한 옷을 입고 민정(民情)을 살펴보러 나갑니다. 그 때 한 노인이 '배를 두드리고[鼓腹]' 발로 '땅을 구르며[擊壤]'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요즈음 기사나 글을 보면 기자나 교수, 작가 같은 지식인들이 국어를 배웠나? 싶을 정도로 엉터리로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하면 될 것을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라고 씁니다. 여기서 ‘불구하고’는 일본말에서 가져온 것으로, 없으면 더 명확한 글이 되는데도 쓸데없이 붙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치’는 뱀을 그리고서 있지도 않은 발을 그려 넣는 ‘사족(蛇足)’이 됩니다. 그저 “~에 있다.”라고 하면 되지요. 한 기관이 보내온 보도자료를 보면 “이외에도, 거주하다, 개최하다, 외부, 전했다, 게시한다, 휴관한다”와 같이 버릇처럼 한자말을 씁니다. 이는 “이 밖에도, 살다, 열다, 바깥, 말했다, 올린다. 쉰다”처럼 바꿔 쓸 수 있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외면 합니다. 특히 ‘전한다’는 다른 사람 말을 옮길 때 써야 함에도 직접할 때 써서 잘못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잘못 쓰는 말에 ‘너무’도 있습니다. ‘너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해진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라고 풀이하여 부정적인 상황을 꾸며주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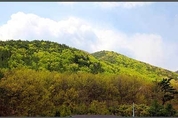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일취스님(철학박사)]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靑山兮要我以無語)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蒼空兮要我以無垢)“ (아래 줄임) 고려 공민왕 때 나옹선사의 선시다. 선시에서 나옹선사는 "산이 말을 한다."라고 했다. 나옹선사가 산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나옹선사뿐만 아니라 자연과 소통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산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도 되고, 누구나 가슴을 열고 산을 바라보면 산과 대화가 어느 때고 가능하다는 뜻도 된다. 내가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문을 열고 나오면 눈앞에 산이 우뚝 서 있다. 비록 낮은 산이긴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산은 뽀얀 안갯속에서 서서히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 때쯤, 나는 두 손 모으고 앞산을 바라보는 것이 그날 일과의 시작이다. 며칠 전 단비가 내린 뒤 산은 생기를 되찾았다. 온갖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고 지고, 온 산은 연한 연두색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 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색깔로 모습을 변화시켜가고 계절의 아름다움을 부지런히 연출해 내고 있다. 그 가운데 봄 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