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박수중 선배님이 《물고기 귀로 듣다》 시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말학(末學) 후배인 저에게까지 시집을 보내주시니 늘 죄송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번 시집은 8월 15일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광복절에 세상의 빛을 받았으니 더욱 의미가 있네요. 그동안 선배님 시를 보면 인간의 개성은 말살되고 규격화되고 소외되는 현대사회에 대해 일침(一針)을 놓는 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바로 전의 시집은 시집 제목 자체를 아예 《규격론》이라 하여 이러한 비판의식을 더욱 앞세웠지요. 이번 시집에도 ‘규격론2’를 실어 그런 비판의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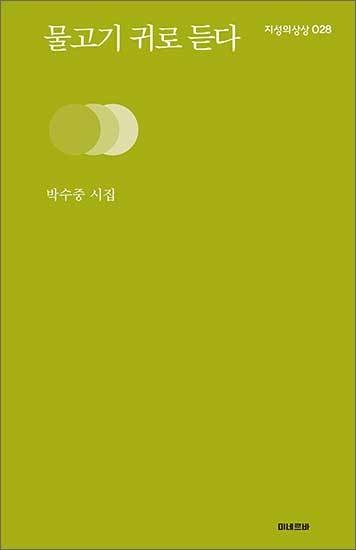
나는 가끔 주인에 끌려 양재천을 산책합니다
걸으면서 절대 다른 개에 한눈팔 수 없어요
나는 일찌감치 중성수술을 받았어요
씨를 함부로 뿌려 족보의 희소가치를 망치면 안 되니까요
수술대 위에서 나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내 귀한 후손을 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 나는 웬일인지 눈물을 많이 흘려요
눈물 자국으로 눈 주위 얼굴 주변 털이 뭉쳐버리자
주인의 뜻대로 미안용(美顔用)으로 눈물샘까지 제거당했어요
나는 웃프게 웃프게도 더 이상 울 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시 ‘규격론2’의 뒷 부분입니다. 박 선배님은 이처럼 규격화되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을 동물에 빗대어 시를 쓰시기도 합니다. ‘양어장’이란 시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개성을 상실하고 그저 현실에 순응하여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현대인을 양어장의 물고기에 빗대어 표현하셨습니다.
(앞에 줄임)
좀 좁긴 하여도
센 놈에게 잡혀먹힐 일 없어요
먹이는 찾지 않아도
던져주는 사료를 받아먹구요
모두 같은 점박이 무리들만 모여 살아
다른 어종(魚種)이 있는지조차 모르지요
변화가 적어 표본처럼 시계추처럼 살면서
모험도 고난도 없는 이 지극히 단순한 일생
어쨌든 팔자는 늘어졌다구요
그런데 옆 기둥 뒤에는 주인이 내키는 대로
수시로 물고기를 건져내는 커다란 뜰채가
건들거리고 있네요
그저 점박이 무리로 규격화되는 현대인! 박 선배는 그런 현대인이 팔자가 늘어졌다고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연에서 그런 물고기들 옆에는 커다란 뜰채가 건들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규격화된 현대인들은 규격화됨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뜰채로 건져내질 수 있는 상품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일까요? 역사를 보면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확대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며 이제부터는 개인이 홀로 자신의 운명주체로서 얼마든지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게 되자, 인간은 오히려 어쩔 줄을 모르고 다시금 어떤 집단에 소속되는 안정감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대서 히틀러 같은 괴물도 나오고 국가주의도 발흥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양어장의 점박이 물고기처럼 그런 집단 속에 규격화되고 생각도 없이 시계추처럼 살게 됩니다. 박 선배는 그런 현대인의 몰개성화, 의미 없는 삶을 이렇게 시로서 비판하고 풍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시집에는 80을 바라보시는 노시인이 늙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몸의 쇠락에 대한 서글픔 등을 나타낸 시도 많습니다. 그 중 ‘망각연습’이란 시를 보지요.
인지(認知) 기억이 낡은 필라멘트 전구처럼 깜박깜박 흔들린다
우선 뻔한 이름부터 가물가물한다
매주 만나는 모임의 총무 이름 끝 자가 ‘준’인지 ‘순’인지
몇 년째 금요일이면 가는 카페의 이름이
‘라 유비아’인지 ‘라 루비아’인지 헷갈린다
(중간 줄임)
기억이 환상으로 꿈으로 섞여져 버려 혼란스럽다
멍멍한 내가 산길 어둠 속 헤드라이트 불빛에
부딪친 노루의 꼴이다
혹시라도 수십 년 전 가까웠던 사람과 이제 재회한다면
서로 기억이 다른 타인(他人)으로 해후하게 될 참이다
시간이 막차를 타고 망각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느니
조금씩 질서 있게 잊어버리는
잊혀지는 연습을 시작해야겠다
기억들이여, 일렬종대로 차렷!
하하! 기억들아! 일렬종대로 차렷하거라! 시의 마지막이 저를 웃음 짓게 하네요. 시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역시 요즘에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인명록을 다시 살펴볼 때가 있는데, 다행히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는 기억이 나, 그나마 이름 찾는 수고는 덜 하고 있지요. ‘멍때린다’는 말이 있지요? 바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가운데는 멍때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손은 쉬고 있어도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멍때리고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선배는 ‘멍때릴 권리’를 시로 주장합니다.
햇살은 모든 것을 용서한다
속절없는 세월
내 부끄러움을
마스크로 가려본다
나를 완벽하게 숨길수록
나는 나에게 타인이다
이제 남아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멍때릴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시를 감상하다 보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광고문구가 생각나는데, 금융 투자업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 뒤 시의 세계를 노니는 박 선배에게는 충분히 멍때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멍때리다 보면 그 멍때리는 순간 번뜩 솟구치는 멋진 시도 나오겠지요. 그런데 코로나 단절의 시대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지요? 이런 코로나 시대는 많은 시인들의 시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박 선배의 저번 시집에서도 그런 시를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시집에서도 박 선배는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로 단절된 시대를 시로 표현합니다. ‘얼굴 잃어버리다’ 시입니다.
얼굴이
사라진
시대
감각으로 산다
얼굴을 잃어버리고
모두
눈과
귀만
남은
핼러윈 귀신이다
마스크를 쓰면
나는 절벽에 갇힌다
홀로 한강에 나가
갈대를 헤치고
마스크 벗은 모습을 수면에 비추면
그 아무 말도 없는
물의 무표정
마스크 단절의 시대가 길어지다 보니 마스크 벗은 자신의 모습을 수면에 비추어도, 그 자신도 그대로 무표정이네요. 코로나가 이제는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다니, 마스크를 벗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집에서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장대비 단상(斷想)’을 음미하며 제 어쭙잖은 시평을 마칩니다. 박 선배는 장대비를 보면서 생각을 전 우주적으로 펼치시는데, 저도 시를 감상하면서 보이저 1호가 찍은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생각하며 시와 함께 우주를 유영합니다.
오래전 첫사랑과의 이별같이 찾아온
장대비를 흠뻑 맞으며
일순(一瞬) 떠오른 생각은
우주의 심연 속으로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64,000개 점으로 이루어진 별들 속에
한 개 푸른 점
그 속에 79억 생각이 살고 있고
그 생각 속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느니
의미의 있고 없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대체 우주 속 먼지의 먼지,
그 먼지의 10대손(代孫) 먼지만도 못한
내 그리움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