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선흥 작가] 혁명가 김옥균을 제거하려는 조선 정부의 노력은 집요하고 절박했다. 그만큼 김옥균이 그가 처한 위험은 가팔랐다. 이번 글에서는 그 대목의 첫머리를 들추어 보려 한다.
1884년 12월 초 혁명에 실패한 김옥균 일행은 제물포(인천)로 황망히 몸을 피한다. 항구엔 치도세마루라는 일본 여객선이 정박해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일본배. 천신만고 끝에 배에 도착했지만, 동행한 일본인들이 김옥균 일행의 승선을 가로막는다. 당장에라도 조선의 체포조가 들이닥칠지 모른다.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그 순간 구원의 손길을 뻗힌 이는 일본배의 선장 쓰지 쇼사부로. 김옥균 일행을 밤중에 몰래 승선시켜 선창에 숨겨 준 것이다.
다음날 12월 9일 영의정 심순택의 지시로 묄렌도르프(독일인으로 외교부 차관격이었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인 외교업무를 관장)가 이끄는 조선군이 제물포항에 들이닥친다. 묄렌도르프는 일본 공사 다께조에게 반역자들을 당장 넘겨달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다께조에는 김옥균과 한양에서 같이 도망하여 승선해 있는 상태다. 말하자면 구명선을 같이 탄 처지다. 김옥균 일행은 설마 다케조에가 자신들을 조선군에게 넘겨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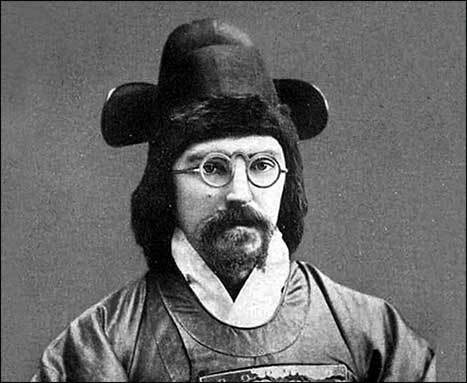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다케조에가 김옥균 일행에게 하선을 명한 것이다. 소름이 돋는다.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다시 선장 쓰지 쇼사부로가 구세주처럼 출현한다. “승선시키고 말고는 선장인 나의 권한이오. 공사는 관여할 바 아니오. 이들을 하선시켜 사지에 내모는 일을 나는 하지 못하오.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라고 그는 강하게 다케조에게 항의한다. 묄렌도르프는 계속 넘겨달라고 짓 조른다. 선장은 버티고 있다. 어두컴컴한 선창에 몸을 숨긴 김옥균 일행은 공포에 떤다. 배는 언제 떠나려나.
마침내 출항의 뱃고동 소리가 울린 것은 사흘 뒤인 12월 11일. 조선의 바다를 떠난 일본배가 나가사키에 도착한 것은 이틀 뒤였다. 구사일생으로 일본 땅에 도착한 사람들의 명단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유혁로, 변수, 정난교, 신응희 등 8인이다. 김옥균은 배에서 내릴 때 ‘이와다 슈사쿠(岩田周作)’라는 일본 이름을 갖게 된다. 목숨을 구해준 쓰지 선장이 지어준 것이다.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험난한 시련이었다.
갑신정변 뒤처리를 위해 일본에서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가 한양에 파견되었다. 그에게 조선 정부는 김옥균 일당을 송환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조선 정부는 포기하지 않는다. 1885년 3월 서상우와 묄렌도르프를 사절로 일본에 보낸다. 그들은 일본당국에 망명자들의 송환을 요청하는 공식문서를 제시한다. 김옥균 일행은 언제 압숭될지 모른다는 악몽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일본 정부는 일단 조선 사절의 송환 요구를 거절한다.
일본 정부가 망명객들에게 온정적이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노골적인 냉대에 김옥균 일행은 울분을 삭여야 했으니까. 본국 정부의 옥죄임과 일본 정부의 냉대 속에서 박영효와 서광범 그리고 서재필은 미국으로 떠난다. 박영효는 다음 해 5월 일본으로 되돌아왔지만 다른 두 사람은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어 나간다. 변수 역시 다음 해인 1886년 미국으로 떠난다.
한편, 조선정부는 공식적인 송환요청이 계속 거부당하자 다는 방도를 취한다. 김옥균을 암살한다는 것이다. 1885년 6월 김옥균을 암살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었다. 장은규와 송병준이라는 자였다.
_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