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사가독서는 조선 시대 젊은 문신들이 임금의 명으로 직무를 쉬면서 글을 읽고 학문을 닦던 제도다. 세종은 국가의 지식확대와 전문가 양성을 위해 문신들에게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글을 읽던 곳을 독서당(讀書堂) 또는 호당(湖堂)으로 불렀기 때문에 독서당 제도 또는 호당 제도로 부르기도 한다. 세종 2년(1420) 3월에 집현전을 설치한 뒤 집현전 학사들 가운데 재행(才行)이 뛰어난 자를 뽑아 휴가를 주어 독서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그 경비 일체를 나라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사가독서(賜暇讀書) 세종 8년(1426)에 문신 가운데서 덕과 재주가 있는 사람을 뽑아 사가(賜暇 : 휴가를 줌) 하도록 하여 집에서 공부하게 한 것이 그 시초로, 집현전의 대제학 변계량이 임금의 명령을 받고 이를 행하였다. (집현전 부교리 권채 등을 불러 집현관으로서 독서에만 전념하라고 명하다) 집현전 부교리(集賢殿副校理) 권채(權綵)와 저작랑(著作郞) 신석견(辛石堅)ㆍ정자(正字) 남수문(南秀文) 등을 불러 명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집현관(集賢官)을 제수한 것은 나이가 젊고 장래가 있으므로 다만 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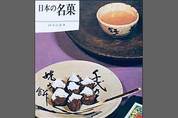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올해로 일본어에 입문한 지 46년째다.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통장에 돈은 없어도 책장에 넘치는 일본 관련 책을 바라다보면 흐뭇하고 뿌듯하기보다는 '이 책들을 다 어찌할꼬?' 싶은 생각에 요즘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나고 있다. 도쿄 진보쵸의 고서적 거리를 비롯하여 와세다대학 앞의 헌책방가는 내가 단골로 다니던 서점가였다. 더러는 한 끼 식사비마저 아껴 사들였던 어쩌면 자식 같은 이 책들을 <이윤옥의 일본어 서재>에서 틈나는 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책은 주로 문학, 문화, 역사, 철학, 사상, 요리, 여행을 비롯하여 백제 성왕 때 일본에 불교를 전수한 조선의 찬란한 불교 유적과 역사 관련 책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이 서가에서 나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일본어책이다. 문학이니 역사 같은 딱딱하고 형식적인 분류보다는 그때그때 책의 주인인 나의 눈길과 손길이 가는 책들을 골라내어 소개하고자 한다. -글쓴이 말- ‘일본 요리는 눈으로 먹는다(日本料理は目で食べる)’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일본 요리는 맛은 차치하고 우선 시각적으로 볼만하다는 뜻을 품고 있다. 이 말을 과자에 적용해도 손색이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지난주 이야기는 우리가 추임새에 인색하다면, 매우 우울한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 고수의 추임새 한 마디에 긴장하던 소리꾼이 용기를 얻게 되고 객석에서도 공감하게 되는 것이 추임새의 효과라는 점, 추임새는 비단, 소리꾼과 고수와의 관계에서만 생겨나는 결과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사이 일상에서도 수없이 나타나는 에너지의 보충원이라는 점, 우리의 일상이 밝고, 명랑하게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추임새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이번 주에는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 곧 소리꾼이 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소리와 고수가 치는 장단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장단(長短)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길고 짧은 시간의 조합을 뜻하는 말이다. 판소리나 민요, 또는 민속 기악(器樂)에 쓰이는 산조음악의 장단 형태를 보면, 제일 느린 장단형이 바로 진양 장단이다. 이어서 중몰이 장단, 중중몰이 장단, 잦은몰이 장단, 휘몰이 장단으로 점차 빠른 형태의 장단이 쓰이고 있으며 그 밖에 엇몰이 장단이나, 드물게는 엇중몰이 장단 등도 쓰이고 있다. 제일 느린 형태의 ‘진양’ 장단에서부터 점차 빠르게 이어가는 중몰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고수(鼓手)의 추임새가 소리판을 키우는 요건이라는 점, 고수의 적절한 추임새가 소리판을 성공적으로, 또는 실패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명고수 김동준은“소리꾼이나 잽이를 반주하며 추임새를 해 줄 때, 모두가 잘해서 저절로 추임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경우도 허다하다고 전제하면서“ 안 좋은 걸, <좋다> <잘 헌다> 하는 것이, 여간 일이 아니란 명언을 하였다. 추임새는 소리꾼이나 연주자(演奏者)들에게만 적용되고 필요한 것일까? 무대 위에서 펼치고 있는 모든 소리꾼이나 차비(差備), 곧 잽이들은 그들의 일상 연주가 모두 훌륭해서 반주자나 객석으로부터 추임새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간혹, 무대 위에서 긴장하는 연창자(演唱者)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유로 평소의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만들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첫 발표회를 준비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긴장할 경우, 실력 발휘가 어렵고, 전문가 그룹의 관객이 자리 잡을수록 객석이 무섭고 두려운 법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과연 무대 위에 함께 올라 있는 고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성벽 속에서 나온 두 점의 자루솥 자루솥(초두-鐎斗)은 고대에 만든 세 개의 다리와 긴 손잡이가 달린 금속 냄비입니다. 세 다리 사이에 불을 피워 술이나 차 또는 약을 끓였다고 합니다. 자루솥은 주로 청동이나 철로 만들었지만 드물게 자기로 된 것도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 처음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1925년 한반도 전역에 7월부터 9월까지 큰비가 내렸습니다. 이때 한강도 넘쳐서 많은 논밭과 민가가 불어난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특히 동부 이촌동ㆍ뚝섬ㆍ송파ㆍ잠실리ㆍ신천리ㆍ풍납리 등 한강과 가깝거나 낮은 지대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를 두고 ‘을축년 대홍수’라고 부릅니다. 이 재해로 수많은 사상자와 조선총독부 1년 예산의 58%에 이르는 약 1억 3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허물어진 경기도 광주군 풍납리의 옛 성벽(오늘날의 서울 풍납토성) 속에서 큰 항아리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청동 거울과 두 점의 청동 자루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유리건판 가운데 당시 큰물이 지나간 뒤에 찍은 성벽과 항아리 사진이 있습니다. 자루솥이 출토된 성벽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회보소민 : 태종공정대왕 휼추선지 회보소민(太宗恭定大王, 遹追先志, 懷保小民), 《세종실록》 9/3/16) 세종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백성 통칭 소민(小民)을 품고 가야 한다고 말한다. 어린 백성에 대하여 소인, 평민, 우민 등의 호칭이 있다. 소인(小人) : (양녕이 밤에 담을 넘어 도망가다) 신의 들은 바로 미루어 보면 경사대부(卿士大夫,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 이외의 모든 벼슬아치의 아우른 말)부터 여염집 소인[서민]들까지도 모르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세종실록》 1/1/30) 평민(平民) : 양녕(讓寧)이 항상 말하기를, 평민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사냥으로써 스스로 마음 즐기기를 원한다.(《세종실록》 즉위년 11/7) 정신적으로 하위에 있다는 뜻으로는 우민(愚民)이란 호칭이 있다 민(民)에서 신민(新民) 그리고 생민(生民)으로 민은 약하다. 이러한 민을 세종은 자기 일을 하는 신민(新民), 항심을 갖고 일을 의식할 줄 아는 생민(生民)이 되기를 바랐다. 민(民)은 백성 민이라 하고 사람을 가리킨다. 뜻으로는 ① 사람 ② 잠을 자다의 眠(면)과 통용된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母(모) 자나 女(여) 자의 상하에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고수(鼓手)의 임무나 그 역할에 관한 이야기, 고수는 반주자로 창자의 소리에 맞추어 정확하게 장단(長短), 곧 박자의 조합과 강약(强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소리속을 훤히 꿰고 있지 못하면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이번 주에는 고수의 추임새가 소리판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고수가 정확하게 장단을 쳐 주고, 이와 함께 강약 처리를 잘한다고 해서 모두가 유명 고수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일까? 물음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다. 그것은 바로 ‘얼씨구’, ‘으이’, ‘좋지’, ‘좋다’, ‘잘 헌다’ 등의 조흥사(助興詞), 곧 추임새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넣어 줌으로 해서 소리꾼에게 자신감을 가지도록 북돋아 주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때로 이를 소홀히 하거나 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고수들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고수(名鼓手)의 대접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리꾼의 역할은 <춘향전>이나 <심청전>과 같은 긴 이야기를 소리와 장단, 그리고 다양한 대사와 발림(몸동작) 등으로 소리판을 이끌어가기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고수의 길로 들어선 송원조가 당시 이리국악원 총무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고법(鼓法)을 익히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의 북 실력이 점점 향상되면서 무대공연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익산에서 열린 판소리 대회, 북 부문에서도 장원에 올랐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이번 주에는 고수(鼓手)의 임무나 그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소리꾼은 긴 이야기를 소리와 장단, 그리고 다양한 대사와 동작, 등으로 소리판을 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기에 매우 힘든 역할이고, 상대적으로 고수는 한 자리에 앉아서 소리에 맞추어 북을 치기 때문에 쉬운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첫째가 고수, 둘째가 명창이란 말, 곧 ‘일고수 이명창(一鼓手二名唱)’이란 말이 널리 회자(膾炙)하는 것도 그만큼 고수의 역할이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글쓴이는 대학신문에 “추임새, 에너지의 보충원(補充原)”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고수가 얼마나 어려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추임새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점을 피력했다, 비단 판소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문화신문=이윤옥 기자] 지난 3월 3일은, 일본 풍습으로 히나마츠리날(ひな祭り)이었다. 히나마츠리란 딸아이를 위한 잔칫날로 히나인형을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딸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건강하고 예쁘게 크라’는 뜻에서 히나 인형을 선물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부터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 풍습은 혹시 딸에게 닥칠 나쁜 액운을 없애기 위해 시작한 인형 장식 풍습인데 이때 쓰는 인형이 “히나인형(ひな人形)”이다. 히나마츠리를 다른 말로 “모모노셋쿠(桃の節句)” 곧 “복숭아꽃 잔치”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복숭아꽃이 필 무렵의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히나마츠리를 음력 3월 3일에 치렀지만 지금은 다른 명절처럼 양력으로 지낸다. 히나인형은 원래 3월 3일 이전에 집안에 장식해 두었다가 3월 3일을 넘기지 않고 치우는 게 보통이다. 3월 3일이 지나서 인형을 치우면 딸이 시집을 늦게 간다는 말도 있어서 그런지 인형 장식은 이 날을 넘기지 않고 상자에 잘 포장했다가 이듬해 꺼내서 장식하는 집도 꽤 있다. 그러나 히나나가시(雛流し)라고 해서 인형을 냇물에 띄워 흘려보냄으로서 아이에게 닥칠 나쁜 액운을 해서 미리 막는 풍습도 있다. 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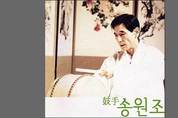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판소리 고법의 서울시 문화재’인 송원조 명인은 처음 최광렬에게 소리를 배웠으나, 소리보다는 북 치는 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고법(高法), 곧 북가락이나 자세, 북에 대한 이론 등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북을 잘 치기 위해서는 소리 길도 반드시 알아야 하므로 송원조는 판소리를 배우면서 고수의 길, 고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가 소리를 배우고 북을 배우던 시기는 당시 4.19학생운동, 5.16군사혁명 등, 나라 안팎의 정세가 평온치 않았던 시기였다. 그 영향일까? 그가 나가고 있던 <이리국악원> 사범들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자주 바뀌었으나, 최광렬을 비롯하여 강종철, 김동준, 주봉신, 이성근 등에게 소리와 북을 열심히 배웠다고 했다. 평소 송원조의 성실함이나 책임감을 간파한 국악원장 강점상이 하루는 그에게 국악원 총무 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총무가 되면 수업료를 내지 않고, 소리와 북을 배울 수 있었고, 게다가 국악원 내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수강생이 아니라, 일정 부분 책임도 따르는 국악원의 간부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 가운데서 뽑혔다는 점에서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