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창부타령>의 노랫말은 약 50 여종 이상이 불리고 있으나 대부분은 <창부타령>만을 위하여 지어진 노랫말은 아니고, 판소리 외 여러 장르에 나오는 가사들을 함께 쓰고 있다. 소개하고 있는 노랫말은 이건자 명창이 그가 속한 보존회의 정례발표 무대나, 또는 개인적인 무대, 또는 그의 국악전수원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노랫말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한다. 때때로 경기민요를 공연하는 무대를 보게 되면, 초심자들의 상당수는 노랫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명창의 발음만을 따라 흉내를 내는 듯, 정확성을 요하는 창자들을 만나게 된다. 비단 <창부타령>뿐 아니라, 모든 성악의 노랫말은 정확한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사의 발음이나 가사의 의미를 온전히 새기지 못한 채, 부르게 되면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발음이 불분명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노래란 시어(詩語)를 음악적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옮기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노랫말 위에 고저(高低)나 장단, 기타 다양한 감정의 표현이나 기교를 넣어 그 노랫말의 의미가 음악적으로 되살아나도록 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어제는 24절기의 다섯 번째 청명(淸明)이고, 오늘은 예전 명절처럼 지냈던 한식(寒食)이다. 청명과 한식은 하루 차이이거나 같은 날이어서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라는 속담이 있다. 이날 성묘(省墓)를 간다. 옛날에는 한 해에 네 번, 그러니까 봄에는 청명, 여름에는 중원 (中元, 7월 15일), 가을에는 한가위, 겨울에는 동지에 성묘했다. 《동국세시기》의 기록에 따르면 청명(淸明)에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비벼 새 불을 일으켜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은 이 불을 정승, 판서, 문무백관 3백60 고을의 수령에게 나누어 주는 데 이를 ‘사화(賜火)’라 했다. 수령들은 한식(寒食)에 다시 이 불을 백성에게 나누어주는데 묵은 불을 끄고 새 불을 기다리는 동안 밥을 지을 수 없어 찬밥을 먹는다고 해서 한식(寒食)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온 백성이 한 불을 씀으로써 같은 운명체로서 국가 의식을 다졌다. 꺼지기 쉬운 불이어서 습기나 바람에 강한 불씨통(장화통:藏火筒)에 담아 팔도로 불을 보냈는데 그 불씨통은 뱀이나 닭껍질로 만든 주머니로 보온력이 강한 은행이나 목화씨앗 태운 재에 묻어 운반했다. 농사력으로는 청명 무렵에 논밭의 흙을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창부타령>이야말로 고도의 기교를 요구하는 재미있고, 신명을 불러일으키는 민요이나 잘 부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이 노래는 평조(平調)의 음조직인 Sol-La-do-re-mi의 5음 음계며, 흥겨운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부르나, 자유자재로 장단을 넘나들며 부르기도 한다는 점, 노래를 위한 반주 악기들로는 피리, 대금, 해금, 가야금, 장고 등이 주로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창부타령>은 들으면 들을수록 묘한 감정을 맛보게 되는 노래이다. 창자(唱者)의 감정 표현이 전편에 녹아 흐르기 때문에 듣는 이들과의 공감대도 크고, 또한 넓기 때문이다. 특히 노랫말이 재미있다. 몇 번 들으면 곧 흥얼거리게 되고, 저절로 외워지는 노래다. 창자(唱者)에 따라서는 즉흥적으로 “디리리 리~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등의 입타령도 넣어 부르기도 하고, 장단을 자유자재로 밀고 당기면서 노래를 불러 즉흥성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창부타령>의 노랫말은 약 50 여종 이상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 노랫말들이 온전히 창부타령만을 위하여 지어진 것은 아니고, 판소리에 나오는 가사, 가곡이나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흔히 경기 명창들은 <노랫가락>으로 목을 푼 다음, 본격적으로 <창부타령>을 부르는데, 이는 마치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단가를 부르는 까닭과 비슷하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경기지방의 대표적인 민요창, <노랫가락>은 조선조 말엽, 대궐 출입이 잦은 무녀(巫女)들이 고상한 시조시를 얹어 부른 뒤로부터 유행하였고, 3박 2박, 3박의 혼합장단이 경쾌하리만큼 거뜬거뜬하게 진행되는 노래이다. 민요권에 속하는 이 소리를 <노랫가락>이라 부르는 것은 그 노랫말이 시조시((時調詩)이며 이를 읊은 가락이라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서도 명창들이 무대 위에서 민요 창을 부를 때에는 제일 먼저 <노래가락>을 부르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이것은 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높거나 낮지도 않은 가락과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 장단으로 부르기 때문에 자신의 목 상태를 점검하기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니 목 상태뿐 아니라, 전반적인 창자의 기분이나 감정,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 등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랫가락을 부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청춘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판소리는 전라도 지방의 소리라 할 만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법(語法)으로 부르는 소리제다. 가사의 발음이나 독특한 사투리, 억양, 떠는 소리나, 꺾어 내리는 소리 등이 다른 지방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건자의 목청은 맑고 고운 편이어서 판소리보다는 경기소리에 어울리는 목이다. 연말 모임에서도 그는 판소리 대신, 자신이 어려서부터 불러오던 <창부타령>을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좌중의 분위기를 압도했다는 얘기다. 사람에게는, 특히 소리꾼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 법이다. 이건자는 <창부타령>이 목청에 맞고, 또한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이 노래를 불러왔기에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던 것이다. 특히 명동으로 구경나갔다가 우연히 참여하게 된 노래자랑에서도 많은 사람을 제치고 1등의 영예를 차지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창부타령>이란 어떤 노래인가? 신명 나는 가락과 흥겨운 장단으로 짜인 이 노래는 <노랫가락>과 함께 서울, 경기지방을 대표하는 민요다. 직장이나 공공의 일터, 각종 놀이가 벌어지는 판에서는 실로 많은 사람이 즐겨 부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산타령 전승교육사, 이건자 명창의 소리세계를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다. 강원도 인제군《가리산리》가 고향이고,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며 익혔는데, 중학교 진학도, 소리공부의 길도, 어렵게 되자, 친구 따라 상경하여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는 이야기, 어느 날 동료들과 명동 구경을 나갔다가 우연히 노래자랑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에게 배운 창부타령을 불러 1등상을 받았다는 이야기, 이것이 인연이 되어 KBS 요청으로 민요 몇 곡을 부르게 되었는데, 구경꾼들도 환호하며 절정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이날 촬영한 영상은 때마침 추석 특집으로 KBS에서 방영이 되었는데, 판소리의 신영희 명창이 이건자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제자로 키우고 싶다”라고 해서 그의 문하생이 되기로 한 뒤, 선생의 집에서 동거동숙하며 소리 공부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건자의 남모르는 고민도 시작되었다. 그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감지되는 미묘한 문제, 곧 이제까지 불러온 이건자의 소리와 신영희 명창의 소리는 같은 전통의 소리이기는 하나, 결이 다른 소리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조선 후기 인물인 남계우(南啓宇, 1811~1890)는 당대에 나비를 잘 그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실적이고도 세밀하게 나비를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해서 남나비[南胡蝶]란 별명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남계우가 그린 꽃과 나비[南啓宇筆胡蝶圖]>가 전합니다. 종이 바탕에 그린 이 그림에는 세밀한 필치로 그린 나비들이 꽃 위에서 노니는 모습과 함께 붉은 모란, 흰 모란, 푸른 붓꽃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종이 옛사람들은 종이, 비단, 마, 모시, 면과 같은 다양한 재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남계우가 그린 꽃과 나비>의 바탕은 종이입니다. 보통 종이라 하면 하얀 바탕의 종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남계우가 꽃과 나비를 그린 종이는 조금 다릅니다. 바탕에 금색으로 빛나는 작은 조각들이 보입니다. 금으로 장식한 종이입니다. 옛사람들이 만들었던 종이의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사용합니다. 종이를 보기 좋고 아름답게 하려고 고운 색으로 염색하기도 하고 종이를 제작할 때 부분적으로 섬유의 양을 달리하여 종이에 무늬나 글자를 만들어내기도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선녀와 놀량>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처럼 보이나, 주 무대가 <산(山)>이라는 점, 선녀들의 놀음이나 소리패의 놀량도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의 화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산타령을 비롯하여, 장기(將棋)타령, <배뱅이굿>, <민요 한마당>의 분위기는 관객을 흥취와 열기 속에 몰아넣었다. 다양한 종목들을 준비해서 성북구민들에게 전통음악의 미(美)적 값어치를 높여 오고 있는 이건자 명창은 어떤 소리꾼인가? 이번 주에는 그 이야기를 해 본다. 서울 경기의 긴소리, 또는 긴잡가로 통하는 좌창(坐唱)보다는, 주로 입창(立唱) 곧 선소리를 주 전공으로 공부해 온 소리꾼, 이건자는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속 마을인 ‘가리산리’에서 태어났다. 골짜기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산에는 이름 모를 꽃과 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자연 속 심산유곡(深山幽谷)에서 10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이건자는 어린 시절, 다람쥐처럼 나무타기를 잘했던 개구쟁이였다고 한다. 어느 날, 나무 위로 뻗은 가지에 달린 호박을 따려고 올라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바람에 변을 당했는데, 안타깝게도 잠깐의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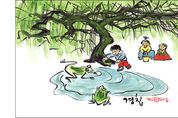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오늘은 24절기의 셋째 '경칩(驚蟄)'이다. 경칩은 놀란다는 ‘경(驚)’과 겨울잠 자는 벌레라는 뜻의 ‘칩(蟄)’이 어울린 말로 겨울잠 자는 벌레나 동물이 깨어나 꿈틀거린다는 뜻이다. 원래 ‘계칩(啓蟄)’으로 불렀으나 기원전 2세기 중국 전한의 6대 황제였던 경제(景帝)의 이름이 유계(劉啓)여서, 황제 이름에 쓰인 글자를 피해서 계'자를 '경(驚)'자로 바꾸어 '경칩'이 되었다. 중국의 전통의학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 기원전 475~221)》에 계절의 변화와 인간의 삶에 대해 언급된 이래, 당나라의 역사서인 《구당서(舊唐書)》(945), 원나라의 《수시력(授時曆)》(1281) 등 여러 문헌에 경칩 기간을 5일 단위로 3후로 나누고 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초후(初候)에는 “복숭아꽃이 피기 시작하고, 중후(中候)에는 꾀꼬리가 짝을 찾아 울며, 말후(末候)에는 매가 보이지 않고 비둘기가 활발하게 날아다니기 시작한다.”라고 한다. 경칩 기간에 대한 이런 묘사가 조선 초 이순지(李純之) 등이 펴낸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 1444)》 등 한국의 여러 문헌에도 인용되고 있는데, 중국 문헌의 절기는 주(周)나라 때 화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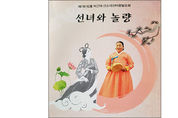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서한범 단국대 명예교수] 지난주에는 이건자(李建子)명창의 제9회 발표회, <선녀와 놀량>을 기획하여 성북구민들에게 선을 보였다는 이야기, 소리꾼 이건자의 순수함과 남다른 열정, 선녀와 놀량과 관련해서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선녀가 하늘나라로 떠나간 이후, 상심에 차 있던 나무꾼은 다시 한번 사슴의 도움을 받아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 살게 된다. 그러나 두고 온 인간 세상의 어머니 걱정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말을 타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말이 세 번 울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그만, 말이 세 번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해 다시 하늘나라에 오를 수가 없게 된다. 그 후, 나무꾼은 언제나 하늘만 쳐다보고 선녀와 아이들을 그리며 살다가, 죽어 수탉이 되었다고 한다. 수탉의 울음, ‘꼬끼오 꼬꼬!’는 바로 “곧 갈 거요, 곧”이라는 풀이여서 이야기의 끝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건자 명창의 <선녀와 놀량>이라는 발표회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재미있다. 선녀(仙女)는 땅이 아닌 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