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신문 = 이윤옥 기자] 호암(湖岩) 문일평(文一平, 1888-1939) 선생은 일제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사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선생은 1920-30년대에 중등학교나 신문사에 적을 두고, 주로 신문과 잡지에 계몽성 짙은 역사 관련 글을 많이 발표하였다. 선생은 1995년 독립장이 추서된 독립운동가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호암 선생은 1910년대 중국 관내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였으며, 1919년 3.1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또 1920년대 후반에는 신간회(新幹會)와 조선물산장려회에도 참여한 바 있다. 1920~30년대 선생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깊고 다양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은 우리말과 역사를 억압하던 식민지 현실에서 우리 역사의 대중화를 시도하였는데,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이었다.
선생의 생애와 학문 또는 저술에 관해서는 그간 자주 논의되어 왔으나,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부분을 강조하며 선생의 생애를 소개하고, 학문도 언급하고자 한다.

▲ 역사학자요 독립운동가인 문일평 선생
1888년(고종 25) 5월 15일, 압록강 가까운 평북 의주군 의주면 서부동에서 선생은 남평(南平)을 본관으로 하는 문천두(文天斗)와 해주 이씨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이 집안은 문일평의 선대 13대조 이래로 의주의 동북방인 창성(昌城)에서 세거해 온 무관가문이었다. [남평문씨세보]에 의하면 선생의 선조 여럿이 무관직을 지녔던 것으로, 특히 증조부는 무과에 급제하여 종 4품의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족보에는 선생의 이름이 항렬에 따라 명회(明會)로, 초명은 정곤(正坤), 자는 일평(一平), 호가 호암(湖巖)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평이란 이름은 본래 자였던 것이다.
상당한 재력을 지녔던 가문의 외아들이었던 선생은 18세가 되던 1905년까지 의주에서 한학자 최해산(崔海山)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 사이에 의주에 교회가 설립되고 서양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서양문화를 접한 선생은 러일전쟁을 목도하고 시세에 대한 관심도 많아 신학문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을 것이다. 선생이 교회에도 출석하고 단발한 것은 미국유학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지만, 미국유학이 여의치 않자 일본에 유학하게 되었다.
도쿄에 간 선생은 1905년 가을 기독교계통의 아오야마학원(靑山學院) 중학부에 청강생으로 등록하였으나 일본어 능력이 부족하여 일본어를 배우고 나서, 1907년 9월에 메이지학원(明治學院) 중학부로 편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생은 부인 김사재(金思哉)에게도 신식교육을 받도록 하여, 부인도 서울의 정신여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선생은 교회에 출석하며 기독교계통의 학교를 다니는 등 기독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평안도 출신 유학생 단체인 태극학회에 참여하여 학회의 임원을 역임하고, 기관지 [태극학보]에도 여러 차례 기고하였다. 이광수(李光洙)나 홍명희(洪命憙) 등과도 가깝게 지내며, 문학을 좋아하고 많은 독서를 하여 이 시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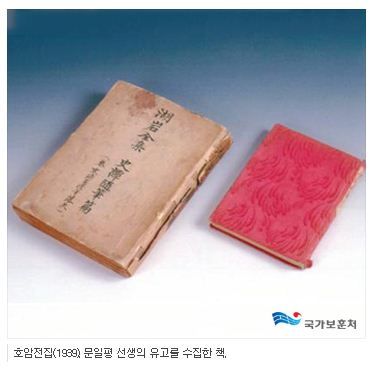
1910년 3월 명치학원을 마친 선생은 귀국하여 안창호(安昌浩)의 주도로 1908년 9월 평양에 설립된 대성학교(大成學校)의 교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1학기 뒤 의주의 양실학교(養實學校)를 거쳐 서울 경신학교(儆新學校)로 옮겼다. 모두 기독교계 학교들이었다. 의주의 양실학교에 재임하던 시기에 선생은 비밀결사로 조직된 국권회복단체인 신민회(新民會)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1911년 봄 선생은 재차 도일하여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고등예과에 입학하였다. 1년 6개월 뒤 예과를 마친 선생은 학부의 정치경제과에 진학하며 재동경조선유학생친목회의 기관지인 [학계보(學界報)]의 편집을 맡아 창간호를 간행하고, 김성수(金性洙), 안재홍(安在鴻), 송진우(宋鎭禹) 등과 교유하였다. 그러나 1912년 말 중국으로 건너가는데, 혹 국내에서 진행되던 105인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선생의 중국행의 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상하이(上海)로 건너간 선생은 신규식(申圭植)의 주선으로 [대공화일보(大共和日報)]라는 중국신문사에 취직하였다. 여기서 조소앙(趙素昻), 홍명희, 정인보(鄭寅普), 신채호(申采浩) 등과도 가깝게 지내며, 신규식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였다. 또 기독교보다 도교와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 같다. 아무튼 중국에서 선생은 민족주의 사학자로 널리 알려진 박은식(朴殷植)과 신채호을 만나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 일은 후일 역사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선생이 귀국한 것은 1914년 봄으로, 중국체류는 2년이 채 되지 않았던 셈이었다. 선생은 귀국 이후 상당기간을 고향에서 생활하였는데, 농사를 지으며 독서에 전념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즈음 선생은 신경쇠약으로 병원에 입원해야할 만큼 병이 중하여 휴양도 필요하였다. 이미 선생이 중국에서 귀국하였을 때에는 집안의 가세가 크게 기울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학교를 지원하고 독립운동에 자금을 댔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1919년 거족적으로 전개된 3.1운동에 선생도 적극 참여하였다. 선생은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3월 12일 서울 보신각에서 시위군중에게 낭독하였으며, 체포되어 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20년 봄 출옥하자 선생은 신문이나 잡지에 간간이 글을 발표하며, 한성도서주식회사 출판부의 촉탁으로 취직하였다. 선생은 1920년까지 호암(虎巖)라고 자호(自號)하였으나, 이후 잘 알려진 호암(湖岩)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아마도 호랑이 같은 성격에서, 호수와 같은 잔잔함을 스스로 기대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1922, 3년경부터 선생은 중동학교를 거쳐, 개성의 송도고등보통학교의 역사교사로 재직하였다. 선생은 1933년 4월에 조선일보사의 편집고문으로 취임하여, 1939년 4월 별세할 때까지 만 6년을 재직하였다. 1932, 3년에 걸쳐 조선일보사를 인수하였던 평북 정주(定州) 출신의 광산주 방응모(方應謨)는 서북 출신의 조만식(曺晩植)을 사장에, 선생을 편집고문으로 초빙하였던 것이다. 신문사에 재직하면서 선생은 비교적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한국사에 관한 많은 글들을 쓸 수 있었다.
선생의 사후[호암전집(湖岩全集)]에 수록된 글의 대부분이 바로 이 시기 [조선일보]에 연재된 것들이었음에서도 짐작되는 일이다. 적어도 2, 3일에 한 차례는 [조선일보]에 선생의 사화(史話)나 사론, 또는 수필이 실렸던 것이다. 물론 그 대부분이 학술적인 논문이 아니라, 계몽성이 짙으면서도 다양한 소재를 한국사와 연결시킨 글들이었다. 그리고 선생은 1934년 5월에 발기한 진단학회(震檀學會)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학회를 주도하던 이병도(李丙燾), 송석하(宋錫夏), 이병기(李秉岐) 등과도 가깝게 지냈다.
1939년 4월 3일 오전 6시 30분, 선생은 향년 52세로 별세하였다. 사인은 급성단독(急性丹毒)이었다. 4월 7일 경기도 양주군 망우리에 매장되었고, 그 해 12월 3일에 정인보의 글로 묘비가 세워졌다. 선생의 글은 유고집 형태로 1939년에 [호암사화집(湖岩史話集)]과 [호암전집] 3권, 그리고 1940년에 [소년역사독본(少年歷史讀本)]이 발간되었다.
선생은 학문도 출중하였으나, 인품이 뛰어나면서도 겸손하였다고 한다. 선생은 학자, 언론인, 종교인, 문인 등과 폭넓게 교류하였는데, 선생을 추모하는 글에는 모두 학문뿐 아니라 인품에 감동되었음이 자주 언급되었다. 선생은 성격이 급하면서도 다정다감하였으며, 동시에 엄격하였던 같다. 그리고 5남매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나, 가난한 사람이나 친구들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못하였다는 일화가 여럿 전한다.
선생의 한국사 연구는 민족주의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민족주의사학은 국가라는 외형은 없어졌으나 정신만 살아 있으면 민족은 살아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낭가사상(郎家思想, 신채호)을 비롯하여 혼(박은식)이나 얼(정인보) 등 민족정신을 강조한 정신사관이었다. 선생 역시 1930년 전후 한국사의 전개를 대조선정신와 소조선정신의 대립과 갈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대조선정신이란 대륙경략과 관련된 북진정책의 수행을 의미하고, 소조선정신은 한반도 내에 머무는 것이었다.
특히 선생은 고구려와 고려가 외침을 막아낸 사실을 여러 차례 서술하며, 삼국통일을 고구려의 대조선운동의 실패이며 신라의 소조선운동의 성공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신채호가 한국사의 전개를 낭가사상과 유학사상의 대립으로 설명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정신 역시 정신사관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선생은 조선정신과 아울러 조선심나 조선사상도 내세웠는데, 훈민정음(訓民正音)이 민중 본위의 문자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선사상의 대표적인 것으로 언급하였으며, 세종대왕은 민중본위의 정치를 시행하고 훈민정음을 제정하였으므로 조선심의 대표자로 파악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조선심, 조선사상의 핵심은 민중본위의 실제적인 민중문명이었다. 선생이 역사의 원동력을 민중에서 찾은 것은 특히 3.1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잘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선생은 3.1운동을 동학농민전쟁 이래 최대의 민중운동이었음을 지적하였고, 그 결과로 민족과 여성의 각성이 이루어졌음을 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생은 한국의 역사와 민족에 대한 자긍에서 조선심, 조선정신, 조선학을 강조하면서도, 역사에 있어서 국수주의적인 요소는 배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서술하고 엄정한 비판을 통하여, 그 장점에는 더욱 힘쓰고 단점은 제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국수주의를 비판하면서, 아울러 우리 역사에 대한 비하도 배격하였다. 사실 그대로를 밝히는 것이 역사가의 사명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선생의 또다른 관심은 역사학의 대중화였다. 선생은 한국사의 통속화, 취미화, 과학화, 미문화(美文化)를 주장하며, 신문에 계몽적인 사론이나 사화를 쉬운 문체로 쓰고 어린이를 상대로도 연재한 것도 역사학 대중화의 실천이었다. 일부에서 선생이 전문적인 학술논문을 쓰지 않고 계몽적인 글로 일관하였음이 안타까운 일로 이야기하지만, 이윤재(李允宰)가 선생의 사학을 소개하며, 심오한 학설이나 번쇄한 고증은 일체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일반대중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통속적 문장으로 쓰기를 힘썼다고 지적한 것이 오히려 올바른 인식이었다. 바로 그것이 오랫동안 선생이 추구한 역사의 대중화였고, 그것은 동시에 문화운동의 형태로 드러난 독립운동이었던 것이다,
선생은 일제 강점기에 민족주의 사학에 기반을 둔 역사가로 높은 평가를 받아오면서도, 독립운동가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 식민지시대에 한국사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자체가 독립운동의 한 부분이었지만, 선생은 국내에서 역사가로 이름이 알려지기 전부터 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다.
곧 1910년 국권회복운동 비밀결사인 신민회에 참여하였고, 1910년대에 중국에 망명하여 독립운동 단체인 동제사에 관여하였다. 귀국해서는 일제의 요시찰인물로 감시를 받으면서도 3.1운동시 제2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선언문을 낭독하여 투옥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선생은 신간회와 조선물산장려회 등에 참여하면서 민족현실문제에 직접 대처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동시에 한국사를 통한 민중계몽, 즉 역사학의 대중화를 추구하였는데, 그 또한 독립운동의 다른 한 모습이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료:국가보훈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