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선흥 작가] 김일성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북한은 찬양하기에 급급해한다. ‘아니요.’라고 말할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침묵도 허용되지 않는다. 남한에서는 어떠한가. 역시 자유가 없다. 김일성의 말에 무조건 고개를 흔들지 않으면 사상이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욕설에 가까운 반대부터 해야 한다.
‘고려연방제’만 해도 그렇다,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위험스러운 일이다. 김일성이 “쌀밥이 역시 최고야”라고 강조했다고 치자. 북한 주민들은 ‘보리밥이 더 맛있어’라고 말할 자유가 없어진다, 남한 사람들도 자유가 제약받기는 마찬가지이다. ‘나는 쌀밥이 싫어요’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올지도 모른다. 사정이 이러하니 분단체제 아래에서는 북이나 남이나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다.
김일성이 김옥균을 높였을 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북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찬양하기에 여념이 없다. 맹목적인 교조주의에 빠진다. 남한 학자들도 불편해진다. 가만히 있으면 김일성에게 동조한다고 의심받을까 봐 께름칙하지 않을까? 물론 오늘날 한국 학자들이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학문의 자유가 상당히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김일성의 말이나 사상을 인용할 때(긍정이건 비판이건) 갈등과 망설임을 겪을 것이다. 분단체제가 존속되는 한 진정한 자유는 없고 집단적 정신 분열은 완치되지 않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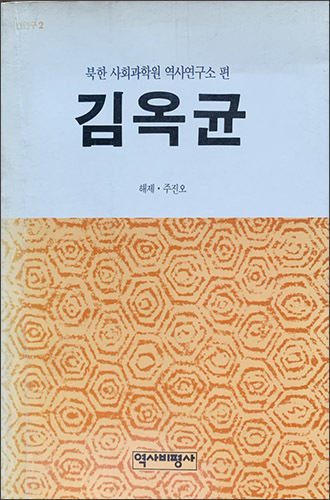
우리가 그런 체제 속에 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면서 다음 글을 읽어보자. 북한 학자들의 ‘김옥균론’이다.
“김옥균은 우리나라 근세의 여명기에 조국의 자주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한 탁월한 애국적 정치활동가이며 사상가였다. 그는 낙후하고 부패한 봉건제도를 반대하여 외래 자본주의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에 자기의 전생애를 바친 고결한 애국자였다. 그에 의하여 지도된 갑신정변은 우리나라에서의 첫 부르주아개혁 시도로서 조선 근대역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옥균에 의하여 지도된 우리나라의 첫 부르주아 개혁운동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조선 인민의 근대혁명운동사 나아가서는 조선 역사의 과학적 체계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특히 조선 역사의 주체성과 조선 인민의 창조성, 진취성, 혁명성을 말살하려고 광분하여 온 일미제국주의 어용 사가들과 그 아류들에 의하여 혹심한 왜곡과 날조가 감행되어 왔고 그러한 악랄한 시도는 오늘날에도 그치지 않고 있다.
김옥균의 업적과 갑신정변의 역사적 지위는 해방 후 당과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하에 모든 애국적 전통과 민족문화유산이 정당하게 계승 발전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비로소 과학적으로 구명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역사학계는 그간 우리나라 역사연구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하며…..”
- 북한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64년 2월 10일
참고로 위의 인용문은 우리나라의 출판사 ‘역사비평사’에서 1990년 펴낸 책에서 딴 것이다.
보다시피 자못 이념적이고 교조적이다. 그러나 김옥균 연구에 북한이 이바지한 바는 상당한 것 같다. 우리는 그러한 객관적 정보와 자료만 취하면 될 터이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서양학자의 김옥균에 대한 언급을 소개한다. 미국 학자 마리우스 잰슨(Marius B. Jensen)의 말이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통일된 국민 국가로 발전했고, 나아가 국제적 평등과 아시아 맹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일본 지도자들의 이 같은 성공은, 프랑스 혁명이 유럽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듯이,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쑨원(孫文), 캉유웨이(康有爲), 김옥균, 에밀리오 아기날도(Emilio Aquinaldo, 전 필리핀 대통령), 수바스 찬드라 보스(Subhas Chandra Bose, 인도의 급진적 독립운동가)와 그 밖의 많은 지도자들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힘과 재능의 측면에서 아시아인과 유럽인을 대등하게 만든, 바로 그 추진력과 통합을 이제 자신들의 나라에서 이루어보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 손일 옮김, 《사카모토 료마와 메이지 유신》 서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