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신문 = 이윤옥 기자] 이위종(李瑋鍾, 1887~?) 선생은 188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全州), 부친은 이범진(範晉)이다. 이범진은 농상공부대신, 법부대신, 주미공사, 주러공사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할아버지 이경하(李景夏)는 대원군 집권 당시에 낙동염라(駱洞閻羅)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포도대장이었다.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대원군이 천주교도들을 탄압하자 이경하는 정부의 명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이위종의 부친과 조부는 국정의 요직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이범진은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과는 성향이 달라, 매우 반일적인 인물이었다. 한 때 일본 언론에서는 이범진을 “친러파”라고 비방하는 기사와 함께 팔방추부(八方醜夫, 여러 모로 추한 남자)라고 조롱한 만화까지 나온 적이 있다. 일본이 볼 때 이범진은 조선 내 제1의 기피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범진은 당시 러시아 사정에 가장 정통한 인물이었다. 그는 을미사변 직후 경복궁에 감금된 처지이던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아관파천의 국내 주역이었다.

▲ 헤이그밀사로 파견된 이위종 선생
이위종은 헤이그 평화회의 특사로 파견되었는데 1907년 6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되자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열강의 도움을 받아 보호국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이위종은 고종이 파견한 특사 3인 중 한 사람으로 임명되었다. 국내에서 명을 받아 출발한 이는 이준이었고, 헤이그 현지에서 열국을 상대로 직접 활동을 펼친 것은 이위종이었으며, 특사일행의 공식 대표는 이상설이었다. 모두 출중한 인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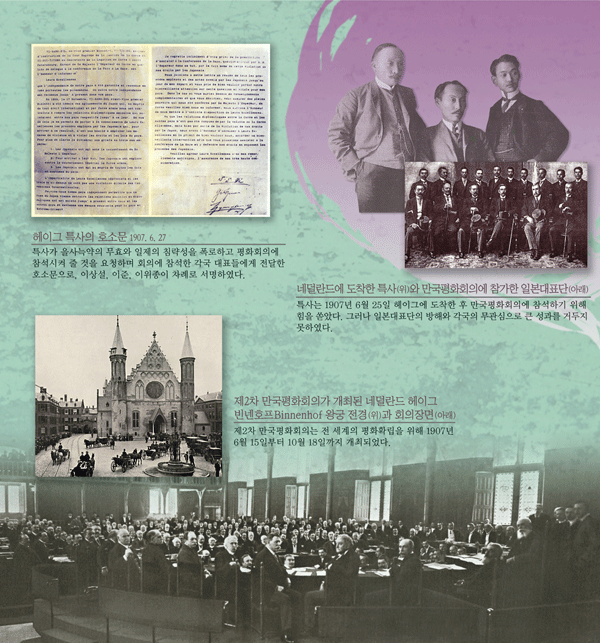
현지에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 준 외국인들도 있었다. 윌리엄 스테드와 스투너 여사가 바로 그들이다. 여기에 서울에서 파견된 헐버트도 이들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영국의 언론인 스테드는 유명한 평화주의자로서 이미 1899년의 1차 만국평화회의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스투너 여사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창설을 주창한 인물이었고,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이었다. 공식적으로 각국 대표는 한국을 지원할 수 없었지만, 한국은 대신에 언론을 통해 호소할 기회를 얻은 셈이었다.
특히 1907년 7월 9일 각국 기자단의 국제협회에 초청된 자리에서 선생은 특사를 대표하여 유창한 프랑스어로 코리아의 호소(a plea for korea)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조약이 강제로 체결 당한 경위와 일본의 침략상을 낱낱이 지적하여 폭로, 규탄하면서, 한국민과 황제는 독립을 열망하고 있으니 세계는 한국 독립에 협조해줄 것을 프랑스어로 호소했다. 선생의 연설은 각국 대표와 수행원, 언론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헤이그 신보]에까지 보도되어 일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의 사정이 각국 신문기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영국인 스테드가 회장으로 있는 국제협회의 회보에는 연설 전문이 게재되었다. 각국 신문도 매일 한국의 사정을 논하여 한국에 대한 여론이 일어났다.
그러나 국제 여론은 여론일 뿐이었다. 한국의 현실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대한제국 최후의 외교는 이렇게 종말을 고할 운명이었다. 이때 중대한 사태가 돌발하였다. 나라의 운명에 절망한 이준이 누적된 과로와 울분으로 인해 갑자기 숨을 거두고 만 것이다. 이상설과 이위종은 그의 유해를 헤이그의 공동묘지에 가매장하였고, 이들은 영국의 런던을 거쳐 8월 1일 미국으로 가서 활동했다. 그것은 고종이 부여한 사명이기도 했다. 이들은 9월초 다시 헤이그에 돌아와 이준의 장례를 치렀다.
헤이그 특사의 결과 고종은 끝내 강제 퇴위를 당했다. 일본의 통감부는 궐석재판에서 이상설에게 사형을, 이준과 이위종에게는 종신징역형을 선고했다. 세상을 떠난 이준에게 종신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의아하다. 순국 사실을 호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위종은 러시아의 극동 지역인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항일운동에 가담했으며, 1911년 신한촌(新韓村)에 권업회(勸業會)가 창립되자 이에 참여하는 등 러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독립운동을 펼쳤다.
이범진은 고종황제와 후손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 내용은 "나라를 잃은 자는 머물 곳도 없고, 편히 쉴 땅도 없으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이위종과 부친 이범진의 삶은 이들의 국권 회복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고 뼈에 사무쳤는가를 잘 보여준다. 동시에 조국의 운명이 기울어져 가는 절망적 상황에서 이국에서라도 뿌리를 내리려 했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던가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으며 국가보훈처는 2007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이위종 선생을 선정하여 고인의 공훈을 기렸다.
<자료: 국가보훈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