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은 지난 1일, “선인의 당근마켓”이라는 주제로 스토리테마파크 웹진 담(談) 11월호를 펴냈다.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 경제다.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중고직거래 플랫폼과 카쉐어링 서비스(같은 생활권의 주민이 시간단위로 차를 빌려 쓰는 것), 아(껴쓰고)나(눠쓰고)바(꿔쓰고)다(시 고쳐쓰고) 운동 등 공급 과잉인 현대사회에 공급자는 개인의 자원을 활용해서 자신에게는 필요 없으나 수요자가 필요한 물품이 이동하여 선순환하는 의미가 있다. 물자가 부족했던 조선시대의 선인들은 공유경제로 일상을 유지했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공유경제 일화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임금은 구휼하고 세금 감해주고 백성은 두레ㆍ품앗이로 나누고 이재민 연구위원의 [우리 함께 ‘당근’해요. – 조선시대 ‘나눔’과 ‘공유’의 가치]에서는 공유경제의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의 성공 요인을 내가 사는 동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눔'과 '공유'의 값어치로 이야기한다. 이 값어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에 바탕을 두고 유교적 이념을 국가 실천덕목으로 하는 조선시대에 더욱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이하 국어원)은 ‘롱 코비드’를 대신할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감염 후유증’을 꼽았다. ‘롱 코비드’는 코로나19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자에게 증상 발현 뒤 나타나는 후유증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0월 20일(수)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여러모로 검토해 ‘롱 코비드’의 바꿈말로 ‘코로나 감염 후유증’을 꼽았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새말이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문체부와 국어원은 ‘롱 코비드’처럼 어려운 말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코로나 감염 후유증’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꼽힌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바꿈말이 있다면 쓸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기마인물상도기’는 고고학계에서 주전자이며, 명기(明器, 장사 지낼 때 무덤 속에 주검과 함께 묻기 위해 만든 그릇)로 알려져 있다. 명기는 어떤 형상을 축소하여 표현한 것으로 그릇으로서의 기능이 없다. 그러나 기마인물상도기는 내부가 비어 있는 용기적 기능을 갖추었다. 이 용기적 기능 때문에 명기이면서 제사 때 주전자로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러한 주장은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가 컴퓨터 단층촬영을 통해서 도기 기마인물형 명기는 말을 탄 사람을 형상화한 장식적인 조각 작품처럼 보이지만 X선 촬영을 통해 인물 뒤에 있는 깔때기 모양의 구멍 안에 물이나 술을 넣고 다시 말 가슴에 있는 대롱을 통해 물을 따를 수 있는 주전자로 만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명기라는 주장은 사실일까? 명기는 실제 동물이나 사람을 순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조그마하게 재현하여 껴묻었던 것으로 용기적 기능이 없다. 기마인물상도기가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태우고 가는 의미의 명기라면 용기적 기능이 불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명기는 죽은 자를 위해 무덤에만 부장한 것이다. 그러나 폐기물매립장으로 추정되는 임당동 저습지유적에서 원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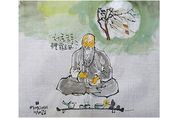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한밤중에 된서리가 팔방에 두루 내리니, 숙연히 천지가 한번 깨끗해지네. 바라보이는 산 모습이 점점 파리해 보이고, 구름 끝에는 기러기가 놀라 나란히 가로질러 가네. 시냇가의 쇠잔한 버들은 잎에 병이 들어 시드는데, 울타리 아래에 이슬이 내려 찬 꽃부리가 빛나네. 하지만 근심이 되는 것은 늙은 농부가 가을이 다 가면, 때로 서풍을 맞으며 깨진 술잔을 씻는 것이라네.” 위는 조선 중기 문신 권문해(權文海)의 《초간선생문집(草澗先生文集)》에 나오는 상강 기록으로 오늘은 24절기의 열여덟째 “상강”이다. “상강(霜降)”은 말 그대로 물기가 땅 위에서 엉겨 서리가 내리는 때인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첫 얼음이 얼기도 한다. 벌써 하루해 길이는 노루꼬리처럼 뭉텅 짧아졌으며, 하룻밤 새 들판 풍경은 완연히 다른데 된서리 한방에 푸르던 잎들이 수채색 물감으로 범벅을 만든 듯 누렇고 빨갛게 바뀐다. 옛 사람들의 말에 “한로불산냉(寒露不算冷),상강변료천(霜降變了天)”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한로 때엔 차가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상강 때엔 날씨가 급변한다.”는 뜻이다. 옛 사람들은 상강부터 입동 사이를 5일씩 삼후(三候)로 나누어 자연의 현상을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이하 국어원)은 ‘비즈 매칭’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사업자 연계’를 선정했다. ‘비즈 매칭’은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기업, 단체와 기업, 기업과 기업 등이 협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연결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0월 6일(수)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비즈 매칭’의 대체어로 ‘사업자 연계’를 선정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이에 대해 문체부는 10월 8일(금)부터 10월 13일(수)까지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2%가 ‘비즈 매칭’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비즈 매칭’을 ‘사업자 연계’로 바꾸는 데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열일곱째로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때라는 뜻의 “한로(寒露)”이다. 한로가 지나면 제비도 강남으로 가고 대신 기러기들이 날아온다. 《고려사(高麗史)》 권50 「지(志)」4 역(曆)을 보면 “한로는 9월의 절기이다. 초후에 기러기가 와서 머물고 차후에 참새가 큰물에 들어가 조개가 된다. 말후에 국화꽃이 누렇게 핀다(寒露 九月節 兌九三 鴻鴈來賓 雀入大水化爲蛤 菊有黃華).”라는 기록이 있다. 이렇게 옛사람들은 한로 15일 동안을 5일씩 3후로 나누어 초후에는 기러기가 오고, 말후에는 국화가 피는 것으로 보았다. 한로는 중양절(음력 9월 9일)과 하루 이틀 차이가 나므로 중양절 풍속인 머리에 수유열매를 꽂고, 산에 올라가 국화전을 먹고 국화주를 마시며 즐기기도 했다. 수유열매를 꽂는 것은 수유열매가 붉은 자줏빛으로 양색(陽色)이어서 잡귀를 쫒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또 한로와 상강(霜降) 무렵에 사람들은 시절음식으로 추어탕(鰍魚湯)을 즐겼다. 한의학 책인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미꾸라지가 양기(陽氣)를 돋우는 데 좋다고 하였으며, 가을에 누렇게 살찌는 가을 고기라 하여 물고기 ‘어(魚)’에 가을 추(秋) 자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직무대리 신은향, 이하 국어원)은 ‘케어 푸드’를 대신할 쉬운 우리말로 ‘돌봄식, 돌봄 음식’을 꼽았다. ‘케어 푸드’는 노인이나 환자 등 특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이들에게 각기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가도록 한 음식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바꿈말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9월 15일(수)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케어 푸드’의 바꿈말 ‘돌봄식, 돌봄 음식’을 뽑았디. *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새말이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문체부와 국어원은 ‘케어 푸드’처럼 어려운 말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돌봄식, 돌봄 음식’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꼽힌 말 말고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어제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with KT 5G 라이브홀에서 양금연주가 윤은화의 첫 독주회 및 첫 작품발표회가 열렸다. 코로나19의어려움 속에도 좌석이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모두 10곡 모두를 자작곡으로 올렸고, 그 가운데 9곡이 초연된 작품이다. ‘윤은화’는 최근 국악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동양고주파’의 양금 연주자로, 그동안 다양한 작품과 활동을 통해 놀라운 속도의 연주와 폭발적 연주를 보여줬다. 이는 서양의 클래식ㆍ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가려고 하는 그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신진국악무대에서 산조로부터 다스름, 시나위까지 이어지는 그만의 새로운 작품을 선사했다. 네 살부터 음악을 시작한 '예술영재'인 윤은화는 그동안 미국, 일본, 프랑스, 태국, 타이완 등지에서 초청 순회공연을 해 왔다. 중국의 중점대학 100곳 가운데 하나인 옌볜대학 초ㆍ중고를 수석 졸업했고 서울대학교를 거쳐 중앙대학교 관현악과를 졸업,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또 윤은화는 중앙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옌볜대 초빙교수도 지냈고, 현재는 단국대학교 대학원과 명지대학교 한국음악과에서 양금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오는 9월 18일 토요일 저녁 4시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9호 장월중선류 가야금병창 전승곡 전곡 발표회 겸 장월중선류 가여금병창 악보집 출판기념 제12회 월은 임종복 가야금병창 독주회가 열린다. 먼저 장월중선은 누구던가? 장월중선(張月中仙, 1925~1998)은 본명이 장순애(張順愛)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예명인 장월중선으로 널리 알려진 예인이다. 선생의 집안은 대대로 명인과 명창을 배출한 예인 가문으로 유명하다. 할아버지 장석중(張石中, 1863~1946)은 고종 때 순릉참봉(順陵參奉)의 직첩을 받은 명창이었고, 큰아버지 장판개(張判介, 본명 장학순, 1885~1935) 역시 고종 때 혜릉참봉(惠陵參奉) 교지를 받은 명창이었다. 아버지 장도순(張道舜) 역시 소리꾼으로 활동하였고, 고모 장수향(張秀香) 역시 가야금풍류와 가야금산조의 명인이었다. 장월중선에게 할아버지, 큰아버지, 고모 등은 집안의 어른이자 판소리와 가야금 등의 스승이었다. 장월중선 선생은 특별히 지닌 재주가 많아 ‘팔방미인’ 혹은 ‘백가예술(百家藝術)을 한 몸에 지닌 분’으로 불렸다. 판소리와 가야금산조, 가야금병창, 아쟁산조, 춤, 창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정종섭)은 한글의 우수성과 경북 속의 한글을 새로운 문화ㆍ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9월 6일(월) 저녁 4시 경북도청 화랑실에서 ‘한글문화ㆍ콘텐츠산업 육성 민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창립하고, 학계 및 한글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경북이 한글문화의 본향(本鄕)으로서 그 가치를 발굴하고 산업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글문화ㆍ콘텐츠 산업 육성 민간위원회’ 창립 경상북도는 한글 보급의 중심지이며 한글 유산의 본향(本鄕)으로서 전국 유일의 《훈민정음》 해례본 발견지(간송본, 상주본)이며, 불경을 한글로 뒤쳐 펴낸 간경도감의 분소가 설치되었던 고장이다. 특히 어부가(1549년), 도산십이곡(1565년), 원이엄마편지(1586년), 《음식디미방(1670년)》, 《온주법(1700년대)》, 《시의전서(19세기말)》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유형의 한글 관련 자료가 생산된 곳이다. 경북 속의 한글 문화원형에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산업화로 육성하기 위해 ‘한글문화ㆍ콘텐츠산업 육성 민간위원회’를 창립하였다. 위원회는 정책고문을 비롯하여 연구ㆍ조사 분과, 기획ㆍ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