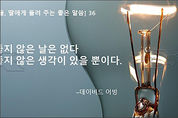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이창수 기자] [아들, 딸에게 들려 주는 좋은 말씀]36-좋지 않은... 한글날을 맞아 여러 가지 기별이 들리던데 너희들은 어떤 기별에 눈과 귀가 쏠렸는지 궁금하구나. 여느 해와 달리 토박이말과 아랑곳한 기별이 우리 고장 진주에서 몇 가지 들려 기뻤단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토박이말을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가 가장 바람직한 말글살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바탕이 조금씩 다져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단다. 오늘 들려 줄 좋은 말씀은 "좋지 않은 날은 없다. 좋지 않은 생각이 있을 뿐이다."야 이 말씀은 '데이비드 어빙'이라는 분이 남기신 말씀인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삶'을 굳힌다는 뜻을 담은 말씀이라고 생각해. 나를 먼저 돌아 보렴. 나는 어떤 생각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좋았는지 좋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는거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배곳에 가 있는 낮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했던 일을을 하나씩 돌아보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둘레 사람을 보렴. 내 둘레에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말을 해 주는 사람은 누구이며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나쁜

[우리문화신문=이창수 기자] [노래에서 길을 찾다]19-그대와의 노래 오늘 들려 드릴 노래는 '그대와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4317해(1984년) 엠비씨 대학가요제에서 동상을 받은 노래입니다. 지관해 님이 노랫말과 가락을 지었으며 '뚜라미'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간 '고은희, 이정란' 님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소리꽃(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좋은 소리꽃(음악)을 찾자고 외치는 알맹이라고 하는데 노랫말이 모두 토박이말로 되어 있어 더 반가웠습니다. 그대와 같이 부를 노래를 찾는다면 궂은날 어둠을 슬프게 읊지 않겠다는 말과 거센 바람이 불어와 앞길을 가려도 그 노랫소리는 내 마음에 들려올 거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궂은날 어둠조차 슬프게 느껴지지 않을 노래이고 거센 바람조차도 막을 수 없는 노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엄청난 노래의 힘을 나타내는 노랫말에 더한 아름다운 목소리가 어우러져 제 귀를 맑혀 주었습니다. 저뿐만 아리라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노래를 들으며 귀도 마음도 같이 맑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토박이말을 잘 살린 노랫말도 마치 가락글과 같아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제가 무슨 말로 어떻게 풀이를 해도 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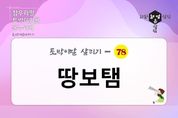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이창수 기자] [토박이말 살리기]1-78 땅보탬 오늘 알려드릴 토박이말을 땅보탬입니다. 이 말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힘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지만 보기월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힘'이라고 풀이를 하고 "에라, 이 땅보탬을 시킬 놈 같으니!"라는 월을 보기로 들었습니다. 이를 볼 때 '땅보탬'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아서 보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 온 나라나 겨레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서는 누구나 죽으면 땅보탬이 되는 것이기에 그리 나쁜 말이 아니지 싶습니다. 오히려 죽어서 땅보탬도 못 될 사람이라는 말이 더 가슴 아픈 말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을 땅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 여겨 '땅보탬'이라는 말을 만들 만큼 빗대어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셨고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 토박이말에 깃든 우리 겨레의 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골에 가서 풀을 베고 왔는데 제가 벤 풀도 땅보탬이 될 것이고 감나무 아래

[우리문화신문=이창수 기자] [요즘 배움책에서 살려 쓸 토박이말]4-어버이 1학년 국어 교과서 첫째 마당에 ‘선생님’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 말을 가르치고 배울 때 ‘아버지’를 뜻하는 다른 말로 ‘아비’, 어머니의 뜻하는 ‘어미’라는 말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따로 부를 때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데, 함께 부를 때는 ‘부모님’이라고 하지 ‘어버이’라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어버이’도 함께 가르치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말버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지 ‘부모님날’이라고 하지 않죠? 가락글(시)에 나오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길 다하여라.”는 괜찮다고 여기면서 나날살이(일상생활)에서는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잘 모셔라.”라 보다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잘 모셔라.”라가 입에 잘 붙는 느낌이죠. 자주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버이’라는 말을 하고 보니 요즘 배곳(학교)에서 많이 쓰는 ‘학부모’, ‘학부형’이라는 말을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부

[우리문화신문=이창수 기자] ['토박이말 살리는 수 찾기' 말나눔 잔치(토론회) 알림] 575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와 사단법인 토박이말바라기(으뜸빛 강병환)가 함께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국어문화원연합회,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흥한주택종합건설, 온리원그룹이 도와서 ‘토박이말 살리는 수 찾기’라는 주제로 말나눔 잔치(토론회)를 엽니다. 오는 열달 하루(10월 1일) 1시부터 6시까지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에서 열리며 빛무리 한아홉(코로나 19)으로 자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줌(zoom)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임 또이름 (회의 ID): 891 3034 8481 -열쇠글(암호): 866858 이 잔치는 잃었던 나라를 되찾은 지 일흔 여섯 해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일본이 뒤쳐(번역해) 만든 한자말이 가득한 책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가장 먼저 한 일이자 잘한 일인 ‘우리말 도로 찾기’와 함께 쉬운 토박이말로 된 갈말(학술용어)로 책을 만들어 가르치고 배운 적이 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안타까운 마음도 더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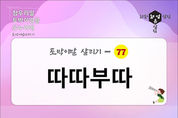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이창수 기자] [토박이말 살리기]1-77 따따부따 오늘 알려 드릴 토박이말은 '따따부따'입니다. 이 말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딱딱한 말씨로 따지고 다투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왜 따따부따 남의 일에 참견이냐?"를 보기로 들었습니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에는 '딱딱한 말씨로 따지고 시비하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또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보기월로 "운전사는 그에게 시비를 걸듯이 뻐드렁니를 드러내며 따따부따 따지는 것이었다."를 들었습니다. 두 곳의 풀이를 보면 '딱딱한 말씨로 따지는'이 같고 표준국어대사전은 '다투는 소리'라고 했고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시비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비하다'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을 하다'는 뜻이니까 다음과 같이 다듬어 보았습니다. 따따부따: 딱딱한 말씨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는 소리. 또는 그런 모습. 부드러운 말씨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엄청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토론'이라는 것을 할 때 서로 옳다는 것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절로 딱딱하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문화신문=이창수 기자] [토박이말 찾기 놀이]1-15 지난 찾기 놀이 앞에 쓴 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정관 부사장님과 최형관 부장님을 뵙고 말씀을 나눴다는 기별을 드리면서 뒤에 더 좋은 기별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는 열달 하루(10월 1일) 서울에서 열리는 '토박이말 살리는 수 찾기 말나눔 잔치'부터 도움을 주겠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나눔잔치를 알리는 알림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넣어 만들어 알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니 더욱 힘이 납니다. 그리고 진주시, 진주시교육지원청, 진주와이엠시에이, 토박이말바라기가 함께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녹지공원을 토박이말로 꾸미고 그 이름을 '토박이말 한뜰(공원)'으로 붙이는 일을 하기로 입다짐을 했습니다. 오는 열달 이레(10월 7일) 운힘다짐풀이(업무협약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주시의회 서은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토박이말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는 말씀을 하셨다는 기별을 모람(회원)들께 드리면서 참 고맙고 기뻤습니다. 이제 나라에서 챙겨 주기만 하면 되는데 말나눔 잔치 열매로 그렇게 되기를 두 손 모아

[우리문화신문=이창수 기자] [토박이말 살리기]설거지와 아랑곳한 토박이말 한가위 잘 쇠셨는지요? 보름달처럼 밝고 넉넉하게 잘 쇠셨길 바랍니다. 날도 맑아서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바람이 이루어지길 빌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비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늘 그렇듯이 토박이말이 온 누리에 퍼져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써서 막힘이 없는 나라가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박이말바라기에서 마련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되고 널리 알려져 많은 분들이 토박이말 살리기에 함께하게 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한가위 때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좋은 날 살붙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맛있는 것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지난해와 올해는 빛무리 한아홉(코로나 19) 때문에 모일 수가 없게 되어서 한결 덜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몇 사람이든 모여서 함께 먹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이것 때문에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더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설거지’입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차리는 일과 설거지를 나눠서 차리는 일은 안사람들이 하고 설거지는 바깥사람들이 겨끔내기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조금씩 서로를 생각해 주면 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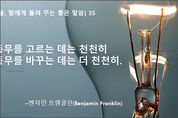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이창수 기자] [아들, 딸에게 들려 주는 좋은 말씀]35-동무를 고르는...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맑은 날보다 흐린 날이 많은 요즘이다. 싹쓸바람이 올라 온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안 온다는 반가운 기별을 너희들도 들었을 거야. 그래도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니 오가는 길 우리 모두 조심하기로 하자. 지난 오란비(장마) 때 사 놓고 신지 못한 비신도 신어 보길 바란다. 오늘 들려 줄 좋은 말씀은 "동무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동무를 바꾸는 데는 더 천천히."야. 이 말씀은 앞서 다른 말씀을 하신 분으로 알려 드린 적이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 님께서 남기신 말씀이란다. 워낙 널리 알려 지신 분이고 좋은 말씀을 많이 남기신 분이라 다음에도 또 이름을 들을 날이 오지 싶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동무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종요로운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먹물 가까이 있으면 먹물이 들기 쉽다는 것은 잘 알 거야. 어떤 동무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나도 그 동무와 비슷한 됨됨이 되기도 하고 그 동무와 같은 사람으로 꼲음(평가)을 받기 쉽거든. 무슨 일이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 고운 말을 쓰며 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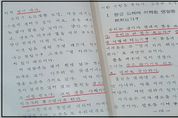
[우리문화신문=이창수 기자] [옛배움책에서 캐낸 토박이말]-주전자 쟁개비 쓰다 오늘은 4285해(1952년) 펴낸 ‘과학공부 5-2’의 65쪽부터 66쪽에서 캐낸 토박이말을 보여드립니다. [우리한글박물관 김상석 관장 도움] 앞서 보여드린 64쪽 마지막 월이 65쪽 첫째 줄까지 이어집니다. “물을 주전자에 넣어 화로에 얹어 놓으며 끓어서 김이 난다.”인데 여기서는 ‘화로’를 빼면 모두 토박이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책이나 다른 책에서 ‘수증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김’을 써서 더 반가웠습니다. ‘주전자’를 표준국어대사전에 찾으면 ‘주전자(酒煎子)’라고 되어 있고 ‘물이나 술 따위를 데우거나 담아서 따르게 만든 그릇. 귀때와 손잡이가 달려있으며, 쇠붙이나 사기로 만든다.’라고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풀이에도 그렇게 해 놓았듯이 우리가 술을 담으면 ‘술주전자’라고 하고 물을 담으면 ‘물주전자’라고 하는데 한자 풀이에 ‘술 주(酒)’가 들어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전자(煎子)’도 ‘그릇’이라는 뜻으로 두루 쓰이는 한자라면 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소리가 같은 한자를 가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