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신문 = 이한영 기자] 경북대학학교 누리집 첫화면에 총장이 우리말로 새해인사를 했습니다. 서명까지 한글로 했군요. 해가 환히 따오르는 경북대학교가 인상으로 남을듯 합니다. 최고 지성의 대학교답게 우리말을 사랑하는 대학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새해 인사를 온통 영어로 도배하고 한글로 일부 쓰긴 했지만 한자 위주에 한글은 둘러리로만 세웠군요. 그럴 거면 차라리 중국어로 인사를 쓰지지 그랬나요? 이렇게 새해 인사를 써야만 외국어대학교인가요? 외국어를 숭상하고 우리말을 짓누르는 거 같아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한국문화신문 = 이나미 기자] 지난 8일 국어국문학회 이만 여 명의 회원들은 국어국문학회로부터깜짝 놀랄 연하장을 누리편지로 받았다. 그것은 우리말을 연구하는대표적인 학회가 연하장의 시작을 Happy New Year로 시작해 영어 사랑을 자랑스럽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참으로기가 막힐일이다. 우리말 사랑에 앞장 서야할 학회가 영어로 인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가? 이렇게 국어국문학회까지 우리말을 버리고 천대한다면 결국 머지않아 우리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런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생각이 든다. 참으로 통곡해도 모자랄 지경이 되어 버렸다.

[한국문화신문 = 이한영 기자]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으니 기업들은 너도나도 새해인사 광고를 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광고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말로 살펴보니 크게 다른 점들이 보입니다. 한번 살펴 볼까요? 2015 근하신년이라 해서 간다하면서도 한글로만 광고를 했군요. 그런데 아쉽게도 근하신년이란 일본에서 들어온 말을 한글로 바꾸어놓기만 했으니 아쉽습니다. 특이하게도 대한민국 모두 氣가 사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로 氣를 강조할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氣가 사세요라고 한 것은 어법상 맞는 말인지 확인했으면 줗았을 것입니다. 평생 행복 받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까지 합니다. 더구나 위 오른쪽엔 일본서 들어온 謹賀新年을 한자로까지 써놓았습니다. 광고는 기업의 얼굴인데 이렇게 대충 하다니 답답하군요. 여기 더 기가 막힌 광고도 있습니다. 2015 HAPPY NEW YEAR라면서 온통 영어로 도배해놓았군요. 아무리 미국 국적 기업이라 하더라도 광고 대상이 한국인인데 이렇게 우리말을 무시하다니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복조리 위에 복주머니를 올려놓아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복을 선물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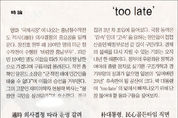
[한국문화신문= 허홍구 시인] too late 오늘 저녁 문화일보의 시론(時論) 제목입니다. 박학용 논설위원님이 쓰신 것인데 읽어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잘 진단 해 주신 좋은 내용의 글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우리말로 그냥 너무 늦게로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어로 써야 만이 글의 품격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묻고 싶습니다. 글의 중간에 가면 또 박대통령이 too late의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당장 뚫어야 할 돌파구들 짚어보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too late의 덫이라 하지 말고 늑장의 덫이라고 하면 더 멋지지 않나요? 영어나 어려운 말 잘 쓴다고 뛰어난 글쟁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쉽게 알아듣기 좋은 우리말로 써주어 소통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 훌륭한 글쓰기일 것입니다.

[한국문화신문=이한영 기자] BC카드가 아이헹복카드를 새로 냈다네요? 그런데 I am happy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굳이 저렇게 영어를 대문짝 하게 쓸 필요가 있나요? 역시 영어가 주인이 되고 한글이 종이 되는 광고인듯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문화신문 = 이한영 기자] 바둑에서 미생(未生)이란 말이 있다.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 혹은 그 돌을 이른다. 완전히 죽은 돌을 뜻하는 사석(死石)과는 달리 미생은 살아날 여지를 남기고 있는 돌을 뜻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최근 드라마 미생 덕에 바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미생의 뜻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완생(完生)이란 말도 나온다 완생은 밝을 향한 출구가 막혀도 죽지 않는 상태의 돌을 말한다. 그러자 드라마가 알려지면서 이 말을 광고로 등장시킨다. 숙취엔 내일엔으로 完生하자란다. 술 마신 전후 숙취가 있을 때 내일엔이란 황칠나무 성분의 음료수를 마시면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꼭 完生이란 한자말을 써서 광고를 해야만 하나? 유항양행은 제약회사 가운데 이미지가 좋은 곳으로 통하는데 굳이 한자를 써서 그 이미지를 망가뜨려서야 되겠는가? 톡톡 튀는 광고를 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말을 해치면서까지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문화신문 = 윤지영 기자] 버스정류장에 풍물굿 공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악, 인류무형유산 등재라고 쓰였습니다. 아마도 농악이 인류무령유산에 오른 기념으로 하는 공연인가 봅니다. 다만, 정부나 학자들이 농악이라고 쓰는 것을 아무 비판 없이 농악이라고 따라 쓰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농악(農樂)이란 말은 일제가 조선의 민속문화를 말살시키려 만든 말이라 합니다, '농악'이라고 써서 신청해야만 할수가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풍물굿은 꼭 농사 지을 때만 한던 것은 아니기에 더욱 . 농악(農樂)이라고 쓸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말 재청이 아니라 서양말 앵콜을 써놓았고, 舞風, 一擧手, 一投足 따위 한자와 함께 pm이란 영어까지 써두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참 답답합니다.,

[한국문화신문 = 김슬옹 교수]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을 떠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모국어 교육은 모국어의 생명줄이다. 도대체 'Why'와 '왜'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왜'를 거부해서 얻고자 하는 why 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들이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는 모국어는 어떤 모국어일까. 영어 남용이 대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마저 모국어를 우습게 여긴다면 모국어는 누가 지킬까?

[한국문화신문 =이나미 기자] 롯데백화점의 영어사랑의 끝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우리말이 없어질 때까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Power Sale, Brand Sale, Challenge Sale, Grand Sale, Lovely Sale까지 가더니 이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를 흉내낸 것인지 SPECIALBLACKWEEK까지 등장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Special Chance까지덧붙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Half Price도 있네요. 롯데아울렛구리접과 롯데몰동부산까지 OPEN하며 신이 났습니다.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라 했나요? 롯데백화점이 이리 난리를 치니까 롯데백화점 광고면 몇 장을 넘기니 Alpecin이란 독일제샴푸가도 영어로 신이 났습니다. 독일제 제품이면 무조건 알파벳으로 도배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우리말 사랑하는국민의 불매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화신문 = 이나미 기자] 오늘 일간지의 광고에 있는 FIRSTINCHANGE가 무슨 말인가요? 영문으로 도배를 하고 한글은 들러리가된 걸로 봐서는 영어권 사람들을 위한 광고인듯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안에 2015년도 정시 '가'군 모집이 들어 있는 걸 봐서는 분명히 한국인 대입 수험들을 대상으로한 광고가 분명합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니 UNIST라고 한 이 대학은 국립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한글은 숨기고 영어로만 광고를 한 것있습니다. 저렇게 영어숭배를 하면 최고의 대학이 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이 말입니다. 이 학교의 누리집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도 영어가 주인입니다. 또 시그니처라 돼 있는 곳에도 보니 6가지 가운데 하나 빼고 모두 한글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모 유명 대학을 본으로 하여 만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써 놓았는데 차라리 이런 대학은 미국으로 이민 가면 좋지 않을까요? ▲ 영어가 주인이 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