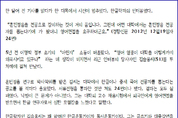
맨 먼저 피어 돋아 반갑고 또 반갑네 옷고슬은 이노 입김 아름꼴은 또 있으랴 홀 서도 골 해를 가고 그 뜻은 아시 같네. * 뒷꽃 : 매화 * 옷고슬 : 향기 * 이노 : 신선 * 아름꼴 : 아름다운 모습 * 아시 : 봉황(鳳凰) * 골 해 : 일만 년

으뜸 새벽 미역 감고 옷 갈아 입어서 떠놓은 첫 물을 한 어버이께 바쳐 드려 올해에 하려는 일들 다 잘 되게 빈다네. * 한 어버께 : 옛 할머니 할아버지 * 갈쪽 : 서쪽

네이버 음식정보에는 <비빔국수>를 “입맛이 없을 때 특효약인 비빔국수~ 촉촉한 면발에 고추장이면 스트레스는 안녕~”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또 비빔국수에는 김치비빔국수, 열무비빔국수, 곤약비빔국수, 어묵간장비빔국수, 카레비빔국수처럼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어 있지요. 아마 많은 이들은 비빔국수 말만 들어도 침을 삼킬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선말기 쓰인 요리책으로 지은이는 전해지지 않는 ≪시의전서(是議全書)≫에 보면 비빔국수가 나옵니다. 이 책의 비빔국수 설명으로는 “쇠고기를 다져 재어서 볶고 숙주와 미나리를 삶아 묵을 부쳐 양념을 갖추어 놓은 다음, 국수를 비벼 그릇에 담는다. 그리고 그 위에는 고기 볶은 것과 고춧가루, 깨소금을 뿌리고 상에는 장국을 함께 놓는다.”라고 되어 있지요. 지금의 비빔국수와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아마도 이런 요리법이 발달하여 지금의 비빔국수로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보다 조금 앞선 때인 순조 때 학자 홍석모(洪錫謨)가 펴낸 책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메밀국수에 잡채, 배, 밤, 소고기, 돼지고기, 참기름, 간납(소의 간이나 천엽, 생선살) 들을 섞는다.”하여 이것을 궁중요리 “골동면”이라 했는데 이는 비빔국수의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셋째 절기인 경침(驚蟄)으로 계칩(啓蟄)이라고도 합니다. 평안도 지방에 전해지는 ‘수심가’에는 “우수 경칩에 대동강 풀리더니 정든 임 말씀에 요 내 속 풀리누나.”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북쪽의 대동강이 녹을 정도니 금수강산 삼천리에도, 내 마음에도 봄 기운이 완연하다는 것이지요. 조선시대에는 임금이 농사의 본을 보이는 적전(籍田)을 경칩이 지난 해일(亥日, 돼지날)에 선농제(先農祭)와 함께 했는데, 경칩 이후에는 갓 나온 벌레 또는 갓 자라는 풀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불을 놓지 말라는 금령(禁令)을 내렸습니다.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우수에는 삼밭을 갈고 경칩에는 농기구를 정비하며 춘분에는 올벼를 심는다고 하였듯이, 우수와 경칩은 새싹이 돋는 것을 기리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만물이 움트는 때인 경칩은 예부터 젊은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씨앗을 선물로 주고받고 날이 어두워지면 동구 밖에 있는 수나무와 암나무를 도는 사랑놀이로 정을 다지는 토종연인의 날이었지요. 또한 고종실록 40권,37년(1900)11월 19일치에는 "궁궐의 중건은 추위가 풀리는 경칩 이후에 하라" 는 기록을 보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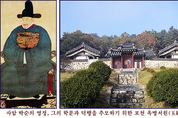
“한 쌍의 학을 키웠는데 그 처지를 가엾게 생각하여 올가을에 깃을 잘라 주지 않았더니 여섯 깃털이 모두 장대하게 자랐다. 한번은 날아올랐는데 곧 되돌아왔다. 내가 이에 감동하여 노래를 짓노라.”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대사헌, 대제학을 거쳐 영의정을 15년이나 지낸 박순(朴淳, 1523∼1589)이 쓴 글입니다. 예전에는 학을 집에서 키웠던 모양입니다. “성급은 성혼(조선 중기의 학자)의 사촌 아우인데, 학을 키우는 일로 생계를 삼았다. 스스로 칭하기를 ‘훈학옹(訓鶴翁·학을 훈계하는 늙은이)’이라 하였다.”라고 대제학을 지낸 이정구는 기록했습니다. 그럴싸하게 “훈학”이란 말을 썼지만 실은 학을 관리하는 일꾼이었지요. 이처럼 학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을 만큼 한양 벼슬아치들 사이에 학을 집에서 기르는 문화가 어지간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위 글에서 보면 박순은 날개가 다 자랐으니 날아가야 마땅한데 되돌아왔다며 감동스러워 합니다. 보통 학을 기를 때는 학이 날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깃털을 잘랐지만 박순은 날아갈 수 있도록 깃털을 자르지 않은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 냄새가 나던

“참 기쁘구나 3월 하루 / 독립의 빛이 비췄구나 / 3월 하루를 기억하며 / 천만대 가도록 잊지마라. 만세만세 만만세 / 우리민국으로 만세 만세 만세 / 대한민국 독립 만만세라.” 이는 중국땅 임시정부 시절 삼일절에 불렀던 노래말입니다. 일제강점기 중국의 동포사회에서는 3·1절이 유일한 명절이었는데 이 날만 되면 모두 조국광복을 염원하는 독립의 노래를 불렀다고 김효숙(金孝淑,1915. 2.11 ~ 2003. 3.25) 독립투사는 증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21년 3월 5일자 동아일보에는 “상해의 3월 1일”이라는 제목아래 조선인 수백 명과 내빈 백여 명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읽고 독립가를 불렀다는 기사가 있을 만큼 나라를 잃은 조선인들에게 있어 기미년(1919) 만세운동을 기리는 3·1절은 명절 그 이상의 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효숙 애국지사는 1944년 10월 광복군 제2지대에 지원하여 여성으로서 당당한 광복

"나도 화장을 하고 고운 옷 입으면 예쁠거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이병희 애국지사는 소녀처럼 해맑은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윤옥 시인이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요양병원에 계시는 이병희 애국지사를 찾아가 여사님께 드리는 헌시를 낭송 해드렸을 때 여사님의 입가에 드리웠던 잔잔한 미소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앙상한 손으로 이 시인의 손을 꼭 잡으며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립운동 정신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강조하셨지요. 아흔여섯 살의 이병희 애국지사는 비록 몸은 야윌 대로 야위었지만 영혼은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처럼 맑고 깨끗했습니다. 7개월 전 요양병원 복도에 손수 그려 놓은 예쁜 꽃 한 송이를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난 이병희 애국지사와 같은 삶을 살다간 여성독립운동가들은 한국에 많이 계십니다. 춘천의 여자 의병장 윤희순, 한국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안중근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임신부

몇 년 전 한국에 온 중국 연변대학교 총장이 “만주족은 말에서 내렸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타는 말도 되지만 사람의 입으로 하는 말도 뜻하는 이중어법입니다. 낼모레 94돌 삼일절도 다가오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땡깡부리다(떼쓰다), 유도리(융통성) 같은 일본말 찌꺼기도 여전히 남아 있는가 하면 "웰빙" "힐링" 같은 외래어도 끊임없이 들어와 우리말글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하는 우려의 소리가 큽니다. 그런가 하면 어법에도 안 맞는 말도 많이 쓰는데 특히 “너무”라는 부정을 뜻하는 낱말이 긍정을 뜻하는 월(문장)에도 예사롭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문제가 어렵다"에서 쓰는 말을 “너무 예뻐요.”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예쁘다는 뜻이 되어 버리기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 있어서, ~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도 일본식 군더더기말이지요. 예컨대 “절친한 벗임에도 불구하고”는 “절친한 벗이지만” 또는 “절친한 벗임에도”로 써야 바릅니다. 또한 흔히 쓰는 “파이팅”이란 말도 생각해볼 일입니다. “파이팅(fighting)”은 ‘싸우자’, ‘맞장 뜨자’라는 뜻의 품위 없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을‘화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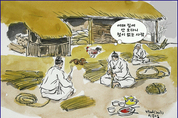
어제는 명절의 하나인 정월대보름이었습니다. 정월대보름의 다른 이름은 원소절(元宵節), 원석절(元夕節), 원야(元夜), 원석(元夕), 상원(上元), 큰보름, 달도, 등절(燈節), 제등절(提燈節) 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특히 신라 제21대 소지왕(炤智王)이 까마귀의 도움으로 죽음을 모면했다하여 까마귀를 기리는 날, 곧 “오기일(烏忌日)”이라고도 합니다. 정월은 노달기라고 하여 설날부터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는 민속놀이와 세시풍속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가운데 전해오는 속담에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은 새해가 시작하는 때이므로 객지에 나간 사람도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조상에게 예(禮)를 다하고 이웃에게 인사를 다녀야 하는데 부득이 설을 집에서 쇨 수 없다면 정월대보름에라도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보름 이후부터는 슬슬 농사철이 다가오므로 농사 준비를 위해서도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월보름임에도 여전히 나들이 중이면 ‘철(농사철)을 모르는 사람이요, 철이 없는 사람이요, 농사와 연을 끊은 사람’이라고 해서 욕을 먹었고 농사 공동체에서 따돌림 받기 쉬웠습니다. 요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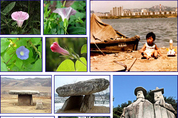
“제주는 오름의 고장입니다. 크고 작은 오름이 옹기종기 마을 뒷산에 모여 있는가 하면 사라오름처럼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야 만날 수 있는 오름도 있습니다. 제주가 좋아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제주에 터를 잡은 지 올해로 11년째입니다.” 이는 제주시 한립읍 주부 독자 정영순 씨가 맨 처음 얼레빗 독자로 보낸 첫 구절입니다.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에 독자편지란이 생긴 것은 2011년 4월 1일의 일입니다. 앞으로 1개월여면 만 2년이 됩니다. 그간 독자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김슬옹 교수의 “오목해시계는 세종 백성 사랑이 담긴 작품”, 심순기 한국체험학습교육협의회 대표의 “여러분은 한국사를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일본 큐슈 주문홍 목사의 “일본 동경의 2ㆍ8독립선언을 생각하며” 파주문화원 권효숙 연구원의 “파주의 보물 두 가지 마애이불입상과 박중손 묘 장명등” 같은 역사를 다룬 글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김찬수 수원 동원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