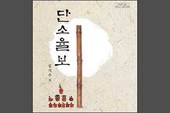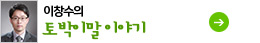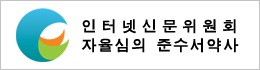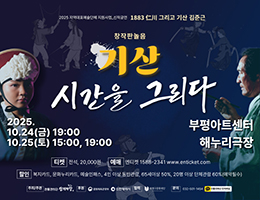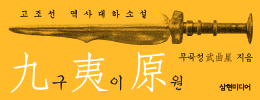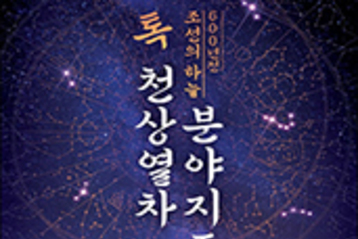최근기사
-

블한시사 합작시 63. 눈길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눈 길 눈 위에 남긴 까마귀 발자국 (돌) 흰 눈 맞으며 무얼 찾고 있나 (달) 분별없는 바탕 자리 가는 길 (초) 흰 종이에 글 쓰듯 함 없는 함 (심) ... 25.2.6. 불한시사 합작시 눈 위에 남긴 까마귀 발자국은 잠시의 흔적이다. 한 번의 날갯짓, 한 번의 디딤이 남긴 자국은 찰나의 존재 증명처럼 보이지만, 해가 기울고 기온이 오르면 이내 스스로 자취를 지운다. 발자국은 ‘있음’이면서 동시에 ‘사라짐’의 예고이며, 남김이 곧 소멸로 향하는 길임을 드러낸다. 서산대사의 ‘답설(踏雪)’ 선시가 일러주듯, 눈 위를 밟고 간 자는 발자국을 남기되 마음에는 남기지 않는다. 흔적은 생기나 집착은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설중보행(雪中步行)’의 수행적 태도다. 눈은 더러운 지표를 가리지 않고 덮는다. 얼어붙은 산하와 혼탁한 세상 위에 내리는 흰 눈은 미화가 아니라 ‘일시적 평준화’다. 덮음은 곧 드러냄의 다른 얼굴이다. 잠시 고요를 주지만, 그 고요는 해빙과 함께 본래의 결을 다시 드러낸다. 그러므로 눈은 정화의 상징이면서도 무상(無常)의 표식이다. 씻김은 지속되지 않으며, 맑음은 붙잡을 수 없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던 설경—발해를 건너 베이징의 공항으로 내려앉던 순간, 자욱한 눈발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흐리게 하던 장면은 이동하는 자의 의식에 ‘사이의 시간(時間)’을 열어 준다. 한반도에 내리던 눈이 대륙에도 이어지고, 얼어붙은 지표 위에 다시 흰 면(面)이 포개질 때, 세계는 하나의 호흡으로 연결된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연결 역시 잠정적이다. 눈은 이어지되 녹는 속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르다. 같은 흰빛 아래서도 각기 다른 소멸의 시간을 산다. 스승의 말씀이 떠오른다. “수면과 설면 중에 어느 것이 더 오래 맑게 희더냐—(水面之白 雪面之白, 白而白而 誰久淸白).” 물의 흰빛과 눈의 흰빛, 둘 다 흰데 어느 쪽이 오래 맑음을 지키는가. 물의 흰빛은 반사된 빛의 순간이고, 눈의 흰빛은 쌓인 결정의 순간이다. 둘 다 ‘흰’이라는 동일한 인상을 주지만, 지속성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속의 우열이 아니라, 흰빛이 일어나는 조건이다. 물은 흔들림 속에서 빛나고, 눈은 정지의 형상으로 빛난다. 움직임의 흰빛과 멈춤의 흰빛 - 이 둘은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다." 심(心)은 물처럼 청정 위에 빛을 반사하고, 물(物)은 눈처럼 형상을 빚어 잠시 머문다. 마음의 파동이 형상을 낳고, 형상의 잔향이 다시 마음을 흔든다. 까마귀 발자국을 따라 무엇을 찾는가. 찾음은 분별을 낳고, 분별은 길을 굳힌다. 그러나 설중의 길은 늘 사라지는 길이다. ‘함 없는 함’—흰 종이에 글을 쓰듯 붓을 들되, 글자에 매이지 않는 태도는 무위(無爲)의 실천적 형식이다. 쓰되 붙들지 않고, 남기되 소유하지 않으며, 걸어가되 도착을 독점하지 않는다. 눈 위의 행보는 그러한 무위의 연습장이다. 결국 눈길의 미학은 흔적을 남기되 흔적에 머물지 않는 것에 있다. 남김은 관계를 만들고, 사라짐은 집착을 풀어준다. 이 왕복 운동 속에서 마음과 사물은 서로를 비춘다. 마음이 고요하면 사물은 투명해지고, 사물이 투명하면 마음은 비친다. 흰 눈은 그 잠정적 투명의 장(場)이다. 오늘의 설경은 오늘의 가르침이며, 내일의 해빙은 내일의 이별이다. 우리는 밟고 지나가되, 발자국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그때의 깨어있음뿐이다. (북경에서 라석) ㆍ불한시사(弗寒詩社)는 문경의 불한티산방에서 만나는 시벗들의 모임이다. 여러 해 전부터 카톡을 주고받으며 화답시(和答詩)와 합작시(合作詩)를 써 왔다. 합작시의 형식은 손말틀(휴대폰) 화면에 맞도록 1행에 11자씩 기승전결의 모두 4행 44자로 정착되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형시운동으로 싯구를 주고받던 옛선비들의 전통을 잇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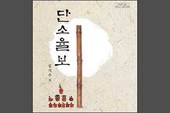
대금을 배우려고 했지만, 작심삼일이 되었다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며칠 뒤, K 교수는 음악대학의 국악과 타 교수, 피아노과 파 교수와 미녀식당에 가서 스파게티를 먹었다. 타 교수는 유명한 국악인이었는데, 국립국악원에서 지휘자로 오래 근무하다가 몇 년 전에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대금의 명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파 교수는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로 알려져 있었는데, 얼마 전에 대학교수가 되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교수라는 직업이 좋기는 좋은가 보다. 교수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교수로 바꾸는 사람이 많으니 말이다. 타 교수와는 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K 교수는 대금을 배우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져왔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어디에선가 들은 대금 소리가 운명처럼 항상 K 교수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대학원생 시절에는 공부하느라고 바빴다. 교수가 되어서는 연구 논문 쓰느라고 바쁜 나날이 계속되었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여 논문을 내고 책을 쓰고, 열심히 강의 준비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취미 생활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교수가 된 지 7년쯤 지나서 해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되자 어느 정도 시간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어느 날 K 교수는 용기를 내어 타 교수를 연구실로 찾아갔다. K 교수가 “대금을 한번 배워 볼까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타 교수가 말했다. “일단 환영합니다. 대금을 배우시면 새로운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이 배우기 쉬운 악기는 아닙니다. ‘장구 3일 대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구는 3일만 배우면 대충 두드릴 수 있지만 대금은 10년쯤 배워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작하시겠습니까?” “네, 한번 배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단소를 배우고 대금을 배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침 다음 주부터 제가 단소 강의를 하는데, 수강 신청한 학생이 3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에서 매주 목요일에 개인 교습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교수님도 오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다음 목요일에 오겠습니다.” 그러자 타 교수는 천으로 만든 덮개에 싸인 단소를 하나 주었다. “이것은 제가 교수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 거저 주시는 것입니까? 고맙습니다.” 타 교수는 단소는 공짜로 주었지만 교재는 책방에서 사라고 책 제목을 적어 주었다. K 교수는 그다음 날 책방에 가서 《단소율보》라는 책을 샀다. 그러나 목요일에 다른 일이 생겨서 단소 강의에 결석하였고, 그다음 주에 다시 급한 일로 가지 못했고, 결국 단소는 배우지 못하고 말았다. 작심삼일에 그치고 만 것이다. 당연히 대금도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대금을 배워 봐야지”라는 꿈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그 뒤 타 교수와는 점심 식사를 몇 번 같이 했다. 이야기하다 보니 고향이 같아서 금방 친해졌다. 1997년에 K 교수가 S대 후문 뒤인 화성군 봉담면 수기리로 이사 온 뒤에, 집에 한 번 데려간 적이 있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차를 마신 뒤에 타 교수는 목조집의 넓은 마루에 큰대자로 누워서 낮잠을 자고 간 적이 있었다. 타 교수는 예술 하는 사람치고는 폭이 넓었다. 그는 독서를 많이 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어서 K 교수와 잘 어울렸다. 타 교수는 술은 마시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말술을 마시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 크게 실수를 한 뒤에 술을 끊었다고 한다. 주변에서 보면 대체로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체육을 못하고, 체육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을 못한다. 그런데 타 교수는 음악과 체육을 동시에 잘하는 특이한 사람이었다. 특히 그는 달리기를 잘했는데, 국악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이 “자네는 국악보다는 육상선수로 나가면 더 빨리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 전력이 있어서인지 타 교수는 골프에 입문한 지 6달 만에 싱글 수준의 골프 실력을 갖추었다고 소문이 났다. S대학에는 교수들의 골프 모임이 있는데, 한 학기가 끝날 때쯤에 총장의 아들이 참석하는 골프 모임을 가진다. 총장 아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농구부에 들어갔을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다고 한다. 총장 아들의 골프 실력은 싱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확실하지는 않았다. 언젠가 총장 아들은 남들이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홀인원을 한 라운드에서 2번이나 했다는 거짓말 같은 소문이 돌았었다. (계속)

![[헌시] 배화(培花), 불멸의 함성으로 피어나다](http://www.koya-culture.com/data/cache/public/photos/20260309/art_17723296335448_428d8f_680x383_c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