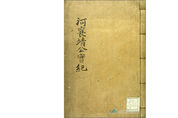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세종 시대의 인물을 살피고 있는데 이번 하경복(1377~1438)을 통해 세종의 마음을 읽는 경우다. 곧 상대가 절실히 걱정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세종을 만나게 된다. 하경복과 그 형제들이 걱정하는 바[마음]를 세종은 평소에 함께 나눈 것이다. 하경복의 본관은 진주이며, 임오년 태종 2년 1402에 무거(武擧) 급제하여 여러 차례 벼슬을 옮겨 상호군(上護軍)에 이르고, 경인년 태종 10년(1410)에 다시 중시무거(重試武擧, 10년에 한 번 보던 무과 과거시험)에 합격 첨총제(僉摠制, 무과 정3품 벼슬)에 발탁되었으며, 얼마 안 되어 경원진(慶源鎭)으로 나갔다. 태종 14년(1414)에 동지총제로 승진, 이어 함길도 도절제사로 나갔다. 초기 하경복은 천성이 호탕한데 태종 10년 길주로 발령이 난다. 그동안은 한양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4군 6진이 있는 한반도 최북단이며, 최전방 동북면에 발령이 난 것이다. 하지만 길주 발령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때부터 하경복의 최일선 인생이 시작되는데, 길주로 갔다가 경원으로 갔다가 한반도 맨 위 경성으로 발령이 난다. 그러다 아예 함길도병마절제사에 임명된다. 최전방 두메 전역을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단종은 1457년 10월에 관풍헌에서 사약을 받고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나는 혼란스럽다.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 《세조실록》 세조3년 10월 21일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노산군(魯山君)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서 졸(卒)하니, 예(禮)로써 장사지냈다. (필자 주: 세조는 단종의 장인인 송현수가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 복위를 꾀했다는 혐의로 교수형에 처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 소식을 듣고 단종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것이다.) 《세조실록》에는 단종이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 단종을 호송했던 금부도사 왕방연이 단종에게 사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세조실록》에는 왕방연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왕방연이 언급된 것은 《숙종실록》 숙종 25년 1월 2일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는 천지 사이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단종 대왕(端宗大王)이 영월(寧越)에 피하여 계실 적에 금부도사(禁府都事) 왕방연(王邦衍)이 고을에 도착하여 머뭇거리면서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우리문화신문=이동식 인문탐험가] 계절이 봄을 지나 초여름으로 접어든 요즈음에 우리의 산하는 푸르기 그지없다. 온갖 봄꽃을 피워 사람들의 눈과 코, 그리고 마음까지 상쾌해진 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나뭇잎은 갈수록 짙어져 저마다 생명력을 뽐낸다. 나무 사이 숲에 사는 동물들도 생명의 기운이 다시 살아난 기쁨을 신나게 노래하고 있다. 필자가 매일 가는 집 뒤의 북한산 둘레길도 예외일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숲의 모범이라고 할 정도로 수풀이 우거지고 뻐꾸기와 찌르레기, 까치와 까마귀, 그리고 가슴의 체증을 내려주는 딱따구리의 부리가 내는 연발총 소리가 녹음 사이에서 들여오고 있어 산책길은 그야말로 눈과 귀와 마음의 복을 잔뜩 누리게 하는 원천이다. 지난가을 길가 비탈에 비스듬히 엎어져 있던 작은 석물이 동네에 사시는 분에 의해 문인석으로 벌떡 일어나서 둘레길을 도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늘 보여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 그 문인석도 이 둘레길 8구간의 명물로서 점차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일반 문인석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밝고 천진스러운 미소가 이 돌을 다듬은 우리 어느 선조의 마음처럼, 밝고 포근한 민초들의 마음을 잘 드러내 주었기

[우리문화신문=유용우 한의사] 우리 몸은 생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구조와 조직이 있고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충실한 기능을 할 때 생명활동이 이루어진다. 코 역시 마찬가지로 가온 가습 면역을 위한 구조를 하고 있다. 곧 비강내 비갑개와 이를 보조하는 4쌍의 부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코가 아무리 기능을 충실하게 하려 하여도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상이 발생한다. 비중격이 휘어 좌우의 균형이 깨지면 한쪽 코가 점점 부담을 받게 되면서 비염이 발생하고, 부비동 통로가 좁으면 약간만 부어도 부비동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비동 자체에서도 파탄이 일어나 부비동염, 축농증이 생기면서 코의 통로에 부담이 가중되어 비염이 발생한다. 이 밖에도 비갑개 비대, 아데노이드 비대, 점막의 손상 등이 발생하면 역시 코가 정상기능을 발현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코의 구조 문제는 크게 볼 때 좁음과 불균형이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좁음은 어린이들에게 많이 드러나고 불균형은 성인들에게서 많이 드러난다. 1. 성인의 코의 구조 문제는 불균형이 대부분 성인도 코의 구조가 좁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단 완성된 코의 구조가 좁은 것에 대해서는 한방 양방의 방법보다

[우리문화신문=김동하 작가] 사실 아버지는 잔인한 분은 못되었다.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걸 본적이 없다. 예전 분 같으면 산에서 토끼도 잡고, 꿩도 잡고, 하다못해 강에서 물고기도 잡아 잡수셨을 텐데,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일은 아주 끔찍하게 생각하셨다. 그렇다고 동물, 곧 고기를 안 드시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죽이는 작업은 예전부터 늘 할머니와 어린 내가 감당할 몫이었다. 한번은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한가위 하루 전날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할머니께서 우물가에 닭이 있으니 좀 잡으라는 것이었다. 늘 해 오던 일이라 나는 무심하게 우물가로 갔더니, 큰 수탉 한 마리가 다리와 날개가 묶여 넓적한 돌 아래에 눌려있는 것이었다. 이 풍경이 의아해서 닭을 왜 이렇게 해놓으셨냐 물었더니, 내가 오는 것을 기다리다 못한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닭을 잡으라고 성화를 내셨고, 아버지는 그 닭을 묶어 목을 비틀어 놨는데도 죽지를 않아서 큰 돌로 눌러 놨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숨 막혀 죽을 것으로 생각하셨다고 했다. 내가 아버지에게 정말이냐 물었더니, 아버지께서는 겸연쩍게 웃으시며 “닭이 실하다. 잘 안 죽네.” 하셨다. 그런 아버지는 활어회를 드시는 것도 별로 좋

[우리문화신문=이달균 시인] 양반 타령 내가 바로 양반이시다 붓 잡은 책상물림 동반 서반 중에서도 동편에선 동반 문인, 내 비록 시골양반 육간대청 떵떵 울리는 벼슬은 못 했다만 오대조께옵서는 관찰사와 기방동기, 이조판서 영감과는 동문수학 막역지간, 위로는 임금 상제에 통하고 아래로는 내 알 바 아니라서 들은 적 본 적도 없다 알아 묵것냐 이놈들아 길일 택해 씨 뿌리고 씨 골라 낳았으니 애초부터 근본이야 유별함이 당연지사 웃것은 사인교 타고 아랫것은 땅을 긴다 방석 밑에 깔고 앉아 공맹자 사서오경 읽고 또 깨우치니 삼정승 육조판서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해설> 이제 양반님네들 자랑이 가관이다. 손에 흙 한 번 안 묻힌 책상물림이 무에 그리 자랑일까. 서편에 서면 서반문인, 동편에 서면 동반문인인가? 양반이란 조상 덕에 착실히 공부는 못했으니 과거시험에 붙을 일을 없을 터. 하지만 부친, 조부, 증조부, 고조부 위의 오대조를 거슬러 올라가면 관찰사를 잘 아는데, 그 우정은 학문으로 맺은 인연이 아니라 기방에서 술깨나 사 바치며 맺은 인연이고, 이조판서와는 어릴 적 동문수학했으나 그저 서당을 같이 다닌 인연이 전부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자랑질이 눈

[우리문화신문=이동식 인문탐험가] 지난 주말 광화문에서 명동 쪽으로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해 서울시청 앞을 가로질러 광장 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데 보통 때 이정도 사람이면 뭔가 확성기에 소리가 크게 들릴 텐데 무척 조용하다. 광장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뭔가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고, 등 뒤쪽으로는 대부분 양산을 쓰고 있다. 비스듬히 누워있는 이들, 가까이 가 보니 아빠 엄마와 같이 있는 자녀들이 책을 들고 보고 있고 혹은 혼자서 책을 보는 젊은이들도 꽤 있다. 바닥에 깔고 있는 것은 쿠션 겸 의자로 쓸 수 있는 간이의자라고나 할까, 잔디가 말끔하게 입혀진 광장 바닥 위로 이렇게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자주색 우산과 쿠션이 멋진 그림을 이루고 있었다. 둘러보니 저쪽에 안내판이 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책 읽는 서울광장'이란 행사의 하나로 주말, 곧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만 열리는 '열린 도서관' 행사임을 알겠다, 서울도서관과 함께 광장을 야외 도서관으로 꾸며 시민들이 광장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이란다.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쿠션 겸 좌석을 빌려주고 양산도 빌려준다. 광장 아무 데나 자리를

[우리문화신문=유용우 한의사] 봄철의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은 코에서 이루어지는 콧물, 재채기, 가려움등과 같은 전형적인 비염 증상과 더불어 얼굴 전체의 부담이 병행된다는 점이다, 특히 눈의 가려움과 부종, 혹은 눈물이 동반되어 코보다 눈과 눈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괴로움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한다. 알레르기 관점으로 해석하면 알레르겐 물질이 코와 눈의 점막, 피부를 자극하여 일어나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하면 단순히 알레르기 물질을 회피하거나 면역력을 증진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방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을 장부(臟腑)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 한열(寒熱)의 관점, 허실의 관점, 담음에서 보는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해결하려 한다. 이에 따른 치료법이 유효한 성과가 있었는데 바로 한의학의 장점이자 단점인 백인백색(百人百色)의 치료법이다. 이번에는 코의 기능과 알레르기성 비염을 설명하려 한다. 1. 코는 인간 몸의 위로 최상단 인간의 몸에 대한 한의학적 설명은 현실적인 측면과 형이상학적 측면이 있다. 아울러 두 가지 측면이 절묘하게 맞물려 한의학적 설명이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인

[우리문화신문=이달균 시인] 쉬이, 물렀거라 양반님 나가신다 비질하고 물 뿌려라 쌍것들 밟은 마당 재갈 고삐도 탈탈 털어 뫼시란다 비단길 서역만리(西域萬里) 물 건너온 명주 버선 봄 햇살 얼굴 탈라 합죽선(合竹扇)으로 해 가리고 백로야 인물 비견 마라 옥골선풍(玉骨仙風) 눈부시다 <해설> “비질하고 물 뿌려라 / 쌍것들 밟은 마당 / 재갈 고삐도 / 탈탈 털어 뫼시란다” 슬슬 갈등의 주인공인 양반 납신다. 나으리님 걷는 길엔 먼지도, 자갈돌도 있으면 안 된다. 비질하고 물뿌리며 깨끗이 신작로 닦아놓아야 한다. ‘고삐도 탈탈 털어’를 요샛말로 바꾸면 번쩍번쩍 광택 낸 고급차가 아니겠는가. 차에서 내리는 품새를 보니 가히 우리 같은 아랫것들과는 다르긴 다르다. 의복은 저 태평양 건너온 것이고, 구두는 이름만으로 날아갈 듯한 상표를 붙었나 보다. 헌헌장부, 옥골선풍에 팔자걸음으로 걷는다. 속에 무엇일 들었는지는 알 바 없으나 일단 꾸밈새만으로도 기가 죽는다. 오방색 옷 입고 춤사위 근사하다만 가난한 이들, 억울한 이들에겐 더 먼 곳, 잡히지 않는 곳에 있는 이들이다. 어쩔거냐? 말뚝이에겐 흙냄새, 땀냄새가 더 좋은걸. 광대놀이 어찌 진행될지 자못 궁금하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김돈(1385-우왕11~1440-세종22)은 세종시대의 도승지 등을 역임한 문신이며 과학자다. 세종을 보필한 인물로는 행정의 달인 영의정 황희. 정계의 음유시인 맹사성, 예조 판서 유관, 병조판서 조말생 그리고 국방의 김종서, 학문의 주춧돌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등 당대의 개성 넘치는 석학들이 있었다. 이런 석학들 속에 여러 분야에서 말하자면 만능선수로 세종을 보좌한 인물로 김돈이 있다. 생애 및 활동사항 ∙태종 17년(1417) : 생원으로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직제학과 승지를 거쳐 벼슬이 참판ㆍ좌승지에까지 이르게 된다. ∙1418년 8월 세종이 왕위에 오르자 1년 전에 실시했던 식년시에서 김돈이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세종은 김돈을 불러 ‘내가 경을 보고자 했으나 경이 나를 피하더니 이제 나의 신하가 되었구나’라고 반가워하며 김돈을 집현전 박사에 중용하고 이후 성균관 사성, 종학박사 등에 제수하였다. 충녕대군 시절 어릴 적부터 김돈의 학문적 명성을 듣고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김돈이 거절했다고 한다. 당시의 정치 상황과 관계가 있을 때 권력에 휩쓸리지 않으려는 뜻도 있었을 것이다. ∙세종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