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세종 시대 황희와 더불어 번영 시대를 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맹사성(孟思誠)이다. 그는 태종과 세종 사이 6조를 두루 걸치며 참판과 판서를 지냈고 세종 9년(1427)에는 우의정에 올랐다. 맹사성은 1360년(공민왕 9) ~ 세종 20년(1438)까지의 문신이다. 그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으나 특히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 전 게재에 이어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1430년(세종 12년) : (아악 연주의 타당함 등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이르기를, "아악(雅樂)은 본시 우리나라의 성음이 아니고 실은 중국의 성음인데, 중국 사람들은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을 것이므로 제사에 연주하여도 마땅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향악을 듣고, 죽은 뒤에는 아악을 연주한다는 것이 과연 어떨까 한다. 하물며 아악은 중국 역대의 제작이 서로 같지 않고, 황종(黃鍾)의 소리도 또한 높고 낮은 것이 있으니, 이것으로 보아 아악의 법도는 중국도 정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조회나 하례에 모두 아악을 연주하려고 하나, 황종(黃鍾)의 관(管)으로는 절후의 풍기(風氣) 역시 쉽게 낼 수 없을 것 같다. 우

[우리문화신문=이동식 인문탐험가] 새해를 맞았기에 지난해 허송세월한 것을 반성하며 이제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해 보자고 자리에 앉아 생각을 가다듬어 본다. 그런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한다고 하면 5분도 못 가서 생각은 어느새 한강에 가 있고 이태리 로마에 가 있고 멋진 경치를 보고 싶어 집 밖으로 줄달음친다. 생각을 도로 붙잡아 놓으면 또 모르는 사이에 어디론가 막 날아간다. 새해 결심이고 뭐고 굳은 맘을 먹고 뭔가를 결심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정이 안 되고 마구 날아다니는 것을 불교에서는 ‘심원의마(心猿意馬)’라고 한단다. 우리 마음이 원숭이처럼 날아다니고 우리의 뜻은 말처럼 뛰어다닌다는 뜻일 텐데, 두 동물의 성질에서 나왔다고 한다. 원숭이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 하고 촐랑대 마음이 조용할 새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한다. 말은 항상 뛰기만을 생각해 뜻이 가만히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오간다. 여기에서 사람이 근심걱정 때문에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 됐다는 것이고, 중국 후한(後漢)시대에 위백양(魏伯陽)이 펴낸 것으로 전해지는 《주역참동계(周易參同契)》에 아래 문장과 같이 나온 뒤 역대 불교 선사들이 즐겨 쓰는

[우리문화신문=유용우 한의사] 우리 몸의 노폐물을 장내 노폐물, 혈액과 혈관 노폐물, 세포 노폐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일일이 구분하면서 대처하여 맑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된다. 한의학은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단순화하되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도모하는 학문이다. 몸 내부의 노폐물을 달리 표현하면 “때가 끼었다”라고 할 수 있다. 간에 때가 끼어 간의 창고가 좁아졌고, 혈관에 때가 끼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졌으며, 세포에 때가 끼어 세포의 운동성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때가 끼는 것은 몸 내부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외부에서도 작용하며 인체가 아닌 사물(事物)에서도 똑같이 발생한다. 1. 이 세상의 모든 때는 기름이 찌들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때는 똑같은 매개체가 존재하여 발생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때는 기름기가 찌들어 생긴다.”다. 집안 구석의 찌든 때와 내

[우리문화신문=이달균 시인] 과장(科場)은 모두 다섯인데 가방끈 짧은 축들은 과장과 과장 사이 건너뛰기가 쉽지 않아 이 과장 따로 저 과장 따로 따로국밥을 차린듯하여 내 식대로 그냥 얘기 하나 옷깃에 실밥 풀 듯 풀어내어 엮었으니 원래 것과 다르다고 지나치게 서운케들 생각은 말아주소 광대놀음 하다 보니 양반이 동네북이라 매양 뚜르르 울리고 남에 것 가로채고 가슴에 나라 ‘국(國)’자 붙이고도 백성은 뒷전이고 하는 짓은 제 잇속이나 챙기는 얌체 중의 얌체니 동네북은 당연지사 허나, 이 마당에선 죽일 놈의 양반은 양반대로 할 말 있고 큰애미 작은애미 시앗싸움 한창이라 귀 열고 들어보면 큰애미는 큰애미대로 작은애미는 작은애미대로 제 할 말이 있겠거니 딴 데 가선 못 할 말 이 마당에선 다 하라고 멍석 한 번 펴보았소 문둥이 문둥북춤을 추는데 아침부터 웬 문둥춤이냐고 돌팔매 날아오고 나물 삶은 뜨거운 물에 입도 데고 뭣도 데어, 서럽고 서럽것소! 강산 두루미로 한반도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녀보니 산도 조져놓고 강도 조져놓아 천형 문둥이 욕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던 것을 그래서 문둥이는 문둥이대로 비비란 놈은 비비대로 제 할 말 조잘조잘 탈바가지 덮어쓰고 노래하니 이보

[우리문화신문=이동식 인문탐험가] 겨우내 알몸으로 오들거리다 사색이 된 사시나무 무리들이 바람이 전하는 봄 희망에 젖어 휘파람으로 아우성인 우수 언저리 동장군에게 구속당해 두툼한 얼음이불 덮고 침묵 중이던 산골짝 웅덩이들이 해금되어 쩌렁쩌렁 살판났다 설렘으로 졸졸졸 자유 찾아 떠나는 물소리에 귀잠 깬 버들강아지도 꼬리가 제법 복슬복슬하고 권오범 시인의 ‘해토머리’란 시는 이처럼 겨우내 얼었던 대지들이 뜨뜻한 봄기운을 받아 몸을 녹이고 꿈틀꿈틀 되살아나는 자연과 초목과 동물들의 살판나는 분위기를 감칠맛 있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구나. 이번 주말이 봄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우수(雨水)’렸다. 차가운 얼음덩어리에 눌려 숨도 못 쉬던 산골짝 웅덩이들이 살아나는 이 계절은 겨울은 아니고 봄도 아닌 어정쩡한 때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를 ‘해토(解土)머리’라고 불렀다. 땅이 풀리는 첫 계절이란 뜻이겠지. ‘따지기’라는 순수 우리말도 있네. 뭘 따진다는 게 아니라 따(땅)을 가두었던 얼음이 풀리면서 땅이 질척질척하는 때를 말한단다. 시기적으로는 우수에서 경칩 사이인 것 같고... 예전에 해토머리는 춥고 먹을 것이 모자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 필자의 성장기였

[우리문화신문=유용우 한의사] 피가 탁한 것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어혈(瘀血)이 있고. 간에서 연유되는 것과 비장에서 연유되는 것이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한의학적 처방과 민간요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어혈(瘀血)을 풀어주는 방법 피가 탁해지는 것을 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멍자국이다. 이는 내부의 모세혈관이 손상되면서 출혈이 일어나 혈액이 본래의 경로인 혈관을 이탈하면서 기능을 상실한 죽은피를 의미한다. 이렇게 피가 탁해진 것을 한의학에서 ‘어혈(瘀血)’이라고 한다. 어혈(瘀血)이란 일반적으로 죽은 피를 뜻하는데 한의학적 의미로는 정상적으로 운행(運行)되지 않은 모든 혈액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러한 어혈(瘀血)을 판별할 때 겉으로 보이는 타박 증상 이외에 꼭꼭 찌르는 듯한 자통(刺痛)과 저린 증상을 의미하는 ‘마목증(痲木症)’을 들 수 있다. 어혈을 풀어주는 한의학의 대표적인 처방은 당귀수산(當歸鬚散)과 사물탕(四物湯)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가감방이다. 우리가 보통 보약이라 할 때 인삼(人蔘)과 녹용(鹿茸)을 떠올리듯 혈(血)을 다스리는 기본 약으로 당귀(當歸)가 있다. 당귀(當歸)의 약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답사 날짜> 2021년 9월 2일 목요일 <답사 참가자> 이상훈, 박인기, 우명길, 원영환, 최돈형, 홍종배 등 모두 6명 <답사기 작성일>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평창강 제10구간은 한반도면사무소에서부터 한반도뗏목마을을 거쳐 한반도지형 전망대에 이르는 6.8km 거리이다. 지난 7월과 8월은 더위를 핑계 대고 답사를 쉬었다. 답사 참여자들이 다리가 튼튼하기는 하지만 모두 나이가 70을 넘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과는 다르다. 한여름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걷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 찬반 의견을 물었더니 모두가 찬성하여 두 달을 쉬었다. 이제 많이 친해진 얼굴들을 두 달 만에 다시 보니 반가웠다. 영월은 삼한시대에 진한(辰韓) 땅이었다. 한강을 점령한 백제의 세력이 커지면서 백제에 속하였는데 100가구가 겨우 넘는 작은 지역이라는 뜻으로 백월(百越)이라 불렀다.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으로 죽령 이남까지 영토가 확장되면서 백월이 내생군(奈生郡)으로 바뀌었다. 통일신라 시대의 행정 구역 개편 때 내성군(奈城郡)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고려 초인 940년(태조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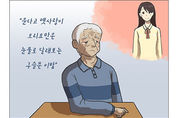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동하 작가] 아버지는 칠십이 넘으신 나이에 운전면허를 따셨다. 사람들이 그 나이가 되면 하던 운전도 내려놓으셔야 할 나이셨지만, 당신은 그 나이에 운전학원을 다니시면서 2종 보통 면허증을 따신 것이다. 한국전쟁당시 보급계 부사관을 하셨던 아버지는 GMC 트럭을 몰고 다니셨단다. 우리 아버지는 이를 ‘제무시 도라꾸’ 라 부르셨다. 전쟁 전 따로 운전을 배우신 적은 없었지만 전쟁 당시 전방 부대에 보급품을 운반하시다가 아마 다른 운전병에게 배우셨나 보다. “면허 따위 없어도 내가 강원도 그 험한 산길로 얼마나 다녔는지 모른다.”라고 늘 주장 하셨는데, 결국에는 칠순이 넘어서야 운전면허증을 따셨다. 운전면허도 없던 젊은 시절에도 아버지는 운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다. 가끔 아버지와 택시를 타고 갈 때나, 버스를 타고 갈 때, 간간이 운전사가 왜 운전을 저따위로 하느냐며 자주 불평을 해 대셨다. 나는 그렇게 투덜대는 아버지가 민망하게도 해서, “운전면허증도 없는 분이 왜 그리 다른 사람을 타박하십니까?”라며 핀잔을 드려도 아랑곳하지 않으셨다. 운전면허를 따신 아버지는 작은 자동차 하나를 사서 당신이 다니시던 곳, 전쟁 당시 전투하시던 곳에 가보고

[우리문화신문=이달균 시인] 양반은 잘나서 오방색 도포에다 팔자걸음 합죽선 손에 쥐고 권세 으쓱, 이리 오라 저리 가라 어르고 달래다가 휭하니 저들끼리 지져먹고 볶아먹고 개평 한 줌 아니 주고 심산유곡 땡중은 내려와서 그나마 저자 울린 객주 처자 제 것인 양 요모조모 뜯어보고 보료에 앉았다가 금침에 누었다가 온갖 호사 다 누리니 이놈 말뚝이가 스스로 마당 펴고, 스스로 노래하며 징치하고 등 두드릴 지경에 이르고 말았소 욕하고 싶은 이는 맘껏 욕들 해도 좋소 어차피 삼현육각(三絃六角) 앞세우고 어사화(御史花)도 못 썼으니 허랑한 광대들 불러 모아 매구 치고 쉬다 울다 엎어지며 놀다나 가고 싶소 고성오광대 구경을 한 십년 다녀본께 놀이치고는 참 재미지고 춤사위가 독특하니 그 감칠맛이 진국입디다 이 놀이는 말보다 몸짓이 우선이라 이 춤에서 저 춤으로 건너뛰다 아차! 놓친 사연들도 있음 직하여 당신들은 탈춤으로 놀고 나는 입심으로 놀아볼까 하고 노래를 시작했던 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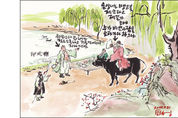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학교 명예교수] 세종 시대 황희와 더불어 황금시대를 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맹사성(孟思誠)이다. 맹사성은 고려 공민왕 때인 1360년(공민왕 9)부터 세종 20년(1438)까지의 문신으로 태종과 세종 시대 사이 6조를 두루 걸치며 참판과 판서를 지냈고 세종 9년(1427)에 우의정에 올랐다. 이때 좌의정이던 황희와 한 팀을 이루었고 이후 세종 13년(1431) 황희가 영의정이 되자 좌의정에 올라 조정을 관장했다. 76살이 되던 세종 17년(1435)에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세종은 주요 정사에 대하여서 자문했다. 온양 출신으로 아버지는 고려의 맹희도(孟希道)이며 고려 말기 최영(崔瑩) 장군의 손녀 사위이기도 하다. 우왕 12년(1386)에에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춘추관검열이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뒤 태조 때 예조의랑(禮曹議郎)이 된 이래, 정종 때 간의우산기상시가 되었다. 태종 초에 동부대언(同副代言)ㆍ이조참의를 두루 역임하였다. 1407년(태종 7) 진표사(進表使)로 명나라에 가는 세자를 시종관으로서 수행하여 다녀왔다. 그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했으나 특히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 그의 연대기를 음악 중심으로 살펴보자.